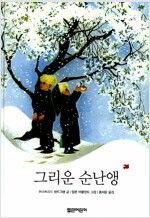책으로 보는 눈 183 : 책에 담는 이야기
스웨덴 할머니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님이 남긴 보배와 같은 이야기책 가운데 《그리운 순난앵》(열린어린이,2010)이 있습니다. 순난앵 이야기가 애틋해 여러 차례 읽었고, 따로 그림책으로 나온 판은 아이한테 곧잘 읽어 주었습니다. 순난앵마을 작은 아이들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자그마한 아이가 “오빠, 내 발이 그러는데, 보드라운 모래랑 푹신푹신한 잔디가 너무 좋대(26쪽).” 하고 읊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이 글월에 밑줄을 천천히 긋고는 오래도록 곱씹습니다. 나도 맨발로 보드라운 흙을 밟고 보드라운 가랑잎을 밟을 때에 참말 좋습니다. 내 발가락과 발바닥이 좋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일본사람 콘노 키타 님이 그리는 만화책 《다음 이야기는 내일 또》(대원씨아이,2012) 셋째 권을 읽다가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깜짝 놀랄 만큼 많은 걸 깨닫게 돼요. 난 사소한 일에도 짜증내고 화내고 언성을 높이는 아직 부족하고 못난 엄마지만, 마음은 언제까지나 중력을 거스르고 위로 위로 뻗어 나가고 싶어요(58쪽).” 하고 흐르는 대목을 두고두고 되읽습니다. 만화책이라 차마 밑줄을 긋지는 못합니다. 그저 곰곰이 되씹습니다. 나 또한 우리 아이들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날마다 깜짝 놀랍니다. 맑은 넋을 헤아리고 고운 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아이들이 어버이인 나를 바라볼 때에 어떤 넋과 꿈을 돌아볼 만한가 하고 되뇝니다. 나 스스로 고운 넋과 맑은 꿈으로 살아가면서 아이들 또한 즐겁게 좋은 이야기 물려받을 수 있어야 기쁜 하루가 되리라 느낍니다.
책에 담는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내가 아이들하고 누리는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며 아로새기는 내 좋은 이웃들 삶을 생각합니다. 내가 아이들하고 늘 어울리며 새롭게 되새기는 삶을 생각합니다.
어떤 책을 읽을 때에 기쁠까요. 어떤 삶을 일굴 때에 기쁠까요. 어떤 책을 장만해서 읽고 책꽂이에 곱게 꽂으면 즐거울까요. 어떤 삶을 누리면서 아이들과 이야기꽃 피울 때에 즐거울까요.
모든 길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부터 ‘책에 길이 있다’고 말했겠지요. 내 마음속에 길이 있기에, 책을 읽는 동안 ‘아하, 오늘 내 삶이 바로 내가 찾던 길이로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책을 덮으면서 ‘그래, 오늘 내가 즐겁게 누리는 삶이 내가 찾던 길이네’ 하고 알아챕니다.
마음으로 읽을 때에 비로소 책입니다. 마음으로 읽을 때에 비로소 삶입니다. 사랑도 믿음도 꿈도 이야기도 모두 마음으로 읽습니다. 책이든 신문이든 지식을 얻자며 읽을 수 없습니다. 붙잡는다 싶으면 가루처럼 바스라지는 지식은 붙잡을 수 없거니와, 어떠한 책도 지식을 담지 못합니다. 지식으로 보이는 헛것을 담으려 할 뿐입니다. 어떠한 책도 사랑을 담습니다. 오래도록 따숩게 돌아보면서 껴안을 사랑을 담습니다. 글을 쓰는 이부터 스스로 즐겁고, 글을 읽는 이까지 모두 즐거울, 가장 빛나는 사랑을 담는 책입니다. 애써 책을 읽으면서 내 씩씩하고 어엿한 길을 찾고 싶은 사람이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내 하루를 씩씩하고 어엿하게 돌보면서 아끼고픈 사랑을 빛내는 사람입니다. (4345.6.3.해.ㅎㄲ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