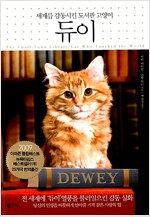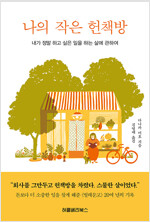숲노래 노래꽃
시를 씁니다 ― 64. 우리빛
날마다 새로 태어나는 책도 많지만, 날마다 버림받는 책도 많습니다. 어쩌면, 날마다 버림받는 만큼 새책이 태어난다고도 여길 수 있습니다. 저는 1992년부터 헌책집에서 ‘도서관에서 버린 책’을 만났는데, 헌책집지기님한테 여쭈니 “허허, 젊은이는 몰랐는가? 도서관은 책을 들이는 만큼 버려. 그런데 다시 찍지 않는 아까운 책을 엄청나게 버리지. 그럴 수밖에 없잖은가? 도서관을 세운 뒤에는 책을 둘 자리는 늘리지 않으니, 도서관에 새책을 놓으려면 옛책이나 헌책은 버려야 해. 그래서 우리 같은 헌책집 사람들이 ‘버림받은 책’ 가운데 되살릴 책을 캐내려고 하지.” 하고 말씀하더군요. 작은 헌책집 몇 곳에서 ‘버림치’를 되살리더라도 얼마 안 됩니다. 오래오래 사랑받으려고 태어난 책이지만, 그만 파묻히거나 사라져야 합니다. 올해에 갓 나온 책이라야 더 읽힐 만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나왔거나 대여섯 해 앞서 나왔기에 해묵지 않습니다. 모든 책은 한두 달이나 몇 해만 읽히고 버리도록 마련하지 않습니다. 모든 책은 종이가 바스라지고 낡더라도 두고두고 속으로 새기려고 빚습니다. ‘우리’는 누구이고, 너와 나는 어떤 숨빛일까 하고 늘 곱씹습니다. 되살려서 되읽고 싶은 책을 쓰다듬다가, 이 작은 종이꾸러미하고 나는 남남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인 빛일 텐데 하고 느낍니다. 책이 되어 준 나무를 떠올립니다. 나무를 지켜보는 별을 그립니다. 나무 곁에 있던 꽃과 돌을 되새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서로 새롭게 어울리려고 이곳에 태어났을 테지요.
ㅍㄹㄴ
우리빛
나만 덩그러니 있는 듯한데
아무도 나를 안 쳐다보는데
내가 서성여도 못 알아보고
울고 싶은 마음을 누르는데
별이 나를 보면서 속삭인다
“네가 혼자 있던 날은 없어.”
꽃이 나한테 다가와 말한다
“너는 여태 외롭던 적 없어.”
나무가 빙긋 웃더니 외친다
“너랑 내가 있어 우리 뜰이야.”
돌이 도르르 굴러 노래한다
“우리는 늘 네 곁에서 살았어.”
나비하고 내가 있어도 우리란다
빗방울과 내가 놀아도 우리이고
바람이랑 내가 나란하게 우리에
멀리 있는 너하고도 늘 우리래
글 : 숲노래·파란놀(최종규). 낱말책을 쓴다. 《풀꽃나무 들숲노래 동시 따라쓰기》,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들꽃내음 따라 걷다가 작은책집을 보았습니다》, 《우리말꽃》, 《쉬운 말이 평화》, 《곁말》,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이오덕 마음 읽기》을 썼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