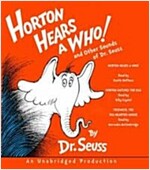숲노래 오늘책
오늘 읽기 2020.5.4.
《호튼》
닥터 수스 글·그림/김서정 옮김, 대교출판, 2008.4.25.
둘레에서 흔히 말하기를, 이제 우리 집 두 아이가 제법 커서 굳이 아버지랑 저자마실이나 바깥마실을 안 다닌다고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아이들은 냄새를 참 잘 느낀다. 풀냄새나 꽃냄새뿐 아니라 매캐한 냄새나 플라스틱 냄새도 바로 느낀다. 시골이라 해도 시골버스는 서울에서 다니는 버스하고 같다. 또 읍내만 해도 갖은 화학물질이 춤춘다.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하고 묻는 분이 제법 있다만, ‘그러니까 큰고장에 안 살고 시골에 살’며, 앞으로는 ‘숲으로 깃들려’고 생각한다. 책숲 얘기종이인 〈삶말 50〉을 부치려고 읍내를 다녀온다. 갓꽃이 이제 끝물이라 바지런히 훑는다. 이레쯤 뒤에는 갓꽃을 더 훑지 못하겠지. 올해 누릴 갓꽃 끓인 물을 생각하며 즐겁게 손을 놀린다. 한글판으로 나온 《호튼》을, 또 영어판으로 진작에 나온 이 그림책을, 또 이 그림책을 바탕으로 나온 만화영화를, 하나하나 생각한다. 모처럼 만화영화를 다시 보고 그림책을 새로 펼쳐서 헤아리니, 그림책도 영화도 훌륭하다. 작지도 크지도 않은 이 별에서 스스로 어떤 숨빛이 되어 이웃을 사귀느냐 하는 이야기를 놀랍도록 고운 사랑으로 풀어냈다. 지구도 별이고, 사람도 별이고, 풀벌레도 별이고, 꽃씨도 먼지도 다 별이다. ㅅㄴ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