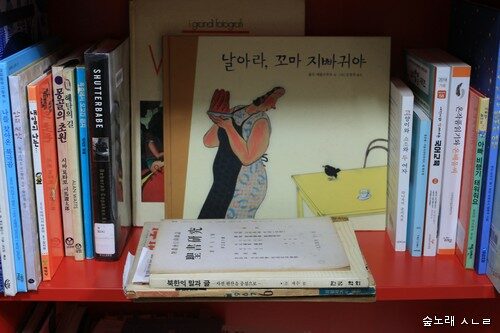대학교를 그만두는
이 나라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그만두기’하고 ‘대학교 그만두기’는 하늘하고 땅처럼 다르다. 앞길은 알아주는 이도 없지만 이미 기득권이 없는 이가 그나마 손에 쥘 만한 생존권마저 버리는 일로 여긴다. 뒷길은 기득권이 있거나 누릴 이가 기득권을 스스로 내버리는 일로 여긴다. 내가 더는 대학교를 못 다니겠다고, 이제 참말로 그만둬야겠다고 여겨 이를 대놓고 말할 적에 둘레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 생각이야?” 하고 물었다. 대학교를 안 마쳤다고 해서, 대학교 졸업장이 없대서 이 나라에서는 굶어죽어야 하는가? 설마? 어떤 이는 나더러 “배가 불렀군!” 하면서 비아냥댔다. 어버이가 대주는 돈으로 졸업장을 따면 수월할 텐데 ‘배가 불러’서 대학교를 그만두는 줄 여기더라. 어느 분은 아예 “미친 놈!”이라고 삿대질을 했다. 1997년 12월 31일에 군대를 마쳤다. 군대 밖으로 돌아오면서 곧장 휴학계를 자퇴서로 바꾸려 했다. 어머니가 뜯어말렸다. “얘야, 한 해만 더 다녀 보고, 그래도 다닐 만하지 않으면 그때 그만두면 어떻겠니?” 눈물젖은 어머니 말씀에 한 해를 더 다니기로 했다. 바로 그만두지는 못하고 한 해를 더 다니면서 새삼스레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적어 보련다. 첫째, 대학 강의가 너무 널널하다. 둘째, 널널한 대학 강의조차 빠지거나 졸며, 시험을 치를 적에 훔쳐쓰는 이가 매우 많다. 셋째, 널널한 강의인데 숙제를 다들 너무 안 하고, 강의 교재조차 안 읽기 일쑤요, 다른 책을 스스로 찾아 읽는 이를 거의 못 만났다. 게다가 얼마 없는 숙제조차 베끼는 이는 왜 그리도 많은지. 넷째, ‘학점 없이 청강’을 하는 이는 눈씻고 찾기 어려우며, 받아주는 교사나 강사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섯째, 책 사서 배울 적에는 돈 천 원도 아깝다 여기더니, 옷 사고 술 사고 담배 사고 여관 갈 적에는 다들 돈을 잘 쓰더라. 한 해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교시를 꾹꾹 눌러서 신문방송학과 네 해치 강의를 몽땅 들었다. 이러고도 시간표가 비어 나머지는 교양 강의로 빈틈을 메웠다. 다시 말해서, 한 해면 너끈히 다 배울 네 해치 대학 강의인 셈이요, 조금 더 조이면 한 학기로도 넉넉하다. 더 조인다면 두어 달 만에도 ‘대학교 네 해 배움길’을 마칠 테고, 더더욱 조이면 한 달 만에도 ‘대학교 네 해치 배움길’을 마칠 만했다고 느꼈다. 그러나 정작 숱한 대학생은 졸업장을 손에 쥐어 기득권을 같이 나누는 데에 힘을 쓰더라. 나는 삶을 배우고, 삶을 짓는 슬기를 배우고 싶어서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이를 가르치거나 배우는 틀을 찾을 수 없어서 그만두었다. 따사로운 사랑이 흐르지 않으니 더 다닐 수 없더라. 줄세우기에 길들도록 내모는데 그만둘 수밖에 없더라. 등록금이나 학비에 들어갈 목돈이라면, 이 돈으로 스스로 배움길에 나서면 되겠더라. 해마다 대학교에 바쳐야 하는 돈이라면, 그 돈으로 아름다운 책을 사서 읽고 골골샅샅 걸어서 마실을 다니면서 깊고 너른 삶을 새삼스레 배울 수 있겠더라. “남들 다 가지는 졸업장 하나 네가 안 가진대서 사회가 얼마나 달라지겠니?” 하고 묻는 이웃이 있었다. “네, 안 바뀔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런 나라라면 저는 더더욱 대학교 졸업장을 안 갖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 나라라면 짐을 싸든지, 나라를 갈아엎어야지요.” 하고 대꾸했다. 이 이웃은 그 뒤로 나랑 멀어졌다. 나는 졸업장이나 학번을 안 묻는, 아니 졸업장이나 학번을 모르는 이웃하고 어깨동무를 할 생각이다. 대학교를 그만둔다는 뜻은, 삶을 새롭게 가꾸면서 노래를 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려는 마음이다. 1999.8.30. ㅅㄴㄹ
(숲노래/최종규 . 삶과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