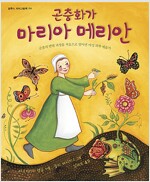숲노래 책빛
책하루, 책과 사귀다 38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
2004년에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Maria Sibylla Merian)’ 님 책 가운데 하나(Das Insektenbuch)를 추린 《곤충·책》이 우리말로 처음 나옵니다. 한 해 앞서 이녁을 다룬 《나는 꽃과 나비를 그린다》가 우리말로 나오나 쉬 판이 끊어집니다. 2011년에 이녁을 다룬 그림책 《곤충화가 마리아 메리안》이, 2021년에 《나비를 그리는 소녀》가 나오는군요. 이제서야 읽히나 싶지만, 아직 제대로 읽히기는 멀었지 싶습니다. 이이는 “꽃과 나비를 그렸다”기보다 “풀벌레와 풀꽃밭을 사랑하며 그렸다”고 해야지 싶어요. 둘레에서 “돈이 될 그림만 겉멋을 부려 그리던 무렵”에 “풀벌레하고 풀꽃나무를 사랑으로 지켜보고 그림으로 옮겨서 널리 알리려고 온품과 온돈을 바쳤다”고 보아야지 싶고요. 풀벌레하고 풀꽃이 어떤 사이인가를 읽고, 풀꽃나무하고 사람하고 숲이 어떻게 얽히는가를 차분히 밝히고 글을 함께 썼구나 싶어요. 우리가 짓는 하루를 글그림으로 옮기면서 우리가 나눌 사랑을 붓끝으로 펴며 우리가 가꿀 생각을 북돋았다고 느껴요. ‘곤충학자·화가’도 ‘여성 곤충학자·화가’도 아닌 ‘숲사람’으로서 이 푸른별이 참말로 푸른숲이 되기를 꿈꾸는 사랑을 한 땀씩 여미었다고, 오직 푸른사랑으로 스스로 숲이었다고 생각합니다.
ㅅㄴㄹ
*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 (1647∼1717) *
동판화가이자 역사가이자 지리학자이자 서지학자로 이름을 날린 ‘마테우스 메리안’이 낳은 딸. 그렇지만 ‘마테우스 메리안’ 빛살(후광)은 집안사람한테 조금도 퍼지지 못했다.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을 낳은 어머니는 ‘마테우스 메리안이 나중에 얻은 가시내’였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죽자 그 집안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자리(신분)에 하잘것없는 살림에 아무것도 없는 몸으로 스스로 모든 삶을 일군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 독일 마르크돈 500마르크짜리에 얼굴을 새기기도 한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 이이가 조그마한 벌레 삶을 헤아리며 그림으로 남기던 때에는, “애벌레나 구더기들이 더러운 쓰레기에서 생겨난 악마”라고 여겼다지. 마녀로 도장찍혀 죽을 수 있었고,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이 오랜 삶길과 지켜보기로 빚어낸 책과 그림을 놓고 ‘거짓말’이라고 깎아내리는 터무니없는 말을 들으면서 쓴맛을 견디어내야 했다. 그러나 언제나 즐겁고 꿋꿋하며 사랑스레 온누리 벌레붙이를 사랑했고, 글하고 그림으로 벌레살이를 아로새겼다. 어마어마하다 싶은 가시밭길을 온몸으로 기꺼이 맞아들이면서 일흔 해를 살았다. (숲노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