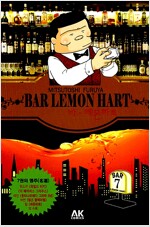숲노래 오늘책
오늘 읽기 2019.10.18.
《바 레몬하트 7》
후루야 미츠토시 글·그림/정은서 옮김, AK 코믹스, 2012.3.30.
술을 마시는 사람은 술 한 모금이 반가울 수 있을 테고, 이 술을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함께할 사람이 반가울 수 있다. 오늘 눈앞에서 술이 되어 곁에 있는 포도나무이며 보리밭이며 옥수수밭이며 들판이 새삼스러울 수도 있겠지. 알맞게 무르익도록 내리쪼아 준 햇볕을 느끼며 고마울 수 있고, 살며시 깃든 바람이며 빗물이 기쁠 수 있다. 《바 레몬하트》를 꾸러미로 장만해서 묵혀 놓다가 일곱걸음을 읽어 본다. 어느 술은 묵히기에 맛나다고 하듯, 어느 만화는 묵히기에 새롭다고 할 만하리라. 더 마시고 싶은 술이나, 날마다 찾아가고픈 어느 술집이라기보다, 늘 마음으로 마주하고픈 한 가지에, 언제나 마음으로 만나고 싶은 한 사람일 수 있으리라. 주머니에 따라 마실 수 있는 술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값을 더 치러야 마실 수 있기에 맛난 술이 아니라, 서로 따사로운 숨소리를 나누기에 멋있는 술이 되겠지. 술이 아닌 떡이나 밥이나 빵이어도, 커피나 맹물 한 모금이어도, 또 가을들을 적시는 가을비 한 줄기여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손에 쥐는 책은 어떠한가. 우리가 손수 짓는 글 한 줄은 어떠한가. 우리가 마음으로 길어올려 터뜨리는 말 한 마디는 어떠한가. 모두 매한가지이면서 한동아리이지 않을까. ㅅㄴ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