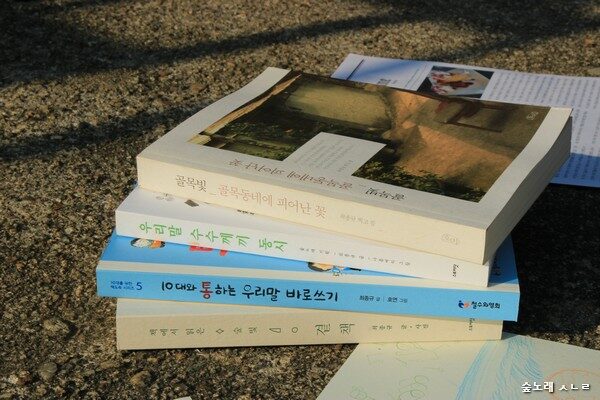#숲노래낱말책 #숲노래말꽃 #숲노래사전 #우리말꽃
2023.5.21.
숲노래 씨가 몇 해 앞서부터
문득 새로 지어서 쓰는 ‘아이곁’이란
투박한 우리말이 있다.
숲노래 씨는 대단하거나 놀라운 우리말이 아닌,
누구나 아무렇지 않고 스스럼이 없이
그저 스스로 늘 쉽게 지을 수 있는
말길을 틔우는 사전을 쓴다.
그래서 ‘육아’란 얄딱구리하고
일본스러운 한자말이 아닌,
‘아이사랑’을 드러낼 말을 쓰려고 한다.
그렇다.
우리는 ‘아이사랑’을 하면 된다.
‘나사랑’을 하면 된다.
‘아이사랑·나사랑’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은 바로 ‘아이곁’이다.
.
.
아이곁
아이를 돌본다면 ‘아이돌봄’이라 하면 된다. ‘아이돌봄’을 굳이 ‘아이(兒) + 기름(育)’이란 얼거리로 ‘육아’란 한자말을 써야 하지 않는다. 우리말은 “아이를 기른다 = 아이기름”으로, “아이를 돌본다 = 아이돌봄”으로 나타내면 된다. 즐겨 찾는다고 하기에 ‘즐겨찾기(즐겨 + 찾기)’이고, 새롭게 본다고 하기에 ‘새로보기(새로 + 보기)’이다. 책 하나를 돌려서 읽는다면 ‘돌려읽기(돌려 + 읽기)’이다. 책을 깊이 읽으니 ‘깊이읽기(깊이 + 읽기)’이다. 말짓기란 투박하고 수수하면서 쉽다. 아이 곁에서 아이하고 나란히 설 뿐 아니라, 아이를 어른하고 똑같은 ‘숨빛(생명)’으로 바라보려는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기쁘게 오늘을 지으려는 살림자락을 그저 투박하고 수수하고 쉽게 ‘아이곁(아이 + 곁)’으로 나타낸다.
+++
아이곁 (아이 + 곁) : 아이 곁에 있음. 또는 아이 곁에 있는 어른이나 어버이. 아이가 누릴 삶을 헤아리면서, 아이가 스스로 살림을 가꾸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곁에서 지켜보고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차근차근 이끌거나 도우면서 함게 즐겁게 살아가려는 길을 나타내는 말. (= 아이사랑·아이돌봄··아이봄아이기름. ← 육아, 탁아, 양육, 육영, 훈육, 보육)
아이사랑 (아이 + 사랑) : 아이를 사랑함. 또는 아이를 사랑으로 마주하거나 맞이하거나 낳거나 함께하거나 보금자리를 일구는 길·하루·삶·숨결·눈빛·마음. 아이가 누릴 삶을 헤아리면서, 아이가 스스로 살림을 가꾸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곁에서 지켜보고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차근차근 이끌거나 도우면서 함게 즐겁게 살아가려는 길을 나타내는 말. (= 아이곁·아이돌봄·아이봄·아이기름. ← 육아, 탁아, 양육, 육영, 훈육, 보육)
아기돌봄 (아기 + 돌보다 + ㅁ) : 아기를 돌보는 일. 아이가 누릴 삶을 헤아리면서, 아이가 스스로 살림을 가꾸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곁에서 지켜보고 살펴보고 돌아보면서 차근차근 이끌거나 도우면서 함께 즐겁게 살아가려는 길. (= 아기봄·아이곁·아이기름. ← 육아, 탁아, 양육, 육영, 훈육, 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