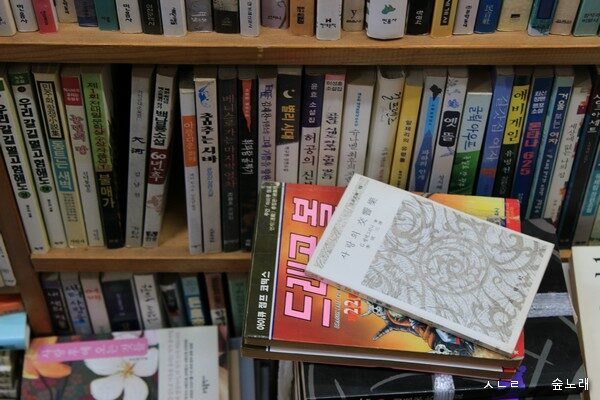숲노래 책숲마실
꾸덕살 (2022.9.27.)
― 인천 〈아벨서점〉
어머니 손은 언제나 누러면서 딱딱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조차 쉬는 날이 없이 일하셨거든요. 어머니는 이따금 심부름을 맡기지만 따로 집안일을 거들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짊어지려 하면서 “넌 공부나 해.” 하고 핀잔했습니다. 짝꿍이 쉬잖고 일할 적에 다른 짝은 무엇을 할 적에 서로 아름다우면서 즐거워서 사랑일까요? 집안일도 집밖일도 가를 수 없습니다. 모든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면, 일나눔(가사분담)이 아닌 두레랑 품앗이여야 알맞지 싶어요.
인천을 떠나 서울에서 새뜸나름이(신문배달부)로 일하면서 손가락에 굳은살이 착착 박였습니다. 새벽부터 일하고, 살림을 건사하고, 자전거를 달려 책집마실을 다녀오고, 잠자리에 들기 앞서까지 책을 읽고 종이에 글을 쓰노라면 손가락도 손바닥도 쉴 겨를이 없다시피 합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배움길을 온 언니가 어느 날 “‘굳은살’? 그게 뭐야? 아, 이건 ‘꾸덕살’이라고 하지. ‘굳은살’이란 말이 어딨냐?” 하고 나무랍니다. “꾸덕살이라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허허, 넌 우리말을 배운다면서 우리말도 모르니?” 다시 꾸지람을 듣습니다.
가만 보면 ‘꾸덕살’이라고도 하지만 ‘옹이’라고도 합니다. ‘옹이’는 나뭇가지 한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마치 나무처럼 단단하게 잡힌 살점을 빗대기도 하고, 마음에 멍울처럼 잡힌 아픈 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저는 1992년부터 제대로 책숲마실을 다녔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부터 서른 해 남짓 온나라 책집을 돌면서 바라보노라면, 헌책집지기는 모두 손마디에 옹이나 꾸덕살이 잡혔습니다. 요 몇 해 사이에 새롭게 태어난 마을책집지기 가운데 손마디에 옹이나 꾸덕살이 잡힌 분은 드뭅니다. “책을 만졌다”고 하려면 “흙을 만졌다”고 할 여름지기처럼 손마디도 손발바닥도 나무처럼 옹이가 잡힐 테지요. 〈아벨서점〉 책지기 손마디를 새삼스레 바라봅니다. “아벨지기님 이 손이 책을 만지고 살린 숨결입니다.” 하는 말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늙음은 죽음길이되, 철듦은 살림길입니다. 나이만 먹으면 늙은몸이요, 철이 들면 어른빛입니다. 끝이란 꽃이니, 몸을 내려놓고서 삶을 쉬는 길은 꽃으로 피어나 씨앗을 남기는 사랑이에요. 그저 ‘늙음’만이라면 틀림없이 끝입니다. 겉보기로 허름하기에 ‘끝으로 가는 책’이지 않아요. 모든 헌책은 옹이가 맺힌 손마디로 쓰다듬는 숨결을 받고서 새롭게 읽히는 꽃씨로 거듭납니다. 반들반들한 새책을 안 싫어합니다. 다만 꾸덕살로 쓰고 엮어 꾸덕살로 읽는 책을 조금 더 즐길 뿐입니다.
ㅅㄴㄹ
《베스트문고 129 비밀일기》(S.타운젠드/안종설 옮김, 삼중당, 1987.9.20.첫/1990.4.10.중판)
《舊約聖經에서 본 障碍者》(나이또 토시히로/박천만·김경란 옮김, 한국장애자 전도협회, 1989.11.30.)
《방언 연구》(안토니 훼케마/정정숙 옮김, 신망애출판사, 1972.6.1.첫/1991.6.15.중판)
《의산문답》(홍대용/이숙경·김영호 옮김, 꿈이있는세상, 2006.4.15.첫/2006.11.1.2벌)
《잘해 주지 마! 1》(마츠야마 하나코/김재인 옮김, 애니북스, 2012.8.16.)
《잘해 주지 마! 2》(마츠야마 하나코/김재인 옮김, 애니북스, 2012.8.16.)
《정음문고 68 사랑의 交響樂》(G.펠레그리니/이성삼 옮김, 정음사, 1974.5.20.첫/1982.11.30.중판)
《꼴찌 강아지》(프랭크 에시/김서정 옮김, 마루벌, 2008.1.26.)
《광대열전》(김명곤, 예문, 1988.12.31.)
《꿈의 작업》(스트레폰 카플란 윌리암스/노혜숙·오명선 옮김, 청하, 1988.7.20.)
《花壇づくり》(脇坂誠, 保育社, 1969.3.1.)
《드래곤볼 22》(토리야마 아키라/아이큐점프 편집부, 서울문화사, 1993.9.25.2벌)
《드래곤볼 29》(토리야마 아키라/아이큐점프 편집부, 서울문화사, 1993.10.1.3벌)
《엘살바도로 맹그로브 숲의 아이들》(조은숙, 명문미디어 아트팩, 2018.10.1.)
《옛날에 어떤 생쥐가…》(인도 우화/이미림 옮김, 분도출판사, 1978.첫/1997.7벌)
《별아기》(오스카 와일드 글·파이어나 프렌치 그림/김영무 옮김, 분도출판사, 1983.첫/1995.4벌)
《내꺼야!》(레오 리오니/서명희 옮김, 분도출판사, 1987.첫/1996.6벌)
《잠잠이》(레오 리오니/이영희 옮김, 분도출판사, 1980.첫/1995.6벌)
※ 글쓴이
숲노래(최종규) : 우리말꽃(국어사전)을 씁니다. “말꽃 짓는 책숲, 숲노래”라는 이름으로 시골인 전남 고흥에서 서재도서관·책박물관을 꾸리는 사람. ‘보리 국어사전’ 편집장을 맡았고, ‘이오덕 어른 유고’를 갈무리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말이 뭐예요?》, 《쉬운 말이 평화》, 《곁말》, 《곁책》, 《새로 쓰는 비슷한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겹말 꾸러미 사전》, 《새로 쓰는 우리말 꾸러미 사전》,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우리말 동시 사전》, 《우리말 글쓰기 사전》, 《이오덕 마음 읽기》,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마을에서 살려낸 우리말》, 《읽는 우리말 사전 1·2·3》 들을 썼습니다. blog.naver.com/hbooklo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