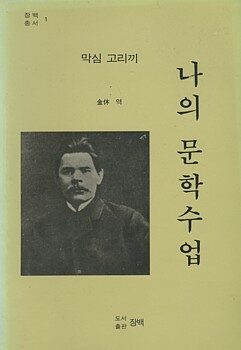-

-
나의 문학수업 - 장백총서 1
막심 고리키 / 장백 / 1989년 4월
평점 :

절판

숨막히는 서울과 숨막는 도시
― 막심 고리끼, 《나의 문학수업》
- 첵이름 : 나의 문학수업
- 글 : 막심 고리끼
- 옮긴이 : 김휴
- 펴낸곳 : 장백 (1989.4.1.)
참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거나 서울 둘레에서 삽니다. 아마 우리 나라 사람 가운데 1/2은 서울이나 서울 둘레에서 살아가지 싶어요. 서울은 자꾸 커질밖에 없고, 자꾸 커지더라도 바글바글 웅성거리는 사람들로 비좁아 서로가 서로를 더 따스하거나 넉넉히 바라보거나 감싸안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하고, 살아가야 하며, 살아숨쉬어야 하니까요.
옛말에 열 사람이 밥 한 숟가락씩 덜어 밥 한 그릇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열한 사람이 있을 때에 한 사람을 열 사람과 같이 먹여살릴 만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울이라는 곳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열 사람이 아닌 다섯 사람이 한 숟갈을 나눈다기보다 두 사람이 한 숟가락씩 나눕니다. 열 사람이 열 숟가락을 나누면, 이 열 숟가락으로 다른 한 사람도 버틸 만할 뿐 아니라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열 사람도 버틸 만할 뿐 아니라 살아갈 만합니다. 그러나 다섯 사람한테서 한 숟갈을 얻으면? 다섯 숟갈 밥을 먹는 사람도 살아갈 만할까요? 한 숟갈만 나누어 준 다섯 사람이야 먹고살 만하겠지요. 딱 둘이 있는데, 한 사람한테서 한 숟가락만 얻는다면? 한 숟가락 먹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숟가락만 나누어 준 한 사람이야 먹고사는 걱정이 없겠지요.
서울에서 살아가거나 서울 둘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자쑤 새로운 도심으로 다시 몰립니다. 서울로 몰린 다음에 ‘또다른 새 서울’을 만들어 더 몰립니다. 더 겨루고 더 싸우며 더 복닥입니다. 서울로 가면 어떻든 일자리도 있고 먹고살 구멍이 있겠거니 여기던 사람들은 ‘그냥 서울’이 아닌 ‘새로 만드는 또다른 서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무너져 내립니다. 땅 팔고 소 팔며 집 팔아 서울로 온 사람들이 무엇을 팔아 ‘새로 만드는 또다른 비싼 서울’에 끼어들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일찍부터 돈과 힘과 이름으로 새 서울을 이룩한 사람들이 뭣하러 가난뱅이 다른 동네 사람을 끼워 주겠습니까.
예전부터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나 새롭게 서울로 찾아든 사람이나 똑같이 팍팍합니다. 나누기보다 지키려고 메마르면서 팍팍하고, 나누기보다 얻으려고 쓸쓸하면서 팍팍합니다. 출판사나 헌책방이 서울에 많이 몰렸기에, 볼일을 보러 서울로 마실을 다녀와야 할 때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든 서울에서 북적이거나 치이거나 밀리느라 숨이 막히며 괴롭습니다. 볼일은 보고 책방마실도 한다지만, 살내음과 꽃내음과 흙내음과 바람내음과 햇살내음을 맡거나 나눌 수 없는 터전에서는 가슴이 시리고 속이 아픕니다.
.. 나는 내가 한 사람의 좋은 일꾼이라는 데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는 자신의 일과 모든 노동을 사랑하기 대문이다.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도 나는 도처에 수없이 존재하는 인간 중의 한 명에 지나지 않는다. 곳곳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노동자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노동자의 위치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 (65∼66쪽)
서울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서울에서 손꼽히는 몇몇 대학교에 내 아이를 보내고 싶어 안달을 할밖에 없습니다. 서울에서 살아가는 터라 서울에서 손꼽히는 몇몇 대학교에 내 아이를 보내자면 고등학교와 중학교부터 잘 골라서 넣으려고 애쓸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더 빠듯하게 굴려야 하고, 이 학원 저 학원 안 넣을 수 없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아이는 어린 나날부터 숱한 학원에 얽매여야 하고, 어버이는 아이를 학원에 보낼 돈을 벌어들여야 합니다.
아이들한테 대학교바라기를 하기에 아이들과 살가이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생각을 주고받기 힘듭니다. 대학교바라기를 접고는 일자리 마련하여 돈벌기를 바랄 때에도 즐거이 찾아 즐거이 붙잡을 일거리보다는 오래도록 넉넉히 돈을 벌어들일 일자리를 살필밖에 없습니다. 즐거울 일을 즐겁게 살피며 즐거이 이야기꽃을 피우기보다는, 돈이 될 일자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돈이 될 일자리를 얻자면 어떠한 돈구멍을 찾아야 하느냐는 이야기에 머물고 맙니다.
.. 사람들은 이들을 깔아뭉개는 일을 즐거워하지만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며, 항상 냉혹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 레닌은 ‘바보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필요한 것을 말해 왔다. 그에게는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 벌써 35년 전에 ‘우리는 과거의 유산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그의 전 생애 속에서 부르조아 문화라 할지라도 가치가 있는 것은 조금도 부정하지 않았다. 부르조아 문화 속에 있는 가치있는 것이야말로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며, 모든 노동 부문과 문학 부문에 있어서 ‘훈련’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다! 바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 그룹 간의 알력과 불화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만약에 ‘인정된 재능’과 문학의 수호자들이 이기심과 자만심에 의해서 그 불화를 격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면,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신의 위치에 대한 고민을 이 논쟁 속에 나누어 싣지 않는다면, 이 불화는 훨씬 더 교휸적인 유익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 각자 한 마리씩 자신의 집을 짓고 사는 거미처럼 생활하면서, 자신의 생활방식 이외에는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즉 마음의 저 밑바닥에서 생활하는 소시민들은, 생활에 대한 새로운 관계가 폭풍처럼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다 .. (69, 71, 144쪽)
도시를 버리고 시골로 가야 사람이 사람다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도시가 시골로 탈바꿈할 수 있을 테니까요. 서울을 떠나 작은도시나 시골로 가야 제대로 살아숨쉰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도 얼마든지 서로서로 사랑하며 살아숨쉴 터전으로 거듭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 나라 도시가 시골다움을 사랑할 듯하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 서울이 시골스러움을 받아들일 듯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터전이 없고, 아이들이 자동차 걱정을 하지 않고 신나게 내달릴 골목이 없으며, 아이들이 돈벌이와 대학교와 아파트 근심을 하지 않으며 배울 만한 마당이 없는 도시요 서울입니다.
어린이가 푸름이를 거쳐 어른이 되어서 할 일이란 ‘돈버는 일’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돈버는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기계가 아닙니다. 어린이는 어린이여야지 시험점수 잘 따는 기계가 아닙니다.
막심 고리끼 님은 《나의 문학수업》에서 사람다이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문학으로 무엇을 담아 누구하고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를 왜 나눌 때에 아름답거나 즐거운가 하고 밝힙니다. 문학이란 그예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4344.2.9.물.ㅎㄲㅅ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