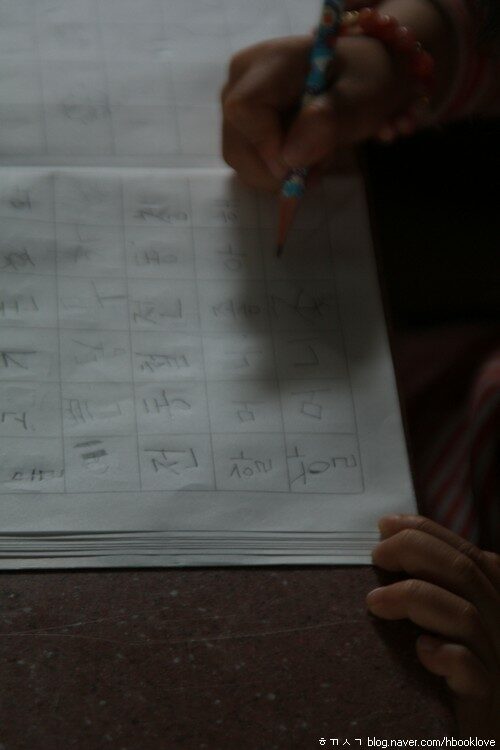
쓰는 대로 생각한다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면, 글에 아름다움이 살며시 깃든다. 슬픔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면, 글에 슬픔이 천천히 밴다. 웃고 노래하는 하루를 떠올리면서 글을 쓰면, 글에 웃고 노래하는 이야기 감돈다. 울고 악쓰던 하루를 떠올리면서 글을 쓰면, 아, 이런 울부짖음과 악쓰기를 차마 어찌 읽을까.
지구별에 평화가 없을까? 평화가 없다고 생각하면 참말 평화가 없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글이 무겁고 슬프다. 지구별에 사랑이 있을까?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면 참말 사랑 따스한 모습이 피어나면서 글이 가볍고 즐겁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는가에 따라 글이 달라진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랑하는가에 따라 글이 바뀐다. 늘 자동차 물결 쳐다보고 자동차 소리 들으면서 자동차 배기가스 맡는다면, 글이고 노래이고 춤이고 그림이고 사진이고 온통 자동차투성이 되리라. 언제나 숲바람 마시면서 숲노래 듣고 숲내음 누리면, 글이든 노래이든 춤이든 그림이든 사진이든 그예 숲잔치 이루리라.
새벽 네 시 언저리부터 멧새 노래하는 소리 들으며 시골집 하루를 연다. 저 멧새는 새벽 네 시 언저리부터 노래를 했을까. 때때로 밤을 지새우며 멧새 노랫소리를 가누어 본다. 어느 멧새는 내도록 노래를 부르고, 어느 멧새는 네 시 언저리부터, 또 어느 멧새는 대여섯 시 언저리부터 노래를 부른다.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아이들 기지개 켜다가 잠꼬대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불 걷어차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쉬 마렵다며 끙끙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내가 듣는 소리는 내 삶이 되고, 내 삶은 내 넋이 되어, 내 넋은 내 글로 태어난다. 4346.5.11.흙.ㅎㄲㅅㄱ
(최종규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