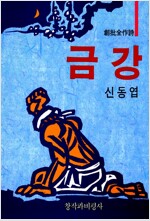
내 삶에 한 줄, 새롭게 읽는 책
예전에 읽은 책을 부러 다시 장만하기도 합니다. 책방마실을 하다가 문득 내 눈에 들어온 책 하나 가슴 두근두근 마음 콩닥콩닥 북돋우면, 살며시 집어들어 살살 쓰다듬어 봅니다. 그러고는 새로 장만합니다.
지난날 읽은 책인 줄 알고, 내 서재도서관에 두 권 꽂힌 줄 알지만 굳이 새롭게 장만합니다. 서재도서관에 둔 책으로 다시 읽을 수 있지만, 이렇게 책방마실을 하는 길에 새삼스레 장만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외버스에 앉아 느긋하게 읽고 싶습니다. 1989년에 새 옷을 입은 신동엽 님 서사시 《금강》(창작과비평사)을 읽습니다. 첫머리에 “그 가슴 두근거리는 큰 역사를 /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 그땐 / 그 오포 부는 하늘 아래 더러 살고 있었단다(7쪽).” 하는 이야기가 흐릅니다. 귀로 듣거나 눈으로 지켜본 이야기 아닌 몸으로 겪은 이야기를 헤아립니다. 남들이 들려준 이야기나 책에서 읽는 이야기 아닌 몸소 겪은 이야기를 돌아봅니다.

내 몸에는 어떤 이야기가 아로새겨졌을까요. 나는 어떤 이야기를 가슴에 아로새기며 살아갈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저마다 아로새기며 하루를 누릴까요. 서사시는 흘러 “3천의 / 농민들이 대창 들고 관청에 몰려와 / 병사 내쫓고 아전 죽이고 / 노비문서 불살라버렸다(12쪽).” 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동학농민혁명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에 앞서 이른바 ‘민란’이라 이름 붙은 지난 역사 이야기입니다. 흙을 일구던 이들은 대나무 깎아 창을 만들어 관청으로 몰려갑니다. 흙을 일구던 이들은 무기 하나 이름 하나 권력 하나 돈 하나 없이 두레와 품앗이로 살아갔습니다만, 이들 흙일꾼을 억누르거나 들볶거나 죽이기까지 하던 관청사람과 궁궐사람 때문에 더는 견디지 못하고 벌떡 일어서요. 이러면서 농사꾼들이 한 일은 ‘노비문서’ 불사르기예요.
읽던 시집을 가만히 덮고 생각에 잠깁니다. 궁궐사람과 관청사람은 노비문서를 만들고 족보를 만들어요. 사람은 다 아름다운 사람인데, 저마다 계급을 짓고 울타리를 세우며 신분을 갈라요. 손에 흙 한 줌 물 한 방울 대지 않고도 기름진 밥을 누릴 뿐 아니라, 나랏일을 돌본다느니 민생을 걱정한다느니 읊어요. 참말, 나랏일을 돌보려 한다면 흙일꾼과 나란히 흙을 일구면 되는데요. 참으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세금 거둘 생각 말고 공무원 권력과 양반 신분을 불사르면 되는데요.

겨울날에도 눈부시게 파랗디파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시를 다시 읽습니다. “사람은 한울님이니라 / 노비도 농사꾼도 천민도 / 사람은 한울님이니라 // 우리는 마음속에 한울님을 모시고 사니라 / 우리의 내부에 한울님이 살아 계시니라 / 우리의 밖에 있을 때 한울님은 바람, / 우리는 각자 스스로 한울님을 깨달을 뿐, / 아무에게도 옮기지 못하니라(21∼22쪽).” 하는 이야기가 흐릅니다. 그러고 보니,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며 ‘동학’이 무엇인지 배운 적 없습니다. 고등학교 철학 수업 때에도, 중학교 도덕 수업 때에도, 대학교 교양강좌 때에도, 어느 누구도 동학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철학자나 지식인 가운데 동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기독교 학교나 천주교 학교는 있지만 ‘동학 학교’는 없어요.
동학은 종교일까요. 동학은 지식일까요. 동학은 학문일까요. 아니, 동학은 ‘흙 만지고 물 만지는 사람들 삶을 사랑하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어린이도 늙은이도 모두 한울님이라 말하고, 풀도 나무도 모두 한울님이라 밝히는 동학 이야기를 왜 오늘날 이 나라 이 땅 이 마을에서는 들을 수 없는지 고개를 갸웃갸웃해 봅니다.

“봄이면 꽃 / 여름이면 하늘 / 가을이면 귀뚜라미 / 겨울이면 추위 // 전봉준은 자주 / 아들의 손을 이끌고 / 아내의 무덤 앞 찾아와 / 말없이 / 몇 시간씩 / 서 있다 가곤 했다. // 그림이었으리라(75쪽).” 하고 흐르는 이야기를 읽다가 우리 집 아이들 노랫소리를 듣습니다. 그래, 밥할 무렵이로구나. 집에서 살림하는 아버지가 얼른 밥을 차려야지. 너희 배고프겠네. 조금 더 놀면서 노래하렴. 아버지가 맛난 밥 예쁘게 차릴 테니까, 그동안 신나게 뛰놀렴. 마당에서도 뛰놀고, 마루에서도 뛰놀렴. 마당에서는 하늘바라기를 하고, 집에서는 누나와 동생 서로 사이좋게 아끼면서 놀렴.
밥이 보글보글 끓습니다. 국이 자글자글 끓습니다. 밥상에 수저를 놓습니다. 나물을 버무리고, 무를 썹니다. 밥과 국이 다 되면 작은아이 것을 맨 먼저 뜹니다. 작은아이는 뜨거운 것을 못 먹으니, 맨 먼저 작은아이 것을 떠서 식힙니다. 이 다음으로는 큰아이 것을 뜨고, 어머니와 아버지 몫은 나중에 뜹니다. 이제, 날마다 새로운 밥을 즐겁게 먹을 때입니다. 4345.12.15.흙.ㅎㄲㅅㄱ
(최종규 . 2012)

아이야, 너는 마음껏 놀며 생각날개를 펼치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