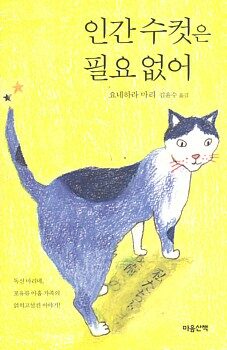-

-
인간 수컷은 필요 없어 ㅣ 지식여행자 5
요네하라 마리 지음, 김윤수 옮김 / 마음산책 / 2008년 8월
평점 :

품절

‘사람 수컷’은 키울 값어치가 없을까
[책읽기 삶읽기 43] 요네하라 마리, 《인간 수컷은 필요 없어》
일본에서 나온 책이름은 “사람 수컷은 안 키우나?”였다는데, 한국에서 나오는 책이름은 “인간 수컷은 필요 없어”가 되고 만, 요네하라 마리 님 산문책을 읽으며 생각한다.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책이름이 자꾸만 마음에 걸린다.
“사람 수컷은 안 키우나?”하고 “인간 수컷은 필요 없어”는 아주 다르다. 뜻과 느낌과 마음과 생각과 매무새가 모두 다르다. 살아가는 결과 어우러지는 무늬가 다르다.
요네하라 마리 님 책에 이런 이름을 붙여야 어울린다고 생각했을까. 요네하라 마리 님 같은 사람한테 이런 책이름을 달아야 알맞다고 여겼을까. ‘수컷인 사람’을 키울 겨를이 없이 통역 일과 글쓰기로 바쁜 요네하라 마리 님이니, 집에서 ‘수컷인 사람을 키울’ 수 없을 텐데, 이러한 대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붙인 이름이라고 느낀다.
‘사람 수컷’은 손이 좀 많이 가는가. ‘어른인 사람 수컷’은 ‘아이인 사람 수컷’과 견주어 손에 얼마나 많이 가는가. 아이는 어버이가 차린 밥을 고맙게 받아먹고, 아기는 어머니가 물리는 젖을 즐거이 빨아먹는다. 어른인 사람 수컷은 요 투정 저 투덜로 골을 부리기 일쑤이다. 어른인 사람 수컷 가운데 스스로 밥과 옷을 챙기거나 집안을 쓸고 닦거나 치우는 이는 얼마나 될까. 스스로 제 삶을 건사하는 ‘사람다운 사람 수컷’을 찾자면 얼마나 힘을 들이고 품을 들여야 할까. 애써 애먼 품을 들였다가 나중에 빈 껍데기인 줄 알아채면 얼마나 기운이 빠질까.
글쓴이 요네하라 마리 님한테 ‘사람 수컷이 쓸모없을’ 까닭이 없다. 굳이 ‘사람 수컷은 안 키우며 즐거이 누리는’ 삶이다.
.. “그 어떤 보석도 이보다 아름답지는 못해.” 너무 흔해빠진 비유에 나 스스로도 부끄러웠다. 이런 눈동자가 바라보는데 거역할 자가 그 어디에 있을 것인가 .. (47쪽)
고양이나 개 아닌 사람한테서 ‘맑은 눈빛과 밝은 눈망울’을 느낀다면, 요네하라 마리 님은 틀림없이 ‘사람 수컷도 참 좋구나’ 하고 받아들이리라 본다. 다만, 이렇게 느낄 일이 거의 없었으니 사람 수컷은 안 키웠겠지.
생각해 볼 노릇이다. 사람 수컷은 집일이나 집살림에 눈길을 안 둔다. 집안에 사람 수컷을 들이면, 이때부터 사람 암컷은 집일과 집살림에다가 사람 수컷을 건사하는 몫을 맡고,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면 집일과 집살림에다가 사람 수컷이랑 아이 돌보기까지 도맡아야 한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낀다. 사람 수컷이 회사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도맡아 돌본다든지 집일과 집살림을 힘껏 보살피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될까. 1억 연봉을 집어치우고 집에서 아이를 사랑하는 길을 걸으려는 사람 수컷이 있기나 있을까.
.. “그래서 중성화수술, 즉 에리는 4개월쯤에 피임수술, 우리는 6개월쯤에 거세수술을 하는 편이 좋겠네요.” “뭐라고요?” “마리 씨, 피임과 거세를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아아, 네.” “피임은 임신을 피하다, 거세는 생식력을 없애는 거죠.” “하지만 선생님, 좀 가여운데요. 조금은 경험하게 해 주고 싶다고 할까…….” “흠, 경험하게 해 주고 싶다라.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죠. 저 역시 이 녀석들 몸에 칼을 대고 싶지 않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태어나면 키울 각오는 하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단, 녀석들은 암수니까 1년에 2∼3차례, 4∼6마리씩 낳겠죠. 태어난 새끼 고양이들이 각각 또 낳고 그 새끼들이 다시 낳으니까, 뭐, 1년 후에는 대략 64마리 정도 될까요. 다음해에도 계속 늘어나겠죠. 그 정도 키울 각오가 있으시면 저는 전혀 말리지 않습니다.” .. (68쪽)
《인간 수컷은 필요 없어》(마음산책,2008)라는 책은 책이름을 옳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느낀다. 책이름부터 옳게 바로잡으면서 이 책이 우리들한테 들려주려는 이야기를 곱게 아로새기도록 도와야 한다고 느낀다.
사람 수컷이 없으면 사람 암컷도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 사람 수컷이 쓸모없거나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책이 아니라, 맑지 않고 밝지 않을 뿐더러 사랑스럽지 않은 길을 자꾸자꾸 걷는 숱한 사람 수컷이 바보스러운 굴레를 벗어던지기를 바라는 이야기책이라고 여긴다면, 출판사에서는 책이름부터 얼른 바로잡아야 한다고 느낀다.
사람 수컷만 돌보지 않을 뿐, 맑은 목숨과 밝은 목숨과 사랑스러운 목숨을 사랑하던 삶을 찬찬히 적바림하는 《인간 수컷은 필요 없어》이기에, 이 책이름은 이 책을 가까이하려는 사람한테 너무도 높은 울타리를 세우고 만다(‘발칙한 도발’ 같은 책이름이 될 수 없다. 요네하라 마리 님은 ‘발칙한 도발’ 같은 이름을 붙이며 글을 쓰지 않았다). 집짐승 돌보기를 즐기는 사람한테뿐 아니라, 고운 목숨을 아낄 줄 아는 사람한테 예쁘게 다가설 이야기책이 되도록 하자면, 더 보드라이 마주하고 더 살가이 어깨동무할 수 있게끔, 책이름부터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지 싶다.
.. “잘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부러 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셨으니 좀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하타나카 씨가 지나칠 정도로 저자세로 나가자 남자는 그다지 싫지는 않은 얼굴이었다. “뭐든 물어 보시오.” “‘먹이’라는 통역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푸드’라고 하시오, 푸드.” “네, 알겠습니다.” 하타나카 씨를 따라서 통역사 여섯 명이 넙죽 인사를 하자 남자는 만족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 (132쪽)
“만족한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이는 ‘사람 수컷’이다. 통역 일을 하면서 만나야 하는 숱한 ‘사람 수컷’ 가운데 아름다운 이도 어김없이 있을 테지만, 아름답지 못할 뿐 아니라 바보스러워 슬픈 이가 훨씬 많으리라 본다. 짐승한테 ‘먹이’를 주지 ‘푸드’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렇지만 사람 수컷은 짐승한테 먹이 아닌 푸드를 주라고 이야기한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사람 수컷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나 ‘뉴라이트’를 이야기한다. 몇몇 정치꾼 사람 수컷뿐 아니라, 문화나 예술을 한다는 사람 수컷 또한 ‘라이팅’을 이야기하고 ‘북마케팅’이나 ‘북쇼’를 이야기한다. ‘버라이어티 쇼’란 무엇일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수컷은 무엇을 생각할까. 아니, 생각하는 머리가 있기는 있을까. ‘뉴타운’이 엉터리라고 여긴다면 ‘에코페미니즘’이건 ‘그린마켓’이건 집어치울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땅 사람 수컷은 그리 사랑스럽지 못하다. 그닥 맑지 못하다.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사람 수컷이 쓸모없는지 모를 노릇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이는 사람 수컷이요,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이 또한 사람 수컷이며, 전쟁무기를 만들고 전쟁무기를 좋아하는 이마저 사람 수컷이다. 전쟁을 기리는데다가 전쟁기념관이나 전쟁박물관까지 만드는 이는 바로 사람 수컷이다. 기리거나 섬겨야 할 것이 그렇게 없어서 전쟁을 기리거나 섬겨야 할까. 기리거나 섬겨야 한다면, 이토록 바보스러운 터전에서도 맑고 밝게 새로 태어나는 목숨들이다. ‘들꽃 기념관’이나 ‘아기 박물관’이나 ‘나무 기념관’이나 ‘흙 박물관’을 세울 줄 모르는 사람 수컷은 그야말로 부질없고 덧없으며 값없는지 모른다. (4344.6.26.해.ㅎㄲㅅㄱ)
― 인간 수컷은 필요 없어 (요네하라 마리 글,김윤수 옮김,마음산책 펴냄,2008.8.5./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