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조복성 님 책
나는 조복성 님 책을 2001년에 처음 만났다. 2001년 가을, 서울 명지대학교 옆 헌책방 〈문우당〉에서 《조복성곤충채집여행기》(고려대출판부,1975,비매품)를 처음으로 보았다. 이때 나는 출판사에서 국어사전을 기획하는 일을 했고, 함께 국어사전을 만들던 윤구병 님을 비롯해 여러 출판사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만 한 책을 하루 빨리 되살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모두들 내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이태가 지난 2003년 7월 9일, 서울 성신여대역 둘레 헌책방 〈이오서점〉에서 《곤충기》(을유문화사,1948)를 만났다. 이무렵 나는 하루에 두어 군데 헌책방을 찾아다니면서 책을 사서 읽었다. 하루에 두어 군데였기에 한 해라면 800 군데쯤 되는 헌책방을 다니는 셈이요, 이태 만에 조복성 님 다른 책을 만났으니까, 헌책방을 1600 군데쯤 다닌 끝에 비로소 다른 책 하나를 만났다 하겠다.
《조복성곤충채집여행기》에 이어 《곤충기》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아쉬울 대목이 없다고 느꼈다. 1948년에 나온 《곤충기》이지만, 2003년까지 나온 한국땅 곤충학자 곤충책하고 견주어 줄거리가 알차고 글투가 단출하면서 쉬웠다. 이무렵 더 알아보니 조복성 님은 1968년이던가, 아무튼 1960년대에 금성출판사였는지 민중서관이었는지, 어린이 과학백과 같은 묶음책 가운데 곤충 이야기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이 책은 여태껏 찾아내지 못했다. 어린이 과학백과 뒤쪽에 적힌 광고글에서만 이러한 책이 있는 줄 읽었을 뿐, 도무지 이 책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해 보면, 《조복성곤충채집여행기》나 《곤충기》라면, 어른들이 사서(또는 얻어서) 읽는 책이요, 어른들이 사서 읽는 책은 ‘전쟁이나 이사나 이민이나 무슨무슨 일 때문에 사라지는 일’이 있어도, 어른들 스스로 버리지 않는다. 여느 잡지책이나 소설책이라면 가볍게 버리기도 하지만, 인문책이나 전문학술책은 이 책을 갖춘 사람이 숨을 거두기까지 버려지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책을 갖춘 사람이 숨을 거둘 때에는 이 책들이 비로소 헌책방으로 나온다.
이와 달리, 어린이책은 아이들이 중학생이 될 때부터 함부로 버려진다. 우리네 1950년대 어린이책은 거의 찾을 길이 없다. 1960년대 위인전조차 대단히 드문 옛책이 된다. 1970년대 어린이책마저 아주 드물다. 이제는 1980년대 어린이책이 차츰 드문 책이 되려 한다.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어린이책을 사서 읽힌다지만, 쉽게 사서 읽히고 쉽게 버리고 만다.
조복성 님 책 두 가지를 찾은 기쁨을 누리면서, 자연책이나 생태책이나 환경책을 내는 출판사 사람들한테 책 실물을 보여주면서 되살리는 길을 여쭈었다. 책을 살핀 출판사 사장이나 편집자들은 하나같이 “조복성이라는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면서 이러한 책이 나오면 이 나라 학문과 출판에 크게 이바지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막상 책으로 되살리려고 애쓴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이러다가 어느 출판사 편집자가 책으로 낼 기획을 하겠다며 책을 빌려갔는데, 《조복성곤충채집여행기》를 그만 잃어버렸다. 아니, 잃어버렸다고 했다.
잃어버렸다고 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닭 목아지를 비튼다고 동이 틀 수 없듯, 잃어버렸다는 사람 손목아지를 비튼다고 책이 나올 수 없다. 다시금 여러 해 헌책방을 찾아다니면서 겨우 《조복성곤충채집여행기》 한 권을 새로 장만했다.
얼마 앞서 조복성 님 책 두 가지(《곤충기》와 《조복성곤충채집여행기》)를 한데 묶어 말끔하며 번듯한 책으로 되살려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뜨인돌’ 출판사에서 《조복성 곤충기》(황의웅 엮음,2011)라는 이름으로 펴냈다. 나 말고 조복성 님 책을 되살리려고 애쓴 분이 있는 줄 처음 알았고, 이분 또한 참 힘들게 ‘손사래질’을 겪으면서 힘들었구나 싶다. 그런데, 이분이 조복성 님 책을 헌책방에서 찾아다니는 이야기 가운데 어딘가 아리송한 대목이 있다.
.. 2004년 가을 고서적이 많기로 유명한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앞 헌책방 이오서점에도 그 책은 없었다. 먼지 쌓인 서고를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조복성 곤충기’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동아일보〉 2011.9.8.
나는 《곤충기》를 2003년 7월 9일에 찾았다. 2003년 7월 9일에 이 책을 찾은 이야기를 2003년 7월 24일에 갈무리해서 내 누리집에 글로 썼고, 이 이야기를 2003년 7월 29일에 〈오마이뉴스〉에 기사로 띄웠다. 이때에 〈오마이뉴스〉는 내가 쓴 글에 내가 붙인 이름(제목)을 엉뚱하게 고쳐서 몹시 짜증스러웠는데, 어찌 되었든, 이때에 올린 글이 퍽 알려지고 읽혀서 조복성 님 이름과 《곤충기》라는 책이 오랜만에 햇볕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 성신여대 옆 헌책방 〈이오서점〉은 내가 이 글을 쓴 지 이레 만에 문을 닫았다. 왜냐하면, 2003년 7월 20일 즈음(날짜가 언제였는지는 모른다)에 〈이오서점〉 사장님이 돌아가셨기 때문.
〈이오서점〉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서둘러 〈이오서점〉 사진을 뽑아서 찾아갔다. 헌책방지기가 흙으로 돌아간 헌책방은 더없이 쓸쓸했고, 이 책들을 건사할 마땅한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 2003년 7월 9일에는 책방 얼거리만 사진으로 담았고, 〈이오서점〉 사장님은 다음에 다시 찾아와서 사진으로 담기로 했다. 이리하여, 사장님 얼굴이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지 못했고, 애써 〈이오서점〉을 담은 사진조차 사장님은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동아일보〉에 난 기사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03년 7월 끝무렵에 문을 닫아 2003년 8월에는 책이 모두 빠졌는데, 2003년 가을조차 아닌 2004년 가을에 〈이오서점〉을 찾아갔다고 하니, 뭔가 잘못 안 셈 아닌지? 아니면, 내가 〈이오서점〉에서 《곤충기》를 찾아내어 〈오마이뉴스〉에 알린 글 이야기를 잘못 이야기하고 다닌 셈 아닌지? 또는, 〈동아일보〉 기자가 기사를 엉터리로 썼을까?
내가 〈오마이뉴스〉에 올린 글을 읽은 사람들한테서 《곤충기》를 ‘팔라’는 물음글을 참 많이 받았다. 그렇지만, 나는 ‘수집가’도 ‘장사꾼’도 아닌 ‘책마을 일꾼’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팔지 않았다. 또한, 내 책시렁에 이 책들을 ‘꽁꽁 감추지’도 않았다. 나는 이 책을 내가 2007년에 인천 배다리에서 연 개인도서관 책꽂이에 잘 보이도록 놓고는 누구한테나 보여주었으며, 두 손으로 책을 만지작거리면서 구경한 사람이 꽤 많다. 그런데, 《조복성 곤충기》라는 이름으로 새로 나온 책 ‘엮은이 말’에조차 좀 엉뚱하다 싶은 이야기까지 적혔다.
.. 을유문화사에서 1948년에 출간되었던 조복성 선생의 『곤충기』 원본을 처음 손에 쥐었을 때의 기쁨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1990년대 말, 나는 이 책의 존재를 뒤늦게 알고 고서점과 헌책방 등을 이 잡듯 뒤지고 다녔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서에 눈독 들인 도서관이나 전문 수집가들의 서고 속으로 숨어 버린 지 이미 오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별다른 기대 없이 들른 어느 고서점에서 『곤충기』와 만났다. 분명 우연이었지만 어릴 적부터 곤충을 유난히 좋아했을 뿐 아니라 몇 년 동안이나 이 책을 애타게 찾아 헤매던 나에게는 그야말로 운명처럼 느껴졌다. 금세라도 바스러질 듯한 누런 책장을 한장 한장 조심스레 넘기면서 그런 생각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이 책을 어두운 서재에서 밝은 세상으로 나오게 하자!’ .. (《조복성 곤충기》 엮은이 말)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책을 되살리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사람들 몫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책을 읽으면서 아름다운 넋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야 한다고 느낀다. 부디, 서로서로 아름다운 빛줄기를 일구면서 아름다운 꿈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책을 기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손길을 베풀면 그지없이 기쁘겠다. (4344.9.9.쇠.ㅎㄲㅅ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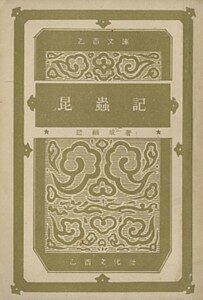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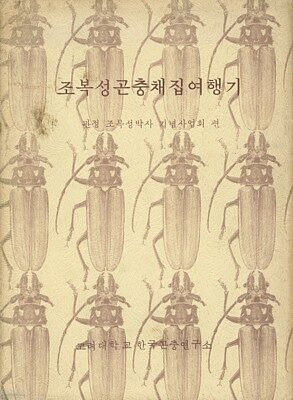
(곤충기는 여행기보다 책이 작다. 실물을 놓고 보면 이만 한 비율이 된다)

내가 2003년 7월 9일에 찾은 책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있던 책이었다.

내가 책을 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슬프게도 가게문을 닫고 말았다. 책이 다 빠진 뒤, 셔터에 쪽지만 덩그러니 붙었다. 2004년에는 이 책방이 남지도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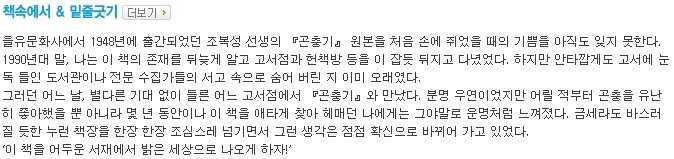
아름다운 책을 되살리면서 왜 이런 말을 썼을까? 부끄럽다고 느끼기를 바란다.

내 예전 싸이월드 누리집에 올린 <이오서점> 글 목록.

나는 2003년 7월 24일에 내 누리집에 첫 글을 띄웠고, 이 글을 띄운 날 저녁, 이오서점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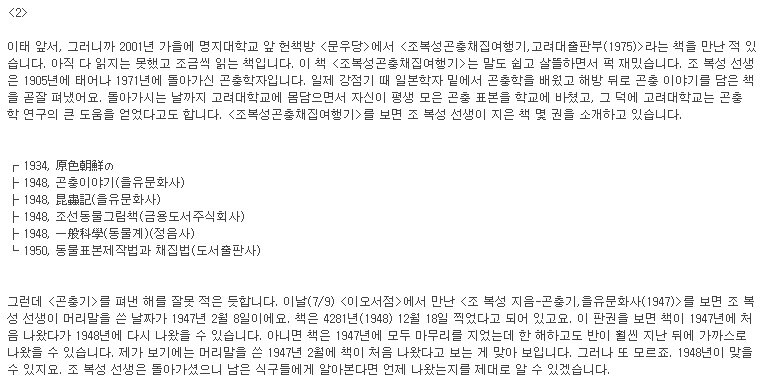
2003년 7월에 쓴 글 가운데.

오마이뉴스에 띄웠던 기사 한 토막. 오마이뉴스는 기사 제목을 저희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바꾸어 달기 때문에 몹시 짜증스럽다. '콕 찍어 이오'가 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