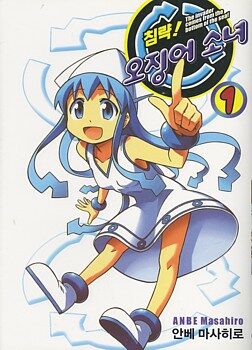-

-
침략! 오징어 소녀 1
안베 마사히로 지음 / 대원씨아이(만화) / 2010년 11월
평점 :

절판

우리 서로 재미나게 어울려요
[만화책 즐겨읽기 98] 안베 마사히로, 《침략 오징어소녀 (1)》
얼굴이 가려운 갓난쟁이 둘째는 깊은 밤마다 어김없이 칭얼거려 어머니가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밤에 어머니 잠 못 자게 하기로는 첫째나 둘째나 서로 매한가지입니다. 첫째가 세 살을 지나 네 살이 될 무렵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밤에 한숨 돌리며 잠을 자려나 싶더니, 둘째가 새삼스레 밤잠을 깨웁니다. 앞으로 이태쯤 밤잠은 없다 셈치고 살아야 할는지 모릅니다. 갓난쟁이가 밤에 잠을 못 이룬다면, 어머니가 좀 쉬도록 아버지가 아이를 토닥이거나 달래면서 한 시간 남짓 놀아야지 싶습니다.
낮에도 놀지만 밤에도 노는 아이를 무릎에 누이고 앉히고 세우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한 살 적 내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떠했을까. 형이 네 살이고 내가 한 살이던 내 어린 나날, 내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떠셨을까.
아이 하나와 함께 살면서 어버이 넋을 돌이킵니다. 아이 둘과 같이 지내면서 어머니 삶을 돌아봅니다.
내 어버이는 나와 형을 낳고 함께 살아오면서 사랑을 물려주었습니다. 우리 두 아이는 하루하루 무럭무럭 자라면서 앞으로 저희 삶을 일굴 테고, 저희끼리 좋은 짝을 만나 저희 아이를 낳으면, 나와 옆지기한테서 받을 사랑을 물려주겠지요. 어버이한테서 받은 사랑에 저희 깜냥껏 새로운 사랑을 실어 먼먼 앞날 새 아이들한테 꿈과 빛을 베풀겠지요.
- “여기도 쓰레기, 저기도 쓰레기. 바다 밑바닥이 온통 쓰레기장. 이 모든 것은 지상에서 흘러들어 온 것. 인류의 산물. 그리고, 버린 것 또한 인류. 괘씸한 인류! 내가 그 썩은 지상을 침략해 주겠다징어!” (1쪽)
- “근데 우리 집엔 왜?” “여길 거점으로 인류 침략 계획을 추진할 거다징어.” “인류 침략을 왜 하려는 건데?” “인간들은 여태껏 바다가 베풀어 준 은혜도 모르고 사리사욕을 위해 공공연하게 바다를 더럽혀 왔다. 우리 바다의 생물들에게 인류 따윈 백해무익! 그래서 내가 인류를 응징할 것이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8∼9쪽)
사랑으로 살아갈 적에는 사랑을 일구고 사랑을 빚으며 사랑을 나눕니다. 미움으로 살아갈 때에는 미움을 일구고 미움을 빚으며 미움을 퍼뜨립니다.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사랑스럽습니다. 미움을 퍼뜨리는 사람은 밉살맞습니다. 사랑스럽기에 포근합니다. 밉살맞기에 쌀쌀맞습니다.
나는 언제라도 사랑스러운 손길로 포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언제라도 밉살맞은 눈길로 쌀쌀맞을 수 있어요.
꿈꾸는 길에 걸맞게 사랑스럽습니다. 꿈을 잃거나 버리거나 잊는 결대로 밉살맞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어린이로 놀며 푸름이로 꿈꾸다가는 젊은이로 일을 하고 늙은이로 슬기를 남기는 흐름이란, 온통 사랑이로구나 싶습니다. 사람마다 품에 안는 맑은 목숨이란 고운 빛줄기입니다. 목숨줄기는 빛입니다. 빛이 솟는 샘터입니다.
- “뭐, 우리도 못마땅하긴 해. 가끔 캔이나 병을 밟고 크게 다치는 어린애도 있고 하니. 구석구석 쓰레기통도 설치해 뒀는데.” “인간들은 동족의 위험도 아랑곳않고 바다를 더럽히는 비열한 생물이구나징어.” … “도와주는거냐징어?” “어?” ‘모, 모르겠다징어. 치울 마음이 있으면서 왜 다들 바다를 더럽히는 거냐징어?’ (35, 37쪽)
- “이건 뭐냐징어?” “보면 몰라? 이 뜰채가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금붕어를 건지는 놀이야.” “즉, 금붕어의 갱명을 갖고 노는 거구나징어.” (156쪽)
품에 안아 놀고, 드러누워 배에 엎드리게 하고는 놉니다. 한참 어르다가는 바닥에 살며시 놓습니다. 올 오월에 태어났으니까 십이월이면 이제 바깥누리에서 일곱 달째 살아가는 셈인가요. 갓난쟁이 둘째는 깊은 밤 방바닥 이곳저곳을 마음껏 기며 스스로 놉니다. 한손으로 방바닥을 탕탕 두들깁니다. 일하면서 한쪽 벽에 세운 그림책을 쓰러뜨리고는 또 손으로 통통 칩니다. 내 왼무릎에서 기던 아이가 어느새 한 바퀴 돌아 내 오른무릎으로 옵니다. 첫째는 얼마 안 기고 바로 서려 하며 걸었고, 둘째는 눕히기를 그닥 안 좋아하면서 좀처럼 잘 앉거나 서지 못하지만, 기기는 제법 잘 깁니다. 이 아이도 머잖아 제 두 다리에 힘을 발끈 주고는 뽈딱 하고 서겠지요. 제 누나를 따라 이리 달리고 저리 넘어지면서 마당과 들판과 멧길을 누비겠지요.
비록 깊은 밤에 잠들지 못하지만, 앞으로 깊은 밤에 얼마쯤 잠을 못 이루겠느냐고 생각을 다스립니다. 하루하루 치자면 짧지 않지만, 아이가 자라날 기나긴 나날을 돌아보면 나한테는 더없이 애틋할 한 해요 두 해이며 세 해입니다.
이제 아이를 안고 방바닥에 벌렁 드러눕습니다. 무릎을 세워 아이를 올립니다. 아이는 입을 쩍 벌리며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어제는 이 놀이를 못 해 주었네. 미안해, 그런데 꼭 이 밤에 이 놀이를 해야겠니.
아무쪼록 잘 놀아 주렴. 아무쪼록 어머니가 다문 한 시간이라도 새근새근 잠들게 도와주렴. 아무쪼록 밤에 깨어나 이렇게 논 만큼 아침과 낮에 달게 잠들어 주렴. 그때에 아버지도 낮잠을 자게 말야.
- “그럼 나도 오늘 생일이다징어!” “뭐?” “나도 축하해 줘라징어!” “넌 지금 정한 거잖아. 까불고 있어.” “그럼 뭐 어떠냐징어! 나도 저거 하고 싶다징어!” (130쪽)
안베 마사히로 님 만화책 《침략 오징어소녀》(대원씨아이,2010) 1권을 봅니다. 아이들이랑 하루 내내 복닥이면서 지친 몸을 살짝 누이며 눈을 감다가는 잠이 들락 말락 할 때에 슬그머니 펼칩니다. 고단해서 졸리고, 막상 드러누우니 잠은 안 오고 하기에 펼칩니다. 바다에서 살다가 뭍으로 나온 오징어소녀는 여느 사람하고 엇비슷하게 굽니다. 말투며 하는 짓이며 오징어답다 할는지 모르나, 오징어소녀는 사람들 사이에 섞이면서 지구별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꿈을 꾸고 무슨 일놀이를 누리는가를 찬찬히 바라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홀가분하게 즐길 만한 만화라 할 수 있는 《침략 오징어소녀》라 할 테지만, 곰곰이 ‘생각에 잠기며’ 남달리 즐기면서 재미있는 만화라 할 수 있는 《침략 오징어소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재미나고, 이러한 줄거리를 선보이는 사람이 재미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재미나며, 이러한 꿈을 나누는 사람이 재미납니다.
내 한삶을 즐기고, 내 살붙이들 한삶을 함께 즐기며, 내 이웃들 한삶을 따숩게 즐깁니다. 내 오늘을 사랑하고, 내 살붙이들 오늘을 사랑하며, 내 이웃들 오늘을 사랑해요.
- ‘남은 매수 1장? 게다가 배터리까지 위험하다징어! 지, 진정하자징어. 지금까지 찍은 사진을 지우면 된다징어! 내가 사랑을 담아 찍은 바다 사진, 단 1장도 지울 수가 없다징어!’ (150∼151쪽)
우리 서로 재미나게 어울려요. 우리 다 함께 기쁘게 손잡아요. 우리 모두 예쁘게 꿈을 꾸어요.
나는 내 어버이 품에서 예쁘게 꿈을 꾸었어요. 내 옆지기는 내 옆지기 어버이 품에서 기쁘게 꿈을 꾸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나와 옆지기 품에서 착하게 꿈을 꾸겠지요.
좋은 삶을 맞이하면서 좋은 사랑을 꽃피운다면 좋은 넋을 시나브로 북돋우리라 믿습니다. (4344.12.16.쇠.ㅎㄲㅅㄱ)
― 침략 오징어소녀 1 (안베 마사히로 글·그림,김혜성 옮김,대원씨아이 펴냄,2010.12.10./4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