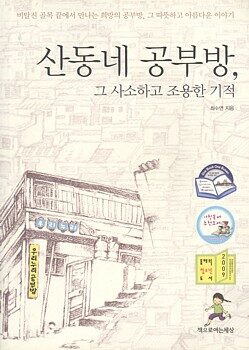-

-
산동네 공부방, 그 사소하고 조용한 기적
최수연 지음 / 책으로여는세상 / 2009년 2월
평점 :

품절

아이들은 오직 삶을 배웁니다
[책읽기 삶읽기 106] 최수연, 《산동네 공부방》(책으로여는세상,2009)
아이들은 오직 삶을 배웁니다. 아이들 누구나 삶 아닌 다른 무엇을 배우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삶을 가르칩니다. 어른들 누구나 삶 아닌 다른 무엇을 가르치지 못합니다.
슬기롭게 살아가는 어버이는 슬기롭게 일구는 삶을 물려줍니다. 돈에 얽매인 어버이는 아이들 또한 돈에 얽매인 채 살아가도록 이끕니다.
도시에 있는 학교는 아이들이 도시에 남아 도시 회사원이나 노동자가 되도록 가르칩니다. 시골에 있는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빨리 시골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어 도시 회사원이나 노동자가 되도록 가르칩니다. 곧, 도시나 시골이나 똑같이, 도시에서 회사원이나 노동자 되어 ‘월급을 받을 때’가 되어야 ‘축하할’ 일이 됩니다. 커다란 도시에 있는 이름난 회사나 공공기관에 일자리 얻어 들어가면 도시에서든 시골에서든 학교 앞문에 걸개천이 걸립니다. 학교에서는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조그마한 시골에서 흙을 일구며 살아가거나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아이가 되면,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 공부방을 하든 탁아방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 동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동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산꼭대기에 앉아 잠시 쉬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동네가 한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참으로 삭막해 보였다. ‘산’동네인데도 정작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작은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았다 … 아이들은 신문에 실릴 만한 내용을 직접 정하고, 취재 일정과 편집 계획까지 스스로 세웠다. 그리고 학교 수업이 끝난 뒤 공부방에서 빌려준 카메라를 메고 그달의 기삿거리를 찾아 파출소며 동사무소, 소방소, 각종 종교단체까지 찾아가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했다. 아이들은 마치 진짜 신문기자가 된 듯 진지하게 취재를 했고, 그 과정을 너무나 재미있어 했다. 취재를 끝낸 뒤 아이들은 기사를 쓰고, 기사에 어울리는 그림까지 그려 넣는 등 자신들이 갖고 있는 온갖 기량을 모아 신문을 만들어 갔다 .. (32, 36, 138∼139쪽)
오늘날 학교에서는 꿈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럴밖에 없는 까닭이, 오늘날 학교에서 교사를 맡는 이들 또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지식만 배우거나 쌓았어요. 교사들 또한 교사가 되기까지 ‘꿈을 키우는 삶’이 아니라 ‘교사가 되어 월급을 받는 일자리를 얻’도록 땀을 흘렸어요.
교사가 하는 일이란 ‘교과서 진도를 나가’거나 ‘대입시험 문제를 잘 맞히도록 하나하나 뽑아내는’ 일이에요. 교사는 아이들 앞에서 ‘꿈을 꾸는 삶’을 몸소 보여줄 수 없는 얼거리예요. 교사 스스로 꿈을 안 품기도 하지만, 꿈을 품은 교사조차 아이들 앞에서 섣불리 꿈을 보여주지 못해요.
아이들은 유아원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거치면서 ‘꿈을 잃는 길’을 걸어요. 유아원도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더 빨리 영어를 가르치고 더 많이 지식을 쌓도록 애쓸 뿐, 정작 아이들이 온삶을 누리며 꿈을 이루도록 하려는 데에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아이들한테 ‘자연 그림책’이나 ‘세밀화 그림책’을 손에 쥐어 주거나 읽히지만, 막상 아이들이 누릴 숲이 어린이집 언저리에 없어요.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지만, 참말 여느 살림집 둘레에 아이와 어른이 다 함께 뒹굴 숲이 없어요.
숲에서 나무를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그늘을 느끼고 잎과 꽃과 열매를 보지 않고서, 나무도감만 들여다보면 무얼 하나요. 나무도감이나 꽃도감이나 나비도감을 보면서 나무랑 꽃이랑 나비 이름은 훤히 꿰뚫는다지만, 아이를 둘러싼 마을이나 학교 어디에도 동백나무이든 배나무이든 복숭아나무이든 이팝나무이든 느티나무이든 없는걸요.
어린이는 뽀로로 만화를 볼밖에 없어요. 푸름이는 연예인과 가수 얼굴을 볼밖에 없어요. 어른은 연속극과 영화에 나오는 배우를 볼밖에 없어요. 꿈을 보지 않는 어른이기에 꿈을 느끼지 못하고, 꿈과 동떨어진 채 살아가는 어른이기에, 아이들이 꿈을 껴안으며 살아가도록 돕지 못해요.
.. “너, 이놈의 자식, 뭐하는 짓이야!” 그래도 순길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소리를 지르던 순길이 아버지는 내가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몽둥이를 휘두르며 순길이를 때리려고 했다. 그때 순길이가 한마디 했다. “아빠, 엄마랑 계속 싸우면 나는 이렇게 될 겁니더!” … “오늘은 행길이 어머니와 영생이 어머니, 죽기 어머니는 글자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글자부터 써 볼까요? 글을 몰라 그동안 답답했지요? 영생이 어머니부터 말씀해 보세요.” “내 이름 석 자 써 보는 기 소원이라요.” “맞아요, 이름 석 자라도 쓰모 원이 없겄어요.” … “큰이모, 파 없어요? 풋고추는요? 달걀은요?” 그럴 때마다 나는 구박 아닌 구박을 했다. “그냥 먹어!” “이왕 먹는 건데 잘해 먹어야지요. 아∼아, 내가 할 테니까 큰이모는 걱정 마쇼.” 말도 늘 짧았다. 그래서 공부방 선배들한테서 잔소리를 많이 듣기도 했다. “니는 할매 나이가 몇 갠데 반말 찍찍 하고 있노?” “아 행님, 정답고 좋잖아예!” .. (103, 165, 243∼244쪽)
최수연 님이 빚은 《산동네 공부방》(책으로여는세상,2009)을 읽습니다. 최수연 님은 부산 달동네에서 공부방 교사로 일합니다. 즐겁게 일하고, 씩씩하게 일하며, 사랑스레 일합니다. 다만, 최수연 님이라고 뾰족하게 수가 나지는 않습니다.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도시에서 이런저런 일자리를 얻기까지 공부방지기나 마을지기 구실을 하며 곁에서 어깨를 토닥일 수 있을 뿐입니다. 달동네에서 시원스러운 작은 샘터지기 노릇을 할 수 있으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톱니바퀴에 맞물리듯 머리와 마음이 굳어지도록 흐르는 일을 막거나 거스르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달동네 공부방은 도시에 있는 조그마한 숲일 테지요. 모두들 악다구니를 쓰고 쳇바퀴에 톱니바퀴에 올가미에 허덕이지만, 이 슬프고 고단한 삶에 새힘을 북돋우는 맑은 샘물 한 그릇 떠서 내미는 조그마한 숲일 테지요.
사람은 지나치게 많고, 샘가는 아주 조그맣습니다. 시멘트와 아스팔트는 끝없이 넓으며, 샘터는 아주 조그맣습니다. 밥 한 그릇과 물 한 사발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밥 한 숟가락과 국 한 숟가락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밥 한 그릇을 마련해서 나누려 하기에, 이 밥 한 그릇이 백 그릇으로 가지를 뻗고 만 그릇으로 뿌리를 내리리라 믿어요. 물 한 사발 길어올려 나누려 하기에, 이 물 한 사발이 백 사발로 늘어나고 만 사발로 샘솟으리라 믿어요.
아이들은 오직 삶을 배웁니다. 삶을 배우는 아이들 앞에서 삶을 보여주고 삶을 누리며 삶을 사랑하는 하루를 빛낸다면, 조그마한 숲은 커다란 도시를 살찌울 수 있어요. 삶을 아끼고 삶을 노래하며 삶을 좋아하는 손길과 마음결과 꿈씨가 얼크러지면서, 조그마한 숲살림이 커다란 나라살림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회사원과 공무원만 기르는 모든 학교가 문을 닫기를 빌어요. 사람을 가르치고 사랑을 노래하는 조그마한 숲이 차츰 늘어나기를 빌어요. 전쟁과 경쟁으로 치닫는 모든 학교가 사라지기를 빌어요. 사람을 배우고 사랑을 주고받는 조그마한 숲이 활짝 피어날 수 있기를 빌어요. (4345.9.13.나무.ㅎㄲㅅㄱ)
― 산동네 공부방, 그 사소하고 조용한 기적 (최수연 글,책으로여는세상 펴냄,2009.2.23./1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