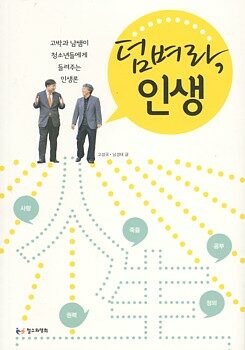-

-
덤벼라, 인생 ㅣ 고박과 남쌤이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인생론 1
고성국.남경태 지음 / 철수와영희 / 2012년 2월
평점 :



푸른 아이들은 푸르게 사랑해야지
[책읽기 삶읽기 98] 고성국·남경태, 《덤벼라, 인생》(철수와영희,2012)
이 나라 아이들 푸른 마음을 새까맣거나 잿빛으로 바꾸는 굴레는 대학입시라고 느낍니다. 대학입시 때문에 아이들 푸른 마음은 멍들거나 흐리멍덩해진다고 느껴요.
대학입시는 대학교에 붙으려는 시험만이 아닙니다. 대학입시는 바로 고등학교 교육 얼거리요 중학교 교육 얼거리인데다가 초등학교 교육 얼거리예요. 더 살피면, 유치원과 어린이집부터 대학입시 굴레입니다. 이 나라에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교육과 문화와 복지와 육아라는 허울을 뒤집어쓴 대학입시 때문에 꽁꽁 얽매이거나 갇혀요.
아이들은 아름다운 나날을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사랑스러운 나날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학입시 아닌 참다운 공부를 해야 하고, 대학입시 아닌 착한 삶을 배워야 해요.
아이들은 어머니가 차리는 밥을 먹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밥을 차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먹는 밥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구어 거두는가를 스스로 겪으면서 알아야 합니다.
옳게 배우지 않으니 옳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옳게 부대끼지 않으니 옳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철학을 익히거나 역사를 다룬대서 사회를 올바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책을 많이 읽는대서 사람과 삶과 사랑을 곱게 헤아리지 않아요.
.. 아는 만큼 안 사랑할 수도 있을 거 같아 … ‘성찰’하라는 말이 감정을 버리라는 말은 아니지. 인간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충실해야 해. 사랑도 나름의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느낌을 존중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 정말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회는 잘못될 수가 없어 .. (26, 39, 55쪽)
푸른 아이들은 푸르게 사랑하며 살아야 아름답습니다. 푸른 아이들과 살아가는 어른들은 푸른 아이들한테 걸맞다 싶도록 푸른 어른답게 사랑하며 살아야 아름답습니다.
푸른 어른들이 낳는 푸른 아이들이에요. 맑은 어른들과 살아갈 맑은 아이들이에요. 고운 어른들이랑 어우러질 고운 아이들입니다.
착하지 않은 어른들 매무새는 착하지 못한 푸름이들 매무새로 이어집니다. 곱지 않은 어른들 말투는 곱지 못한 아이들 말투로 이어져요.
다소곳하며 상냥한 어른들 몸가짐이기에 다소곳하며 상냥한 아이들 몸가짐이에요. 넓으며 포근한 어른들 마음씨인 터라 넓으며 포근한 아이들 마음씨예요.
.. 한순간 배설하듯이 풀고 가다 보면 스트레스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문제는 계속 남아 있잖아. 오히려 깊어지지. 그러다 어느 순간 파국이 오는 수가 있다고 … 그 사람의 삶을 돈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가진 걸 베푸는 게 좋거든 .. (36, 81쪽)
고성국 님과 남경태 님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그러모은 《덤벼라, 인생》(철수와영희,2012)을 읽으며 생각합니다. 아저씨 두 분이 주고받은 이야기처럼, 아줌마 두 분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책으로 그러모으면 참 재미있으리라 생각해요. 학문을 하고 책을 쓰는 아저씨들 이야기도 여러모로 푸름이한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학문하고도 책하고도 동떨어진 채, 날마다 밥하고 빨래하며 집살림 도맡는 아줌마 두 사람이 삶과 사랑과 사람을 돌아보는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삶꽃 사랑꽃 사람꽃을 북돋운다면 얼마나 어여쁠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아마, 아줌마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책으로 엮는다 할 때에는 “덤벼라, 인생”이 아닌 “좋아라, 내 삶” 하는 실타래를 솔솔 풀지 않으랴 싶어요.
참말 좋으니까 살아가는 나날이거든요. 참으로 좋아서 예쁘게 누리는 하루예요.
.. ‘여성성’이야말로 미래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해. 무엇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말이야 … 힘의 지배가 실행되면서 남성이 여성을, 같은 남성끼리도 강한 남성이 약한 남성을 지배하게 되잖아 … 죽음이 너무 멀리 있으면 삶을 성찰하는 게 어려워 … 죽음을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 (47, 103쪽)
만화책 《아따맘마》를 읽으며 생각했어요. 《아따맘마》에 나오는 아줌마는 학교를 오래 다니지 않았고, 책을 딱히 읽지 않으며, 날마다 집에서 살림하는 데에 온 품과 땀과 마음을 쏟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아줌마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하루하루 새롭게 태어나는 이야기밭이에요. 언제나 남다른 이야기누리예요. 한결같에 빛나는 이야기꾸러미예요.
아저씨들은 으레 ‘집안일 나눠 맡기’나 ‘아이 함께 돌보기’를 이야기합니다만, 아저씨 스스로 집안일을 도맡아 본다든지 아이를 홀로 돌보아 본다든지 하지는 않아요. 어쩌다 한 차례쯤 집안일을 하루 내내 하거나 어쩌다 하루쯤 아이를 홀로 돌볼 뿐이에요.
우리 푸름이들한테는 어떤 이야기꽃이 예쁠까 헤아려 봅니다. 우리 푸름이들한테는 어떤 이야기열매가 맛날까 헤아려 봅니다. 우리 푸름이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밥이 구수할까 헤아려 봅니다.
.. 특정 시기에 좋은 성적을 거두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 봐야 하거든 … 대학입시와 군대가 한창 나이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없게 하는 건 사실이야 …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부모에게서 독립해 진정한 개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해 여전히 정신적·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예속된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 자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고 스스로 설 기회가 없는 거지 .. (107, 131, 233쪽)
아무쪼록 푸름이를 곱게 사랑하는 어른들이면 좋겠습니다. 푸름이한테 이름값이나 졸업장이나 자격증이나 학문이나 철학을 바라기 앞서, 푸름이 누구나 고우며 맑게 사랑하는 길을 아끼는 어른들이면 고맙겠습니다.
푸름이들이 굳이 대학교에 안 가도 즐거이 살아가는 길을 밝히는 어른들이면 기쁘겠습니다. 푸름이들이 대학교뿐 아니라 중·고등학교나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조차 안 다녀도 아리땁게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어른들이면 반갑겠습니다. (4345.2.7.불.ㅎㄲㅅㄱ)
― 덤벼라, 인생 (고성국·남경태 글,철수와영희 펴냄,2012.2.10./1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