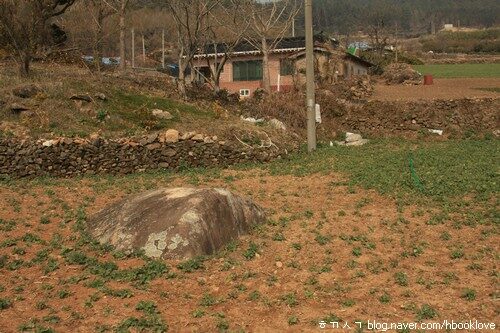자전거쪽지 2013.3.4.
: 걸어야 비로소 아는 길
- 몇 해 앞서부터 걷기가 널리 퍼진다. 마치 ‘유행’이라 할 만하다. 왜 걷기가 바람 불듯 널리 퍼질까. 걷기란 더없이 마땅한 삶인데, 왜 걷기 바람이 불면서 이 길 저 길 새 이름이 붙을까. 나는 모른다. 사람들이 얼마나 안 걷는지, 참말 나는 모른다. 왜냐하면, 남들이야 안 걷든 걷든, 나는 우리 아이들하고 늘 걸으며 살아가니까. 나는 내 삶을 누릴 사람이지, 남들 삶을 기웃거릴 겨를은 없으니까. 이웃에서는 우리 아이들 아주 어릴 적에 업거나 안고 다니지 말라 했다. 아이들 아기수레에 태워 끌라 하면서, 유모차 선물해 주겠다던 사람 꽤 많았다. 그러나 우리는 아기수레 안 받았다. 왜냐하면, 아기는 업히거나 안기며 다녀야 마땅하다. 아기들은 제 어버이 품에서 따스한 사랑 받으면서 자라고, 이렇게 자라다가 스스로 두 다리를 땅에 디디고 걸을 수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면 되고, 조금 안으면 된다. 큰아이 작은아이 모두 돌을 지나고부터 천천히 걸었고, 이제 모두 나비처럼 훨훨 날듯 달리기 잘 한다. 그리고, 여섯 살 큰아이 세 살 작은아이 되어도 곧잘 안긴다. 안기기 좋아하고 걷기 좋아하며 달리기 좋아한다. 아이들은 이렇게 커야 즐겁고 아름다이 살아갈 수 있다고 느낀다. 곧, 어른도 누구나 두 다리를 땅에 대고 걸을 때에 삶이 빛난다고 느낀다. 때때로 자전거를 몰 수 있지. 때로는 자동차를 얻어 탈 수 있지. 그러나, 으레 타는 자동차여서는 아니라고 느낀다. 으레 자동차를 몰며 어디를 다닐 때에는 삶이 아니라고 느낀다. 삶은 삶이니까. 자동차를 타 보아라. 겨울이 겨울다운 줄 느끼는가. 자동차에서 봄을 봄인 줄 느끼는가. 자동차를 몰면 여름과 가을이 맛 다르고 냄새 다르며 빛깔 다른 줄 못 느낀다. 자동차에서 내려야, 자동차를 버리고 걸어야 비로소 날씨와 철을 느낀다.
- 두 아이를 자전거수레에 태운다. 오늘은 제법 멀리 마실 가기로 생각한다. 작은아이는 수레에 앉자마자 곧 잠든다. 많이 졸렸구나. 새근새근 자는 작은아이 곁에서 큰아이가 노래를 부른다. 아버지 힘 내라는 노래로구나. 아버지는 동백마을 지나 봉서마을에서 느티나무 곁을 스쳐 신촌마을 고갯길을 달린다. 고갯길 달리다가 더는 발판을 못 밟겠다 싶어 자전거에서 내린다. 가파른 고갯길을 낑낑거리며 자전거를 끈다. 우와, 되게 가파르구나. 혼자 오면 이 고갯길 자전거로 넘을 만할까. 큰아이가 묻는다. “아버지 힘들어요? 아버지 왜 힘들어요?” 쳇, 네가 자전거를 몰아 보렴. 쳇, 네가 스스로 이 고갯길을 걸어 보렴. 아버지는 너희랑 자전거를 끌고 이 고갯길을 오르잖니.
- 드디어 고갯마루에 오른다. 뒤를 돌아본다. 우리 동백마을 멀리 보인다. 참 예쁘구나. 고갯마루에 오르니 시원스레 부는 바람 맛나구나. 이제 자전거에 오른다. 청룡마을에 닿는다. 청룡마을은 군내버스 들어오는 막바지 자리이다. 군내버스가 이리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는 빙 돌아 나갈 테지. 멧기슭 언저리에 곱다시 앉은 청룡마을은 햇살 포근하게 들어오며 밝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숲과 들과 나무와 풀과 나비와 새와 벌레와 개구리와 멧짐승과 뛰놀며 놀았겠지. 이제 시골마을에는 할매 할배만 남고 아이와 젊은이와 푸름이 모두 도시로 나간다. 이제 시골마을은 어디나 한갓지고 조용하다. 할매와 할배만 남는 시골은 어르신들 힘이 모자라 두레나 울력 하기는 힘들고, 경운기 돌려 농약 뿌려야 이럭저럭 푸성귀 거둘 만하다. 사람들 먹는 모든 풀에 농약 기운 스밀밖에 없다. 사람들 모두 시골 떠나 도시에서 살아가며 돈으로 푸성귀를 사다 먹으니, 시골 할매와 할배는 농약에 기대어 푸성귀 내다 팔밖에 없다.
- 미후마을 지나고 장촌마을 지난다. 도화면에도 신촌마을 있고, 포두면에도 신촌마을 있다. 그냥 ‘새마을’이란 뜻이겠지. ‘샛골’이었을 수 있고. 샛골이란 사잇골짜기일 수 있고, 새로운 고을일 수 있다.
- 마을길 벗어나 큰길로 접어들지만, 고흥 큰길에는 자동차 뜸하다. 이렇게 좋은 길은 자동차로 달리기보다 자전거로 달려야 제맛이요, 자전거 또한 내려놓고 두 다리로 걸어야 제맛이다. 참말, 옛날 사람들은 십 리이건 이십 리이건 걸어서 다녔다. 걸어서 다닌 흙길이요, 걸어서 다니기에 마을길이고, 걸어서 다니기에 아름다운 삶길이었으라 생각한다. 걸으며 멧새 노래를 듣는다. 걸으며 상큼한 바람을 마신다. 걸으며 숲자락 푸른 빛깔 바라본다. 걸으며 구름빛 느끼고 햇살 포근한 숨결 들이켠다.
- 외초마을 지나며 저 멀리 해창벌을 본다. 해창벌이 들판 아닌 갯벌이던 모습을 나는 모른다. 나는 해창이 들판이 된 뒤에 고흥으로 들어와서 살아가니까. 저 해창이 갯벌이면서 바닷물 찰랑거리는 모습을 가만히 그려 본다. 해창 바닷가라면, 해창 갯벌이라면, 이곳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데였을까. 지구별에 이토록 아름다운 갯벌 있는 나라는 얼마나 있을까. 한국사람은 땅을 아쉽게 여기며 갯벌을 메꾸어 논으로 바꾸었지만, 조금 더 슬기롭게 살폈으면, 갯벌이 있기에 들과 숲이 더 푸르게 숨을 쉬고, 사람들 마음도 더 환하게 트일 수 있는 줄 깨달았으리라. 애써 메꾼 갯벌에 다시 바닷물 들여 갯벌로 돌아가도록 하는 독일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나라 한국 공무원과 정치꾼이 ‘갯벌 망가뜨려 만든 논’이 얼마나 바보짓이었는가를 알아차리기를 빈다. 참말 그렇잖은가. 한국에서 쌀이 남아돌지 않으나, 정치꾼은 쌀 남아돈다는 이야기 퍼뜨리면서 논에 나락 심지 말라고 한다. 직불제이니 보전금이니 하면서 논농사 짓지 말란다. 그런데 갯벌은 왜 메꾸었는가. 갯벌이 갯벌 그대로 있으면 바지락이든 꼬막이든 낙지이든 게이든 얼마나 많이 나왔겠는가. 그뿐인가. 이 갯벌을 보러 나라밖에서도 찾아오는데, 시골을 시골답게 그대로 두었으면, 고흥이라는 데는 얼마나 손꼽히는 아름다운 터전이 되었겠는가. 아이들하고 못물 청둥오리떼 바라보면서 한참 생각에 잠긴다.
- 다시 자전거를 달린다. 이제 봉암마을에 닿는다. 봉암마을에서 살짝 숨을 돌린다. 등판은 온통 땀이다. 웃옷 한 벌 벗고 반소매 차림으로 달렸는데에도 땀투성이가 된다. 사십 분 남짓 쉬는데에도 땀은 마르지 않는다. 자전거수레에 오래 앉았던 아이들은 콩콩 뛰면서 다리를 푼다. 아이들은 걸음걸이마다 날갯짓 같다. 너희는 어디에서 와서 이렇게 예쁘게 노니? 그래, 너희 아버지도 어릴 적에는 너희와 똑같은 어여쁜 하늘사람이었지. 이제 어른 되어 너희들 자전거수레에 태워 마실을 다니지만, 아마 아직 내 가슴에는 하늘사람 자취가 있으리라 생각해. 나도 하늘사람이니 너희 하늘사람을 자전거수레에 태우고 이 시골길 달리며 웃을 수 있겠지.
- 집에서 나서며 봉암마을까지 오는 동안 맞바람이더니, 봉암마을에서 다시 동백마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맞바람이다. 드세게 몰아치는 바람을 맞으며 낑낑거리며 쳇쳇 하고 왼다. 바람아, 너 왜 이러니. 오는 길이든 가는 길이든, 한쪽은 등바람 불어 주어야 하지 않니.
- 다시 장촌마을에 닿을 무렵 자전거를 세운다. 큰아이가 자꾸 “아버지는 걷고, 나는 달리고 싶어.” 하고 말한다. 아이는 이제 자전거수레에 앉아 함께 달리기보다, 아이 스스로 달리고 싶단다. 그래, 너희도 두 다리를 써야지. 쉬자. 시골이라지만, 빈 들판이 없다. 참말 빈 들판 없이 모두 논이고 밭이다. 아무 땅에나 함부로 들어가서 앉거나 뒹굴 수 없다. 이 나라 한국에는 도시에도 나무와 풀이 있는 공원이 거의 없지만, 시골에도 나무와 풀 즐기는 한갓진 공원이 없다. 도시에도 숲이 없고 시골에도 숲이 없달까. 멧자락 높이높이 나무 밀어 계단밭을 만들고야 만다.
- 십오 분 남짓 쉬다가 일어선다. 바람이 자꾸 드세게 불어 안 되겠다. 아이들을 수레에 앉히고 자전거를 달린다. 맞바람을 맞으며 달린다. 청룡마을 어귀에 닿고, 오르막을 오르다가 자전거에서 내린다. 길가에 스스로 뿌리내리는 유채풀 몇 포기 뜯는다. 맛나게 먹는다. 목마름이 가신다. 좋다. 들풀 먹으며 자전거 달리니 좋다.
- 고갯마루에 닿는다. 숨을 고른다. 곰곰이 생각해 본다. 사람들이 참말 스스로 잘 안 걷기에 걷기마실이 유행이 되는구나 싶다. 유행이라도 되어 걸어야 할 만큼, 이제 도시사람도 시골사람도 안 걷는다. 모두들 자가용을 몰거나 경운기를 몬다. 기름 먹는 기계를 몰며, 다리를 안 쓴다. 요즈음 사람들 가운데 십 분이나 이십 분쯤 걸어서 다니는 사람 드물다. 한 시간이나 두 시간쯤 걸어서 다니는 사람 만나기 어렵다. 사람들 스스로 들바람을 느끼지 않으니, 누군가 들바람을 이야기하더라도 못 알아듣는다. 사람들 스스로 꽃내음을 느끼지 않으니, 누군가 꽃내음을 속삭이더라도 못 알아챈다. 사진기 들이밀어 이쁘장하게 꽃 사진 찍을 줄은 알아도, 눈으로 바라보고 코로 맡으며 혀로 느끼는 들꽃과 들풀을 모르고야 만다. 걸어야 아는 길일 텐데, 걷지 않으니 길을 모른다. 걸으며 다리를 살리고 살찌울 텐데, 걷지 않으니 다리를 살리지 못하고 살찌우지 못한다.
- 아이들이 자전거수레에서 다시 노래를 부른다. 그래, 너희 노랫소리 참 듣기 좋아. 노래란 참 재미있고 신나는구나. 아버지도 노래를 부를게. 아버지도 자전거 몰며 노래를 부르마. 우리 이 길을 함께 누리면서 노래로 마을과 보금자리를 한껏 북돋우자.
(최종규 . 2013 - 시골에서 자전거와 함께 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