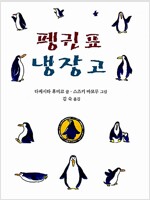숲노래 책읽기 / 가난한 책읽기
싱싱칸
2012년에 싱싱칸(냉장고)을 처음 들였다. 싱싱칸 없이 살아가려고 하다가 장만했다. 어떻게 싱싱칸 없이 살아가느냐고 묻던 이웃한테 “저희는 빨래틀(세탁기)도 쇠(자동차)도 들이지 않는걸요?” 하고 되물었다. 작은아이가 두돌을 지날 즈음 언니한테서 돈을 빌렸고, 220만 원을 들여 부엌에 처음 놓는데, 혼자 바깥일을 다녀야 할 적에는 집에 있는 사람이 써야 한다고 느꼈다.
이러고서 열네 해가 흐른 2025년에 싱싱칸을 새로 들인다. 155만 원이 든다. 우리 언니는 가난한 살림에 목돈이 드는 싱싱칸을 어찌 들이겠느냐면서 새삼스레 목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한다. 올해에는 깃새지기(상주작가)로 부산을 자주 오가면서 일한 삯을 조금 모았기에 우리 살림돈으로 장만할 만하겠거니 여긴다.
요사이는 싱싱칸이 없으면 안 된다고 여겨 버릇하지만, 사람들이 싱싱칸을 갖춘 지 고작 마흔 해가 안 된다. 마흔 해 앞서 1985년을 떠올리면, 그무렵에 싱싱칸 없이 살던 사람이 꽤 많았다. 내가 어린날을 보낸 인천 중구 신흥동 골목마을로 친다면, ‘싱싱칸 있는 집’이 손에 꼽을 만했다. ‘집전화’조차 돈 많이 든다며 못 놓은 골목집이 많았다. 그래서 그무렵에는 ‘전화’가 아니라 ‘어린이’가 심부름꾼이 되어 이웃집으로 달려가서 알렸다. 1985년 무렵을 돌아보면, 인천이라는 큰고장이었어도 마당이나 빈터를 파서 김치독을 묻었다. 된장독과 고추장독과 간장독도 으레 따로 건사하던 무렵이다.
우리 어버이집은 큰집이요 다달이 비나리(제사)를 한두 벌쯤 치러야 하고, 여러모로 손님치레를 해야 하느라 1983년 언저리에 싱싱칸을 들였지 싶고, 싱싱칸을 들였어도 김치독에 된장독에 고추장독에 간장독도 따로 두었다. 어머니는 모두 손수 담갔고, 언니랑 나는 으레 어머니 일손을 도왔다.
바쁜 서울살이를 하는 사람이기에 싱싱칸 없이는 못 살지 않는다. 텃밭까지는 못 하더라도, 또 텃밭을 할 땅뙈기가 없더라도, 저잣마실을 할 틈을 못 내는 삶이라면, ‘너무 바쁜 돈벌이’를 그치거나 멈춰야 하지 않을까? ‘바빠서 저잣마실을 못 한다’거나 ‘바쁘고 힘들어서 집밥을 못 차린다’고 말하고 싶다면, 그냥 이 삶을 그만두는 쪽이 낫지 않을까? 우리가 이 삶을 누리는 뜻이라면, 쳇바퀴로 ‘돈벌이(회사생활)’에 갇힌 굴레가 아니라, ‘바쁘건 힘들건 내가 나답게 살아가고 살림하며 사랑하는 길’을 걸을 노릇이라고 본다.
한 사람이라도 일찌감치 서울을 떠나야 이 나라와 서울과 시골이 다 바뀐다. 남이 떠나길 바라지 말고, 나부터 떠나서 시골에서 조용히 보금자리를 가꿀 적에 마을과 나라와 우리별이 나란히 빛날 만하다.
걷거나 두바퀴를 달려서 저잣마실을 다녀오면 된다. 나는 시골에서 두어 시간마다 하나 지나가는 시골버스를 타고서 읍내 저잣마실을 다녀오기도 한다. 읍내를 오가는 길은 30km인데, 시골버스에서는 이 길을 오가는 동안 글을 쓰고 책을 읽는다. 시골버스를 내려서 가게를 드나들 적에는, 걸으면서 읽고 쓴다.
싱싱칸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밥살림을 꾸린다. 싱싱칸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알맞게 건사하면서 누리면 된다. 싱싱칸을 안 두던 무렵에, 두 아이를 두바퀴에 태우고서 저잣마실을 다녀오면 아이들이 언제나 반기며 신난다. 어버이는 두 아이 몸무게에 저잣짐을 실어나르느라 땀을 빼지만, 아이들 웃음노래를 즐기면서 천천히 발판을 구르면서 언덕을 오르고 내리막을 가른다.
일곱 해를 쓸 수 있다는 싱싱칸을 열네 해나 썼으니, 우리집 싱싱칸은 참으로 애썼다. 새 싱싱칸이 들어오면 고이 쉬기를 바라면서 고맙게 보내려고 한다. 새 싱싱칸도 앞으로 열네 해를 쓰고서 보낼는지 모르는데, 이다음에 싱싱칸을 새로 들여야 한다면, 부피를 확 줄이려고 한다. 2025.9.1.
ㅍㄹㄴ
글 : 숲노래·파란놀(최종규). 낱말책을 쓴다. 《풀꽃나무 들숲노래 동시 따라쓰기》, 《새로 쓰는 말밑 꾸러미 사전》,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말과 문해력》, 《들꽃내음 따라 걷다가 작은책집을 보았습니다》, 《우리말꽃》, 《쉬운 말이 평화》, 《곁말》, 《책숲마실》, 《우리말 수수께끼 동시》, 《시골에서 살림 짓는 즐거움》, 《이오덕 마음 읽기》을 썼다. blog.naver.com/hbooklove

냉장고를 다룬 책이
꽤 많다.
앞으로 더 늘어날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