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헐, 브뢰겔, 브뢰헬. 이 위대한 플랑드르 화가에 대한 글을 쓰면 성(姓)을 어떻게 써야 할지 헷갈린다. 네덜란드 원어명은 ‘Brueghel’이다. 특이하게 브뤼헐은 그림에 자신의 서명을 남길 때 ‘h’를 뺀 ‘Bruegel’로 적었다.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영어식 발음에 가까운 ‘브뢰겔’이 더 많이 알려졌다. 네덜란드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Bruegel’은 ‘브뤼헐’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성의 발음만 복잡한 것이 아니다. 복잡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브뤼헐이라는 성을 가진 화가가 한 명이 아니라는 점이다. 화가로 활동해서 이름을 알린 브뤼헐이 모두 네 명이나 있다. 이들은 브뤼헐 집안(家)사람이다. 브뤼헐 가는 플랑드르를 대표하는 화가 집안으로 명성을 떨쳤다. 사람들은 여러 명의 브뤼헐을 쉽게 구분하기 위해 별명을 만들었다. 미술사를 공부한 사람도 브뤼헐이 그린 그림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혼동한다. 예를 들면 아버지 브뤼헐이 그린 그림을 그의 아들이 그린 것으로 착각한다. 오늘날 현존하는 그림에 ‘Bruegel’이라는 서명이 있으면 아버지 브뤼헐이 그린 것인지 아니면 아들이 그린 것인지 한 번에 구별하기가 어렵다. 브뤼헐의 그림이 유명해서 모사작품도 많이 나왔는데, 아들 브뤼헐이 아버지 브뤼헐의 그림을 모사한 작품도 있다.
브뤼헐 가의 계보와 그들의 별명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다.
1. 피터르 브뤼헐 / 대 브뤼헐
(네덜란드: Pieter Brueghel de Oude, 영어: Pieter Brueghel the Elder, 1525?~1569)

피터르 브뤼헐(대 브뤼헐) 자화상

피터르 브뤼헐 『죽음의 승리』 (1562년경)

피터르 브뤼헐 『눈 위의 사냥꾼』 (1565년)

피터르 브뤼헐 『농민의 결혼식』 (1568년)
농민의 생활 장면이나 네덜란드 전통 풍습을 소재로 많은 그림을 남겼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농민 브뤼헐’이다. 한때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화풍에 가까운 초현실적인 분위기의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서 ‘도깨비 브뤼헐’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the Elder’는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름 뒤에 붙는 형용사구다. 성이 비슷한 부자(父子)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the Elder’를, 아들은 ‘the Younger’를 쓴다. 우리말로는 ‘대(大)’와 ‘소(小)’를 사용한다. ‘농민 브뤼헐’로 알려진 피터르 브뤼헐은 ‘대 브뤼헐’로 부르기도 한다.
2. 피터르 브뤼헐 / 소 브뤼헐
(네덜란드: Pieter Brueghel de Jonge, 영어: Pieter Brueghel the Younger, 1564~1638)

안토니 반 다이크 『피터르 브뤼헐(소 브뤼헐)』

피터르 브뤼헐(소 브뤼헐) 『새덫이 있는 겨울 풍경』 (1601년)
‘농민 브뤼헐’의 장남이다. 그는 아버지와 다르게 괴물이 등장하는 공상적인 세계의 풍경화를 그렸다. 별명은 ‘지옥의 브뤼헐’이다.
3. 얀 브뤼헐 / 대 얀 브뤼헐
(네덜란드: Jan Brueghel de Oude, 영어: Jan Brueghel the Elder, 1568~1625)

피터르 파울 루벤스 『얀 브뤼헐 가족』 (1612~1613년)
그림 오른쪽에 있는 소년은 커서 화가가 됩니다.

얀 브뤼헐, 피터르 파울 루벤스 『후각의 알레고리』 (1618년)
대 브뤼헐의 차남이자 소 브뤼헐의 동생이다. 다행히 차남의 이름은 ‘얀’이다. 얀 브뤼헐은 꽃과 동물 그림에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그의 별명은 ‘꽃의 브뤼헐’이다. 사람들은 지옥을 생생하게 묘사한 형과 구분하려고 얀에게 ‘천국의 브뤼헐’이라는 별명까지 붙여줬다. 얀은 루벤스와 함께 그림을 그린 적이 있다.
4. 얀 브뤼헐 / 소 얀 브뤼헐
(네덜란드: Jan Brueghel de Jonge, 영어: Jan Brueghel the Younger, 1601~1678)
얀 브뤼헐의 아들은 ‘소 얀 브뤼헐’로 부른다. 아들도 화가로 활동했으나 그가 그린 그림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할아버지(대 브뤼헐)와 큰아버지(소 브뤼헐) 그리고 아버지의 명성이 높아서인지 얀 브뤼헐 아들은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요약한 것만 외우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피터르 브뤼헐 (1525?~1569) – 대 브뤼헐, 농민 브뤼헐
피터르 브뤼헐 (1564~1638, 대 브뤼헐의 장남) – 소 브뤼헐, 지옥의 브뤼헐
얀 브뤼헐 (1568~1625, 대 브뤼헐의 차남) - 꽃의 브뤼헐, 천국의 브뤼헐
얀 브뤼헐 (1601~1678) - 얀 브뤼헐의 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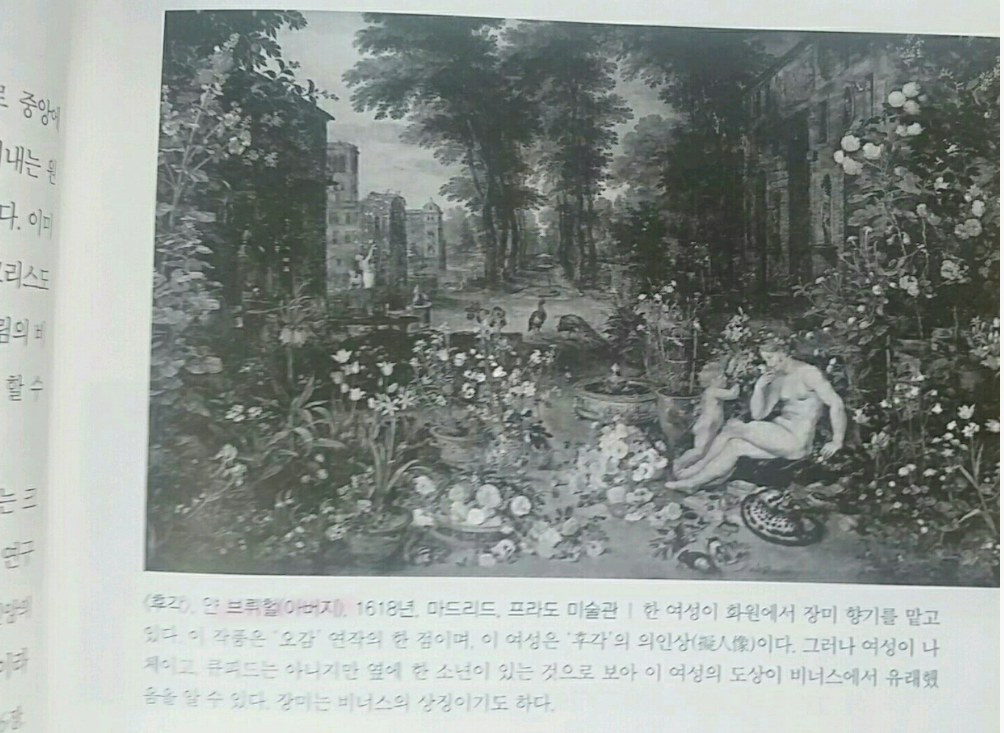
《관능미술사》 31쪽에 얀 브뤼헐이 그린 그림이 있다. 여기서는 ‘얀 브뤼헐(아버지)’로 적혀 있다. 이 그림은 얀 브뤼헐이 혼자 그린 것이 아니라 피터르 파울 루벤스와 공동 제작한 것이다. 얀 브뤼헐의 아들이 화가로 활동한 사실을 모르는 독자들은 ‘얀 브뤼헐(아버지)’가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지 못한다. ‘얀 브뤼헐(아버지)’로 쓰려면 얀 브뤼헐과 그의 아들에 대한 짤막한 언급을 추가했어야 한다.
※ 딴죽걸기 하나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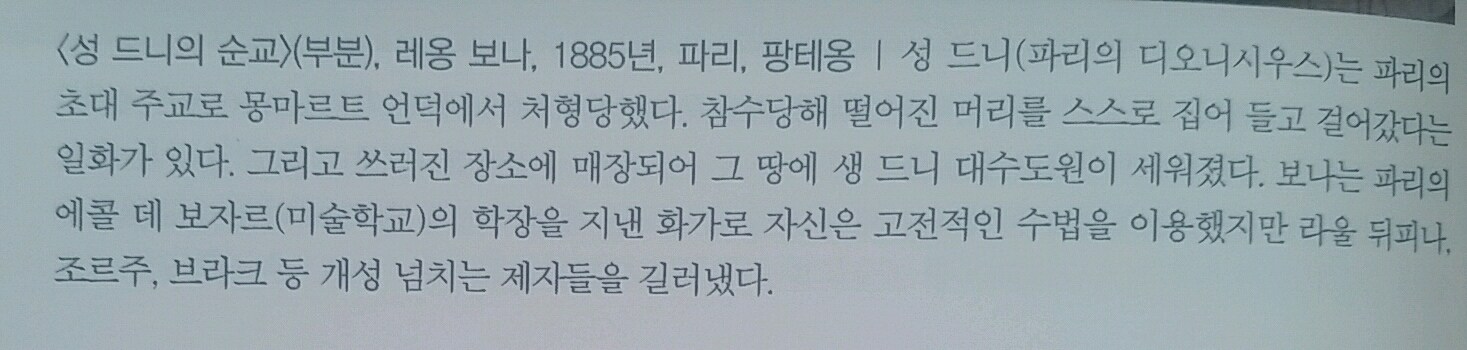
책을 만드는 사람은 이 사소한 내용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책의 오점이 그대로 남는다. 사진 속 문장은 레옹 보나의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잔혹미술사》 96쪽에 있다. 여기서 잘못된 문장 한 줄이 있다.
[라울 뒤피나, 조르주, 브라크 등 개성 넘치는 제자들을 길러냈다.]
두 개의 쉼표(,)를 빼야 한다. 그러면 화가의 이름이 정확하다. 쉼표를 빼면 라울 뒤피(Raoul Dufy)와 조르주 브라크(Georges Braque)가 올바르다. 서양미술사에 ‘라울 뒤피나’라는 이름의 화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