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사빈코프(Boris Savinkov)는 소련 건국사와 러시아 문학사 양쪽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무장한 이방인’이다. 그는 인생의 절반을 손에 무기를 쥔 이방인으로 살았다. 러시아 황실과 고위 관료들을 암살하는 테러리스트로 활동했던 시절에는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했다.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면서 군주의 시대가 무너졌다. 사빈코프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케렌스키(Alexander Kerensky)의 임시정부에 합류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내분이었다. 사회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정치적 노선으로 인해 다투는 상태였고, 온건파인 케렌스키 임시정부는 이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결국 레닌(Vladimir Lenin)이 주도한 볼셰비키(Bolsheviks)가 임시정부를 축출하고 러시아를 장악했다.
사빈코프는 또다시 무기를 들었다. 그가 보기에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는 민중의 편이 아니었다. 사빈코프는 볼셰비키에 대항하는 무장 세력을 조직했다. 볼셰비키가 폴란드를 침공하자 사빈코프는 폴란드에 합류했다. 그는 폴란드에서 반 볼셰비키 운동을 펼쳤다. 1921년에 폴란드는 볼셰비키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종전 이후에 반 볼셰비키 세력을 ‘토사구팽’했다. 사빈코프는 러시아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 1922년 볼셰비키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등을 합병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결성했다.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때부터 러시아는 ‘소련’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세계만방에 자신들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소비에트 정권은 볼셰비키에 반대한 세력을 ‘반혁명 분자’로 규정하여 모조리 체포하거나 처단했다. 심지어 소련에 반정부 세력이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다면서 선동하기까지 했다. 사빈코프는 노동자를 위한 비밀 무장 세력에 합류하기 위해 소련에 돌아왔지만, 결국 비밀경찰에 발각되면서 체포되었다. 사실 그에게 손을 내민 비밀 무장 세력은 반정부 세력을 소탕하려는 소비에트 정권의 미끼였다. ‘무장한 이방인’ 사빈코프는 1925년에 소련의 감옥에서 생을 마쳤다. [주]

[대구 세계 문학 읽기 모임 <읽어서 세계 문학 속으로> 12월의 책]
* 보리스 사빈코프, 정보라 옮김 《창백한 말》 (빛소굴, 2022년)
사빈코프는 망명 생활 중에 무기 대신 펜을 쥐었다. 그는 러시아 고위 관료들을 암살하는 테러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세히 기록했다. 자전적인 성격이 짙은 이 글은 처음에 <테러리스트의 수기>라는 단순한 제목이 붙여졌다. ‘창백한 말’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나오는 표현이다. 사빈코프는 회상록을 소설로 개작했고, 《창백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했던 사빈코프는 ‘롭쉰(로프신, V. Ropshin)’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다.
하지만 사빈코프의 글은 사회주의자들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심지어 사회주의 혁명가들과 어울려 지낸 막심 고리키(Maxim Gorky)마저 사빈코프의 글에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사빈코프가 글로 묘사한 테러리스트, 즉 혁명가는 살인을 저지른 행위에 죄책감을 느끼는 인물이다. 그가 함께 활동한 사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정신적으로 나약한 인물로 그려지는 것이 못마땅했다. 테러리스트로 활동한 니콜라이 세르게예비치 튜체프(N. S. Tyutchev)는 자신의 회상록에서 사빈코프의 글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 ‘소설가 사빈코프’가 ‘혁명가 사빈코프’를 죽였다고 비판했다.

* [절판] D. S. 미르스끼, 이항재 옮김 《러시아 문학사》 (써네스트, 2008년)
사빈코프는 생전에 소설가로서 인정받지 못했으며 죽어서도 소설가로 대우받지 못한다. 러시아 문학사에서 사빈코프 또는 롭쉰이라는 이름을 찾기가 힘들다. 지금까지 국내에 출간된 모든 러시아 문학사 관련 문헌을 전부 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사빈코프가 한 번이라도 언급된 책 한 권을 찾긴 했다. 그 책이 바로 현재 절판된 드미트리 P. S. 미르스끼(Dmitry Petrovich Svyatopolk-Mirsky
)의 《러시아 문학사》다. 영국으로 망명한 미르스끼는 1922년부터 런던 대학에서 러시아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로 활동했고, 1926년에 <Contemporary Russian Literature, 1881~1925>를, 이듬해에 <A History of Russian Literature: From Its Beginnings to 1880>를 썼다. 이 두 권의 책 덕분에 영미권 국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러시아 문학사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국역본은 두 권의 책을 요약 편집한 책을 번역한 것이다.
미르스끼는 사빈코프를 ‘드미트리 메레시콥스키(Dmitry Merezhkovsky)의 영향을 받은 테러리스트’로 소개한다. 그리고 ‘센세이셔널한 고백’인 《창백한 말》은 메레시콥스키의 아내이자 시인으로 활동한 지나이다 기피우스(Zinaida Gippius)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평가한다. 메레시콥스키와 기피우스는 러시아 상징주의 운동을 이끈 작가다.
하지만 단편적인 수준의 내용은 사빈코프의 문학 세계를 이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리고 미르스끼의 《러시아 문학사》는 1920년대에 나온 책이다. <Contemporary Russian Literature, 1881~1925>는 사빈코프가 옥사한 지 일 년 뒤에 나온 책이다. 따라서 미르스끼의 분석은 사빈코프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제대로 조명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

* 이디스 클라우스, 천호강 옮김 《러시아 문학, 니체를 읽다: 도덕의식에 관하여》 (그린비, 2022년)
사빈코프와 러시아 상징주의자들의 문학 세계를 분석한 책이 이디스 클라우스(Edith Clowes)의 《러시아 문학, 니체를 읽다》다. 이 책은 19~20세기 러시아 지식인과 작가들이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철학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어떤 형식으로 자신들의 작품으로 구현했는지를 보여준다.
니체 철학을 접하자마자 ‘전율’을 느낀 메레시콥스키는 러시아 문화가 위대해지려면 종교적 의식, 즉 기독교적 의식이 살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종교적 가치의 부활을 갈망했는데, 자유로운 주체를 억압하는 기독교를 비판한 니체 철학을 ‘미래의 종교를 창조하기 위한 사상’으로 이해했다. 메레시콥스키는 러시아에 정착해야 할 새로운 기독교를 ‘제3의 성서’라고 표현한다. ‘제3의 성서’는 아름다움을 최상으로 여기는 유미주의와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기독교 윤리를 모두 수용한 미래의 종교다.
메레시콥스키는 러시아에 니체 철학에 관한 논문들을 출판하는 등 니체 철학을 대중에게 전파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는 고리키와 함께 니체의 책을 번역하려고 했지만, 이들의 계획은 실패한다. 두 사람이 이해한 니체는 너무나도 달랐다. 메레시콥스키가 니체의 반기독교적 관점에 주목했다면, 고리키는 ‘개인의 창조적 의지’에 주목했다. 그는 ‘창조적 의지’만 있으면 개인의 삶은 변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러시아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다. 두 사람 모두 니체 철학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통속적 니체주의자’였다. 볼셰비키가 혁명에 성공한 이후로 고리키는 니체 철학을 ‘부르주아 철학’으로 비난하면서 결별한다.
메레시콥스키는 프랑스로 피신한 사빈코프를 도와준 은인이다. 사빈코프는 은인의 영향을 받아 ‘니체주의적 소설’인 《창백한 말》을 썼다. 이디스 클라우스는 미르스끼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사빈코프와 메레시콥스키와의 관계를 알려준다. ‘롭신’이라는 필명을 지어준 사람은 지나이다 기피우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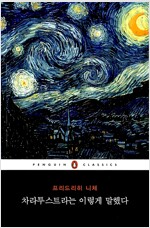

* 프리드리히 니체, 정동호 옮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책세상, 2015년)
* 프리드리히 니체, 김인순 옮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열린책들, 2015년)
* 프리드리히 니체, 홍성광 옮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펭귄클래식코리아, 2009년)
* 프리드리히 니체, 장희창 옮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민음사, 2004년)
이디스 클라우스는 자신의 책에 혁명가의 본명인 ‘사빈코프’ 대신에 필명이자 소설가 ‘롭신’을 호명한다. 그러나 소설가로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롭신은 니체의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드러난 초인(Übermensch)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접한 니체 철학은 러시아어로 번역된 니체의 저서가 아니었다. 러시아에 들어온 니체의 저서는 검열관에 의해 삭제되었거나 니체 철학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편집자의 손을 거친 ‘조악한 책’이었다. 러시아 지식인들은 ‘왜곡된 니체’를 성급하게 만났고, 모방하거나 오독하는 수준에 그쳤다. 클라우스는 롭신을 문학적 개성이 부족한 작가로 평가한다.
클라우스는 《창백한 말》에서 니체의 초인 사상을 ‘모방하고 왜곡한 흔적’을 주목한다. 《창백한 말》의 주인공 조지(George)는 테러리스트인 작가의 분신이다. 조지는 세상을 경멸한다. 사랑, 도덕, 평화도 증오한다. 그에게 테러와 살인은 혁명을 위한 일이 아니다. 조지는 ‘살인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의 삶은 ‘투쟁’이다. 하지만 무엇을 위한 투쟁인지 스스로 알지 못한다. 자신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파괴해야 직성이 풀리는 조지의 투쟁적 삶은 니체의 초인 사상으로 볼 수 없다. 니체의 초인은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마저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amor fati)’라는 용어로 알려진 ‘운명을 사랑하는(긍정하는) 태도’다. 조지의 목적 없는 투쟁은 결국 ‘자기 파멸’에 이른다. 니체 철학은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고, 자기 파멸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수동적 허무주의 또는 염세주의가 아니다.
《창백한 말》의 테러리스트는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인물이다. 세상을 증오하는 조지는 죽을 때까지 볼셰비키에 맞서 싸운 ‘무장한 사빈코프’를 닮지 않았다. 기독교적 사랑과 도덕을 무시하는 조지는 종교에 심취한 메레시콥스키에 대한 사빈코프의 거부감으로 볼 수 있다. 그래도 사빈코프는 생명의 은인을 등 돌릴 수 없었는지 은인의 아내가 지어준 필명으로 자전적인 소설 《창백한 말》을 발표했다. ‘소설가 롭신’은 니체를 잘못 이해한 니체주의자다. 이렇듯 《창백한 말》은 작가 한 사람의 분열된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소설이다.
[주] 이 글에서 서술된 러시아 혁명의 전개 과정은 주류 역사학계의 관점을 참고한 것임을 밝힌다. 러시아 혁명을 연구한 주류 역사학계는 케렌스키 임시 정부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한 1917년 10월 혁명을 ‘볼셰비키의 군사 쿠데타’로 이해했다. 이런 관점을 지지하는 보수파 역사학자들은 볼셰비키를 부정적인 정치 세력으로 바라봤다.
정보라 작가가 쓴 《창백한 말》 해설문에도 볼셰비키와 10월 혁명을 부정적으로 보는 역사적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정보라 작가는 사빈코프를 ‘권력에 저항한 민중주의자’로 소개하는데, 사빈코프가 저항한 ‘권력’이 바로 소비에트 연방을 수립한 볼셰비키를 가리킨다.


* [개정판] 알렉산더 라비노비치, 류한수 옮김 《1917년 러시아 혁명: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다》 (책갈피, 2017년)
* [구판 절판] 알렉산더 라비노비치, 류한수 옮김 《혁명의 시간: 러시아 혁명 120일 결단의 순간들》 (교양인, 2008년)
하지만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의 개방 정책과 소련 연방이 해체된 1991년 이후에 오랫동안 봉인된 문서고가 열렸다. 그 속에 볼셰비키와 10월 혁명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사료들이 있었다. 이 사료를 주목한 역사학자들은 주류 역사학계의 보수적인 견해를 반박했고, 10월 혁명을 ‘민주적인 과정을 거친 혁명’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권력 독점을 목표로 한 다수파로 알려진 볼셰비키는 ‘민중의 평등이 목표인 소수파’였다고 주장한다. 수정주의적 견해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러시아 혁명 연구자가 알렉산더 라비노비치(Alexander Rabinowitch)다. 라비노비치의 저서 《1917년 러시아 혁명》(구판 제목은 《혁명의 시간》이다)은 케렌스키 임시정부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군인 사빈코프’의 활약상을 알 수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