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에서 갑자기 친구가 된 나폴레옹과 프랑스인들에 대해 총사령부와 보리스가 보인 태도의 변화는, 로스토프와 그가 떠나온 군대 내에서는 아직 이루어질 겨를이 없는 것이었다. 일반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보나파르트와 프랑스인들에게 증오와 경멸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품고 있었다.(p223) <전쟁과 평화 2> 中
1809년이 되자 세계의 두 통치자라 불리던 나폴레옹과 알렉산드르의 친교는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는 동안에도 건강, 질병, 노동, 휴식이라는 본질적 관심, 그리고 사상, 학문, 시, 음악, 사랑, 우정, 증오, 욕망이라는 관심을 지닌 사람들의 실제 생활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의 정치적 접근과 반목, 그 밖의 온갖 개혁과는 아무런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p244) <전쟁과 평화 2> 中
<전쟁과 평화 2 war and Peace 2>에서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과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는 대립에서 화해하며 1812년 러시아 원정 이전 잠시나마 평화로운 시기를 그린다. 정치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화해는 처음에는 낯설게 받아들여지지만,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다시 일상의 주제가 사람들의 마음을 덮게 된다.
<전쟁과 평화 2>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주인공 피예르가 프리메이슨(Freemason)에 가입하고, 프리메이슨의 사상에 빠져드는 대목이다. 인도주의/박애주의를 지향하는 친목단체라지만, 음모가들에게 어둠의 세력으로 지목받고 있는 프리메이슨. 이와 함께 영화 <아이즈 와이드 셧 Eyes Wide Shut>과 연관성으로 알려진 일루미나티(바이에른 광명회 Illuminatenorden Bayern)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를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니, 일루미나티에 대한 정보는 없었고, 프리메이슨에 대한 정보가 있어 이를 옮겨본다.

[사진] 프리메이슨(출처 : https://www.britannica.com/topic/order-of-Freemasons)

프리메이슨 Freemason : 18세기 초 영국에서 시작된 세계시민주의적(世界市民主義的)/인도주의적 우애(友愛) 단체. '로지(작은 집)'라는 집회를 단위로 구성되어 있던 중세의 석공(石工 : 메이슨) 길드를 모체로 한다. 1717년 런던에서 몇 개의 로지가 대(大)로지를 형성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 후, 18세기 중엽 전영국에서 유럽 각국과 미국까지 퍼졌는데, 그것은 이미 석공들만의 조직이 아니라, 지식인/중산층을 많이 포함하였으며, 계몽주의 사조에 호응하여 세계시민주의적인 의식과 함께 자유주의/개인주의/합리주의의 입장을 취하였고, 종교적으로는 관용을 중시하였다. 그 때문에 특히 가톨릭교회와 가톨릭을 옹호하는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게 되어 비밀결사적인 단체가 되었다. 프랑스 혁명이나 19세기 여러 정치적 사건과 연루되기도 했지만 역할이 과장되어 전하는 경향이 있다. 20세기에는 정치와 연관성이 거의 없어졌고,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대로지밑에 몇 개의 로지를 두는 식의 조직으로 회원 상호간의 우호와 정신함양 및 타인에 대한 자선/박애사업을 촉진하는 세계동포주의적/인도주의적인 단체가 되었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 中
일루미나티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의 정보밖에 찾을 수 없었지만, 작품 속의 내용을 통해 기독교인들에게 탄압을 받던 프리메이슨 회원들 사이에도 일루미나티는 위험한 조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루미나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페이퍼에서는 톨스토이 사상과 프리메이슨 사상에 대해 한정하여 비교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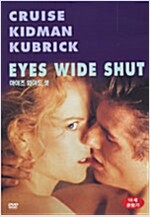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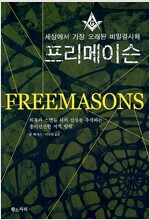
이 연설에서 일루미나티의 위험한 사상을 발견한 대부분의 형제들은 피예르에게 놀랄 만큼 냉담한 태도를 보였다. 갖가지 당파가 형성되고, 일루미나티(각주 : Bavarian Illuminati, 바이에른 광명회라고도 부른다. 1776년 독일에서 결성된 급진적 비밀결사로, 절대왕정을 전복시키고 자유와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유토피아를 꿈꾸었다)에 빠져 있다고 비난하며 피예르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다.(p276) <전쟁과 평화 2> 中
<전쟁과 평화 2>에서는 피예르 또는 늙은 프리메이슨 회원의 입을 통해 프리메이슨의 사상이 많은 부분에 걸쳐 소개되고 있는데, 톨스토이(Lev Nicolayevich Tolstoy, 1828 ~ 1910)의 사상을 담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2> 안의 내용을 떠올리게 하는 몇몇 대목이 있어 이를 옮겨본다.
1. 내면에 존재하는 신(神)
"당신은 하느님을 모릅니다.. 선생, 그렇기 때문에 몹시 불행합니다. 당신은 하느님을 모르지만, 하느님은 여기, 내 안에, 나의 말 속에, 또 당신 안에, 아니 당신이 지금 한 그 불경한 말 속에 계십니다." 엄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프리메이슨이 말했다.(p119) <전쟁과 평화 2> 中
성서의 전설에 의하면, 노동을 하지 않는 것 - 무위 - 은 타락하기 전 최초의 인류에게는 행복의 조건이었다고 한다. 무위를 좋아하는 마음은 타락한 인간 속에 그대로 남았지만, 신의 저주가 끊임없이 인간에게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스스로 빵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는 편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내면의 목소리는 무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속삭인다.(p377) <전쟁과 평화 2> 中

우리가 나의 시작이라 인식하는 이 정신적인 '어떤 것'이야말로 과거와 현재의 모든 현인들이 신이라 이름했던 것이다. 나의 내부에서만 신을 인식할 수 있다. 내부에서 이것을 발견하기 전에는 어디에서도 신을 발견할 수 없으리라. 자기 내부에서 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p100) <인생이란 무엇인가 2> 中
프리메이슨의 어느 회원은 신(神)이 자신의 내면과 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원의 말과 자신의 내부에서 신을 발견해야 한다는 톨스토이의 말에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된다.
2. 형제애(兄弟愛)
"혼자서는 누구도 진리에 도달할 수 없으며, 만인이 협력해 하나하나 돌을 쌓아올리면서 인류의 아버지 아담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백만의 세대를 거쳐야 비로소 위대한 하느님이 사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p118) <전쟁과 평화 2> 中
피예르는 어렸을 때 고해하면서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공포와 경건함을 느꼈고, 생활의 조건에서 보면 아무 인연이 없지만, 인류의 형제애라는 점에서는 지극히 친숙한 사람과 대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피예르는 숨막히는 격렬한 심장의 고동을 트끼면서, 리토르(프리메이슨에 가입하려는 자를 준비시키는 형제를 이렇게 불렀다)쪽으로 다가갔다.(p129) <전쟁과 평화 2> 中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의 가슴에 동일한 영적 본원이 깃들어 있다는 것, 그들이 모두 형제자매임을 가르치고, 그로써 그들을 하나로 결합하고 즐거운 공동체로 이끈다.(p123) <인생이란 무엇인가 2> 中
<전쟁과 평화 2>에서는 프리메이슨의 형제애가 소개된다. 인류가 모두 형제이며, 진리에 이르기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프리메이슨 회원과 피예르의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형제자매임을 강조하는 톨스토이 말에서 초기 기독교 공통체의 분위기를 발견하게 된다.
3. 세상의 악(惡)
당신도 잘 아시는 인류의 적은 인류의 적은 프로이센군을 공격하는 중입니다. 프로이센군은 삼 년 동안 겨우 세 번밖에 우리를 속이지 않았던 성실한 동맹군이죠 우리는 그들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류의 적은 우리의 풀륭한 제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무례하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프로이센군에 덤벼들어, 모처럼 시작된 열병식을 끝낼 틈도 주지 않은 채 그들을 분쇄하고 포츠담 궁전을 점거해버렸습니다.(p159) <전쟁과 평화 2> 中
<전쟁과 평화 2>에서는 나폴레옹은 세게를 위협하는 악(evil)으로 묘사된다. 그렇지만, 작품 속에서 나폴레옹에 대한 묘사가 러시아 외교관에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해본다면, 러시아 독자가 아닌 이들은 이에 대해 선뜻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프랑스 독자들에게도 '나폴레옹=인류의 적(敵)'이라는 공식이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2> 에서 폭력에 대한 톨스토이의 생각이 보완해 줄 것이다.
불행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잘못된 공상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폭력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기도 한다. 그러한 착각은 그들의 누군가를 기만하기 위해 생각해낸 것이 아니다.(p232)... 폭력으로 사람들을 선량한 삶으로 이끌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먼저 폭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사악한 삶의 본보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p233) <인생이란 무엇인가 2> 中
4. 톨스토이의 정치철학
이처럼 <전쟁과 평화 2>에서 묘사된 프리메이스 사상과 <인생이란 무엇인가 2>의 톨스토이 사상 속에서 우리는 내면에 존재하는 신, 형제애, 세상의 악에 대한 공통된 목소리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이를 근거로 톨스토이가 프리메이슨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무리함이 있지만, 적어도 프리메이슨 회원의 입에서 나온 사상이 톨스토이 사상과 관련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프리메이슨 회원 피예르의 입을 통해 톨스토이 사상의 지향점이 '형제애에 기반한 보편적인 정부 수립'을 향하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지 않을까.
피예르는 프리메이슨의 세 가지 사명 중 도덕적 삶의 모범이 되라는 사명을 아직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일곱 가지 미덕 중 온후와 죽음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자기 안에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대신 그는 다른 사명, 즉 자신이 인류의 교화를 실행하고 있으며, 또다른 미덕인 인류에 대한 사랑과 특히 관용을 가지고 있다고 자위했다.(p169) <전쟁과 평화 2> 中
한마디로, 온 세계를 지배하는 보편적인 정치 형태를 수립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시민적 연대를 파괴하는 일 없이 온 세계에 보급되어야 하고, 그때 모든 정치는 종전대로 계속 운영되고 우리 기사단의 위대한 목적, 즉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방해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이야말로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p275) <전쟁과 평화 2> 中
물론, 톨스토이에게 <전쟁과 평화>가 인생 최후의 작품도 아니고, 이후에도 <안나 카레니나>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을 썼기에 이러한 결론은 완성된 결론이 아니고, 하나의 가정에 불과할 것이겠지만, 톨스토이의 다른 작품들 안에서 이후 작가의 사상이 어떻게 움직여갔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작품을 읽는 또다른 즐거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