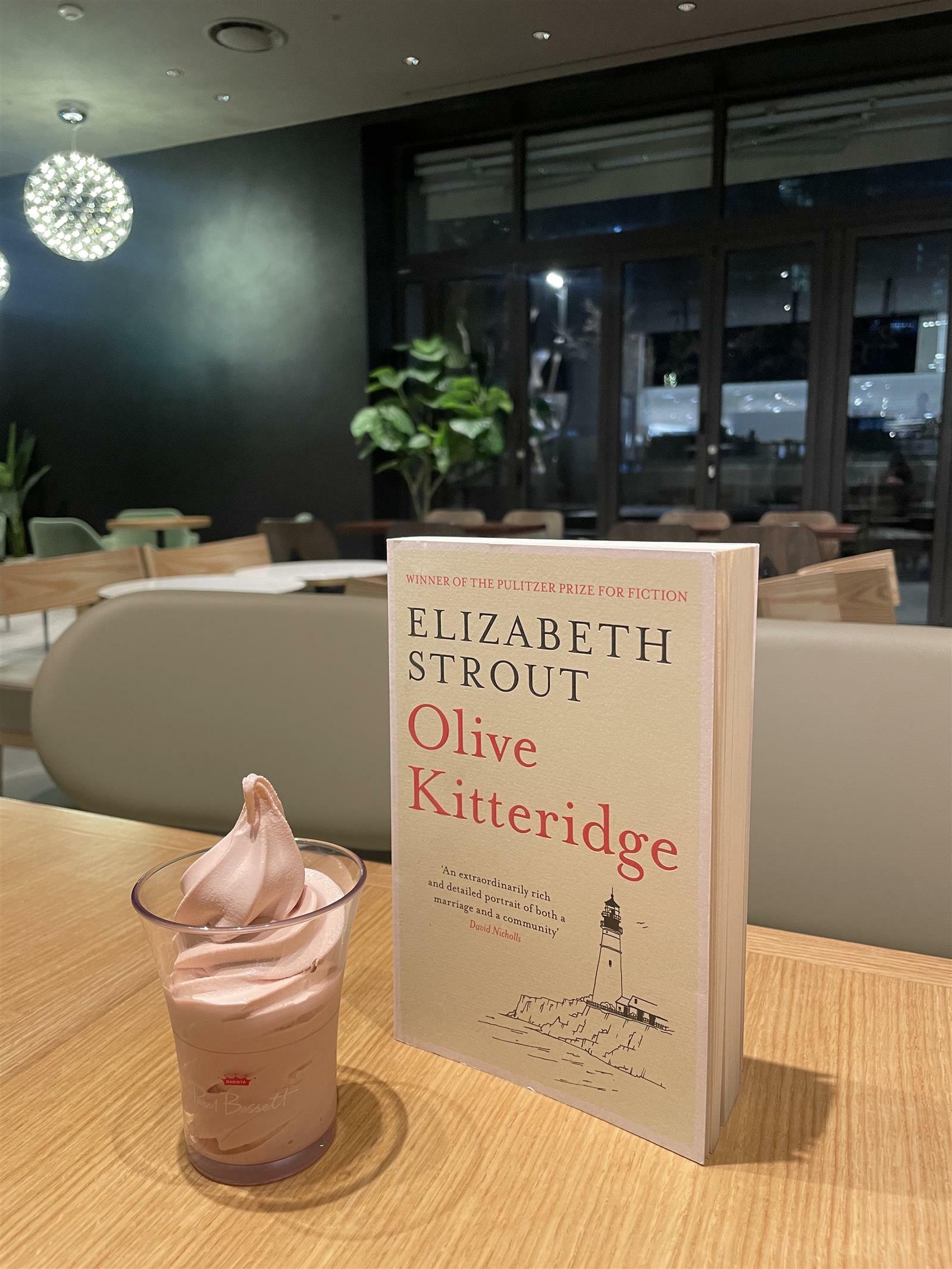1. 임금의 가부장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임금 노동을 계급투쟁의 핵심 영역으로 우선시하고 우리의 삶이 재생산되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 일부를 간과함으로써, 우리에게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부분적 시각만을 제공하고 프롤레타리아 계층을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인 정책의 도구로 동원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회복력과 능력을 과소평가했다. 특히 재생산 노동에 대한 과소이론화(undertheorizing)는 여성의 무급 가사 노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가족의 형성 같은 자본주의 전략의 주요한 발전을 예상하는 그의 능력에 영향을 미쳤다.(9쪽)
알고 있었음에도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세계의 지성. 이를 테면,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유용하고 실제적인 정치 문화 분석(에 더해 해결책의 일부)을 내놓았던 마르크스마저도 여성의 노동이자 무임금 노동, 가사 노동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재생산 노동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이기 때문이다. 인구의 절반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연구와 고찰, 그 이론과 변혁의 한계를 야무지게 파헤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마르크스 페미니스트들이고. 실비아 페데리치는 그런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2. 맞벌이의 함정
두 사람의 소득으로 운영되던 중산층 가정은 남편 혹은 아내의 실직이나, 가족 구성원의 질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경제적 압박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이 가정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외제차를 구입했다거나 사치품 소비에 많은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여긴다. 하지만, 이런 비극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정 내 수입 구조가 변화를 맞게 되었을 때, 자녀들을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 무리해서 구입한 교외 주택 대출비를 제때 상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사회적 차원에서 교육개혁과 금융 재규제(reregulation)를 제안한다. 학군제를 폐지하고,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 학교 선택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유아교육 전액 지원, 대학 등록금 동결(273쪽)을 주장하고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아주 뜨겁다. 부동산 문제이지만, 양극화 현상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고, 교육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 결혼과 출산 문제이기도 해서, 정확히는 세대 갈등의 핵심 부분이기도 하다.
정치가 사회 내부의 커다란 모순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해결해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다. 내가 읽는 책날개에는 하버드대학 법대 교수라고 되어 있어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저번 글을 읽으셨던 미국에 사시는 알라디너 이웃님이 미국의 상원 의원 워런 맞죠?하고 물으셔서 약력을 찾아보니, 그랬다. 미국 상원 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이었다. 정치에 입문한 뒤에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으나, 파산법을 전공해 가르치던 교수에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진보적인 가치를 위해 애썼다는 점에서 저자(제1저자)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3. The Flatshare /셰어하우스
이 책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찌어찌 알게 돼서 읽었다. 설정이 flatshare이다. 생판 모르는 두 남녀를 이렇게 가까이 묶어두는 데에는 여러 가지 설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소설에서는 그 이유를 '경제적'인 데서 찾는다. 돈이 필요한 남자와 싼값에 집을 찾아야 하는 여자. 침대를 사용하는 시간이 정반대인지라 서로의 얼굴도 모른 채 좌충우돌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된 두 사람은 메모지를 통해 서로의 생활에 대한 조언과 부탁을 이어가는데, 메모는 점점 더 다정해지고, 편지로까지 이어질 찰나. 스케줄을 헷갈린 여주인공 덕분에(?) 두 사람은 원치 않는 조우를 하게 된다.
이전 남자친구에게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해온 여주의 처지가 안쓰럽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몇몇 장면에서는 여주가 너무 미숙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남주의 우유부단함 역시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건 또 그가 가졌던 트라우마 때문이고. 여주를 돕는 세 명의 친구, 그리고 남주 동생의 조력이 아니었다면, 여주는 스토커 남자친구에게서 도망치지 못했을 테고, 두 사람의 오해는 해소되지 못했을 것이며,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깐, 이 책의 주제라면, 우정의 소중함.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친구의 적극적 개입이, 내 사랑을 완성시켰다는 결론.

지난주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고등어조림을 먹으러 다녀왔다. 집 앞 마트에 잠시 들렸는데, 어머니께서 '니 동서가 LA 갈비와 전을 해올 테니 너는 아무것도, 아무것도 해오지 말거라'라고 말씀하셨다. 아니, 전이 손이 많이 가는데 동서가 LA 갈비까지 해 오면 어떡해요. 작년과 재작년, 꼬치전과 한우 갈비찜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이미 본때를 보여드렸으니, 시어머니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 단 하나의 선택일 수 밖에 없었다. 어머니, 그럼 시금치랑 고사리는 제가 만들어갈게요. 맛 없어도 만들 수는 있어요. 아니다, 그건 내가 손이 익어서 내가 하는 게 나아.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하여, 옆 동네에 소문난 홍어 맛집에 가서 홍어회를 사고, 전통의 맛 옛날 사라다를 두 통 만들었다. 그리고, 회심의 도전작. 내 인생은 항상 도전이다. 인생 자체가 항상 그랬다. 라이스페이퍼 새우튀김을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시댁에서는 물론 집에서도 항상 본때의 대상이 되었던 남편은 안 그래도 된다고, 진짜라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을 거짓말을 조금 보태 100번 정도 말했으나, 내 결심은 굳건했다. 냉동새우 '중' 사이즈를 두 팩이나 사 두었고, 라이스 페이퍼 두 팩, 칠리소스도 확인해 두었고, 올리브유도 새로 한 통 구입했다. 쇼츠로 10번은 봤음직한 영상을 두 번 더 보고, '라이스페이퍼 새우튀김'을 시작했다. 제일 잘 된 순간이라면 새우들을 줄 세웠던 바로 이 순간이었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엉망진창. 아니, 예상대로 엉망진창이었다. 기름 가득한 프라이팬 속에서 새우들은 서로 껴안기 십상이었고, 완성된 쌀튀김옷 사이로 새우들은 탈출을 감행했으며. 그것이 새우여서 맛있다는 그 사실을 제외하고는. 역시나, 이번에도 어김없이. 원치 않게. 본때를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웃픈 시간들이.... 잘 지나갔다.
이 책을, 찾았다. Olive Kitteri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