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김준희 기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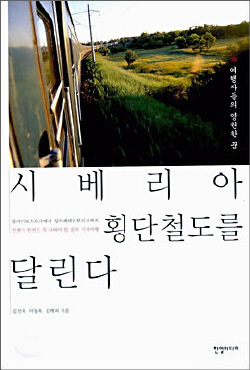 |
|
| ▲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달린다> 표지 |
|
| ⓒ2006 한얼미디어 |
배낭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꿈꾼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를 연결하는 총길이 9000km가 넘는 이 열차는, 글자 그대로 시베리아를 가로지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열차구간이다.
이 열차가 배낭족들에게 동경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시베리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외경과 신비, 그리고 기차여행의 낭만과 여유로움이 합쳐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아직 미지의 지역인 시베리아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방법이 바로 이 열차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배낭여행자들이 선뜻 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기차 안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이고, 주요 도시마다 내려서 하루 이틀 머물며 구경을 하려면 여행의 예상 기간은 20일을 훌쩍 넘어버린다.
게다가 언어의 소통이 어려운 러시아 땅인데다가 까다로운 경찰들, 소문으로 떠도는 대도시의 스킨헤드와 마피아까지 상상을 해보면, 이 열차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비용 이외에도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위험을 무릅쓴다 하더라도 장거리 열차여행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열차는 싸고 안전하고 시간도 잘 지켜지는 편이지만, 열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이틀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기차가 지겨워지는 현상이 시작된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몽골의
울란바토르에서 러시아의
이르쿠츠크로 가는 장거리 기차를 탔던 적이 있다. 중간에 몇몇 역에서만 잠시 내릴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을 모두 기차 안에서 보냈던 그 2박3일.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왠지 모를 기대와 두근거림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겨움으로 바뀌는 데는 채 이틀이 걸리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비슷한 벌판의 풍경, 매번 기차 안에서 때워야 하는 간단한 식사,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기차 안에서의 생활은 극히 단순해진다. 배고프면 대충 밥을 먹고 심심하면 책을 읽고 그러다가 졸리면 자고. 좁은 기차 안에서 그렇게 있다 보면 열차가 작은 역이라도 정차해서 바깥에 내릴 수 있기만을 바라게 된다.
게다가 기차는 또 왜 그렇게 느리게 달리는지. 좁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는
KTX니 뭐니 해서 빠르게 이동하려고 하지만, 넓은 러시아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들은 느리게 느리게 움직인다. 그 차창에 붙어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자면 새장 속에 갇힌 새가 연상될 정도였으니, 그 2박3일 이후로 난 '러시아도 좋고 시베리아도 좋지만 횡단열차만큼은 사양하겠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다.
이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시베리아 횡단열차로 러시아를 여행한 사람들의 책이 나왔다. 소설가와 사진작가, 기자가 함께 시베리아를 횡단하고 그 여정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달린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만들었다.
이들의 여정은 속초시 동명항에서 시작된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러시아의 자루비노 항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이들은 이곳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시베리아를 가로지르기 시작한다.
하바로프스크와 이르쿠츠크,
예카테린부르크를 거쳐서 모스크바로.
이 중에서도 동시베리아에 해당하는 이르쿠츠크 동쪽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와 많은 연관이 있는 곳이다. 일본강점기에 소련에서 독립운동과 공산당 활동을 했던 많은 한인들의 무대가 이 지역이고, 게다가
바이칼 호수는 한민족의 발원지라고까지 알려진 곳이다. 그래서인지 저자는 동시베리아의 도시에 머물 때마다 이곳을 거쳐간 한인들의 과거를 생각하고 우리 문화와의 유사성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여행이 속 편한 여행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시설이 안 좋은 기차 안에서 더위에 시달려야 하고, 기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닫힌 공간'인 기차 속의 고독과 맞서는 시간을 치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창밖으로 보이는 시베리아의 광활한 풍경을 지면과 사진을 통해서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원래 이들은 모스크바를 거쳐서 다시 기차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갈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페테르부르크에 머무는 도중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이들의 거침없는 행진은 여기서 끝이 나고 만다.
현지정보를 포함한 꼼꼼한 여정이나 여행 중의 에피소드, 현지인과의 만남보다는 여러 도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지에 얽힌 한인들의 이야기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런 면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책에 실린 풍부한 사진과 생생한 묘사가 횡단열차를 상상하기에 충분하다.
시베리아와 러시아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바이칼 호수나
예니세이 강,
우랄산맥 같은 지명만으로도 가슴이 설렐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지만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 시베리아. 섣불리 떠날 수 없다면 이 책을 읽고 사진을 보면서 시베리아 여행의 대리만족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간접경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