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를 읽게 된 것도 알라딘서재를 통해서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폼나게 하는 데는 역시 시집이 최고인데, 이것도 웬만해야 폼을 잡지, 아무래도 시는 어렵다. 지금도 어렵기는 매한가지이지만, 요즘엔 좋은 시, 마음을 울리는 좋은 시가 들어있는 시집을 하나씩 사서 읽고 있다. 너무 호강한다는 생각이, 자주 드는 요즘이다.
김이듬의 시집에서는 이 시가 가장 좋다. 다락방님 서재에서 처음 읽고는 몇 일간 읽고 또 읽었다.
겨울 휴관
무대에서 내려왔어 꽃을 내미네 빨간 장미 한 송이
참 예쁜 애구나 뒤에서 웃고 있는 남자 한때 무지 좋
아했던 사람 목사가 되었다 하네 이주 노동자를 모이
는 교회라지 하도 괴롭혀서 도망치더니 이렇게 되었
구나 하하하 그가 웃네 감격적인 해후야 비록 내가
낭송한 시라는 게 성직자에게 들려주긴 참 뭐한 거였
지만
우린 조금 걸었어 슬며시 그의 딸 손을 잡았네 뭐
가 이리 작고 부드러울까 장갑을 빼려다 그만두네 노
란 코트에 반짝거리는 머리띠 큰 눈동자는 내 눈을
닮았구나 이 애 엄마는 아마 모를 거야 근처 미술관
까지 차가운 저녁 바람 속을 걸어가네 휴관이라 적혀
있네 우리는 마주 보고 웃다가 헤어지려네 전화번호
라도 물어볼까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할 거라 하네
서로를 등지고 뛰어갔던 그 길에서 여기까지밖에
못 왔구나 서로 뜻밖의 사람이 되었어 넌 내 곁을 떠
나 붉게 물든 침대보 같은 석양으로 걸어가네 다른
여자랑 잠자겠지 나는 쉬겠네 그림을 걸지 않은 작은
미술관처럼
그 다음으로는 이 시가 기억에 남는다.
백발의 신사
날 보러 여기까지 오다니
7, 8년 만의 동행이다
어스름한 강에서 번져오는 안개
이 사람은 폐에 생긴 병으로 죽다가 살아났는데
여전하다
조깅하는 여자 젖가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슬그머니 내 손목을 잡기에
얼른 뺀다
“돈이나 벌지, 공부해서 뭐하냐.”
“᠁᠁”
“이제 시니 뭐니 그만 써라. 그거 써서 뭐하냐.”
“᠁᠁”
“인생 별거 없더라. 쓸데없는 데 피 말리지 말고
슬렁슬렁 살아라. 듣고 있냐?”
“᠁᠁”
도망쳤겠지. 옛날 같았으면, 무슨 자격으로 간섭인
가. 아아,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쳐, 아니 도대체 누구
누구한테 잘못한 줄 알기나 하는가, 죽어버려라, 악
다구니 치면서
(생략)
어느 시대건 부모는 ‘억압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부모라는 사실 때문에,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줬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걱정한다는 사실 자체로, 가끔 부모는 억압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나도, 내 아이들에게, 그 존재만으로 이미 억압적인 존재로 실재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본다.
내가 제일 아끼는 후배한테 이 시집을 선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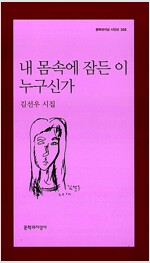
이 시집에 있는 <겨울 휴관>이라는 시가 너무 좋아, 하면서 말이다.
후배가 말했다.
언니,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게, 당연히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