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 클라우드 시리즈를 재밌게 읽고 있다. 레이먼드 카버, 페소아, 페르메이르, 아리스토텔레스, 카뮈, 가와바타 야스나리 등을 완독했거나 읽고 있는 중이다. 무슨 책을 읽을까 고민이 되거나 딱히 눈에 들어오는 책이 없을 때 제격인 시리즈이다. 한 인물에 빠진 저자를 따라 책에 몰입하다보면 이 유명하신 분들의 인생에 좀 더 밀착된 느낌이랄까. 진한 국물맛 같은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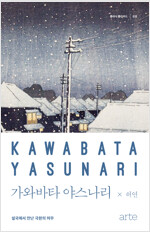
여름이면 떠오르는 <설국>. 이 소설을 쓴 가와바타 야스나리. 이 책을 읽고서야 내가 <설국>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여름이 가기 전에 다시 읽어보고 싶지만 내 마음 나도 모를 일.

<설국> 대신 읽은 <이즈의 무희>. 위의 <가와바타 야스나리>에 쓰인 줄거리를 옮겨보면,
스무 살의 주인공 '나'는 이즈반도로 여행을 떠난다. 고아 기질 때문에 뒤틀린 성격을 고치고, 태생적인 우울감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떠난 여행이었다. 이 여행에서 '나'는 우연히 유랑 극단 일행을 만나 동행하게 된다.
가족 중심으로 구성된 유랑 극단에는 열네 살 무희 가오루가 있었다. '나'는 가오루를 지켜보면서 자신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처음에는 이 소녀가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닌지 의심을 하기도 했지만 소녀의 티 없이 맑은 성정을 느끼면서 '나'의 의심과 우울감도 사라진다.
순간순간 가오루가 보여주는 '나'에 대한 작은 관심은 '나'의 일그러진 성격을 밝게 만들어주는 묘한 힘을 지니고 있다. 가오루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네"라고 '나'를 평하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치유되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어른과 어린이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둘 사이의 애틋함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가 도쿄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일행이 시모다 항구에 도착한 날 '나'는 도쿄행 배에 오른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이면서 서 있고 '나'는 선실에 누워 눈물을 흘린다. -168~169쪽
이런 줄거리 때문에 '일본판 소나기'로 부르기도 한단다. 다른 점이 있다면 <소나기>에서는 주인공들이 죽어서 이별을 하고, <이즈의 무희>에서는 살아서 이별을 한다는 것.
누구나 일생에서 한번쯤 이 <소나기> 같은 시절이 있지 않을까. 내 눈 빛과 내 마음을 읽어주는 누군가가 있어 분노와 우울로 버무려진 절박했던 시절의 강물을 가까스로 건널 수 있었던 경험 같은 거 말이다. 이 단편을 읽고나면 한동안 잠자고 있던 옛 일이 떠올라 며칠 밤 잠을 뒤척일지도 모른다. 내가 그랬다. 내 얘기도 소설감인데....엉뚱한 상상에 빠져서... 한달 넘게 이어지는 장맛비도 일조를 하고 있다.
그래도 소설이니 어떤 맛인지 맛은 봐야겠지요?
잠시 동안 낮은 목소리가 계속되고 나서 무희의 말소리가 들렸다.
"좋은 사람이야."
"그래 맞아. 좋은 사람 같아."
"정말로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라서 좋겠어."
이 말투는 단순하고도 솔직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감정의 치우침을 휙 하고 순진하게 담아 던진 목소리였다. 나 스스로도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순순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 상쾌하게 눈을 들어 밝은 산들을 바라보았다. 눈꺼풀 속이 희미하게 아팠다. 스무 살의 나는 자신의 성질이 고아 근성으로 비뚤어져 있다고 심한 반성을 거듭한 끝에, 그 숨 막히는 우울을 견디지 못하고 이즈로 여행을 온 것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보편적인 의미로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고마운 것이었다. -37~38쪽
'눈꺼풀 속이 희미하게 아팠다.' 내 심장이 희미하게 아파오는 문장이었다. 원문으로 읽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번역문으로도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섬세한 글맛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책이다. 인상 깊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