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서히 통증을 달고 살아야 하는 나이가 되고 있다. 남 얘기가 내 얘기가 되는 것, 그게 늙는 건가보다. 여기저기 아파오니까 이 병원 저 병원 탐색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건강 관련 서적에 저절로 손이 간다. 그래서 뒤적이게 된 책들.

딱히 건강 관련 서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닌 것도 아닌 책. 더구나 재밌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그 경험을 재미있게 쓴다'는 모토 아래 세계 곳곳을 누빈다는 다카노 히데유키. 그의 책 <와세다 1.5평 청춘기>를 키득거리면서 읽은 적이 있다. 그냥 키득 수준이 아니라 마음의 구름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한 책이었다. 그에 비해 이 책은 덜 유쾌하지만 통증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풀어쓰기도 쉽지 않을 터, 키득거리다보면 내 아픈 것도 잊게 된다. 게다가 집요한 병원 순례 이야기는 왠지 내 얘기 같기도 하고.
치료는 십 분도 걸리지 않았다. 일어나서 움직여 봤다.
"어떠세요?"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하기는 했지만, 나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메구로에서도 그랬지만, 치료를 받은 직후에는 끝났다는 안도감 탓인지, 아니면 치료에 대한 긴장으로 흥분된 상태여서 그런지 대개 조금은 편안해진 기분이 들곤 했다. - p.103
정형외과나 한의원에서 한 시간 넘게 걸리는 물리치료를 받고나면 꼭 저런 기분이 든다. 에휴, 아픈 얘기를 시작하면 끝도 없을 터.

장수가 재앙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연금이 더 중요하지.

뭔가 부담스러운 내용이 많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알아야 할 일, 먹어야 할 일을 많이 제시하고 있으나 그걸 일일이 지키기에는 좀 벅차다는 느낌이 든다. 주말에 티비를 보다보면 온통 건강관련 프로그램 도배에 질려버리는데 나는 또 어느새 이런 책을 손에 들고 있다. 이 책은 죄가 없는데 이런 책을 읽는 내가 좀 지겨워지는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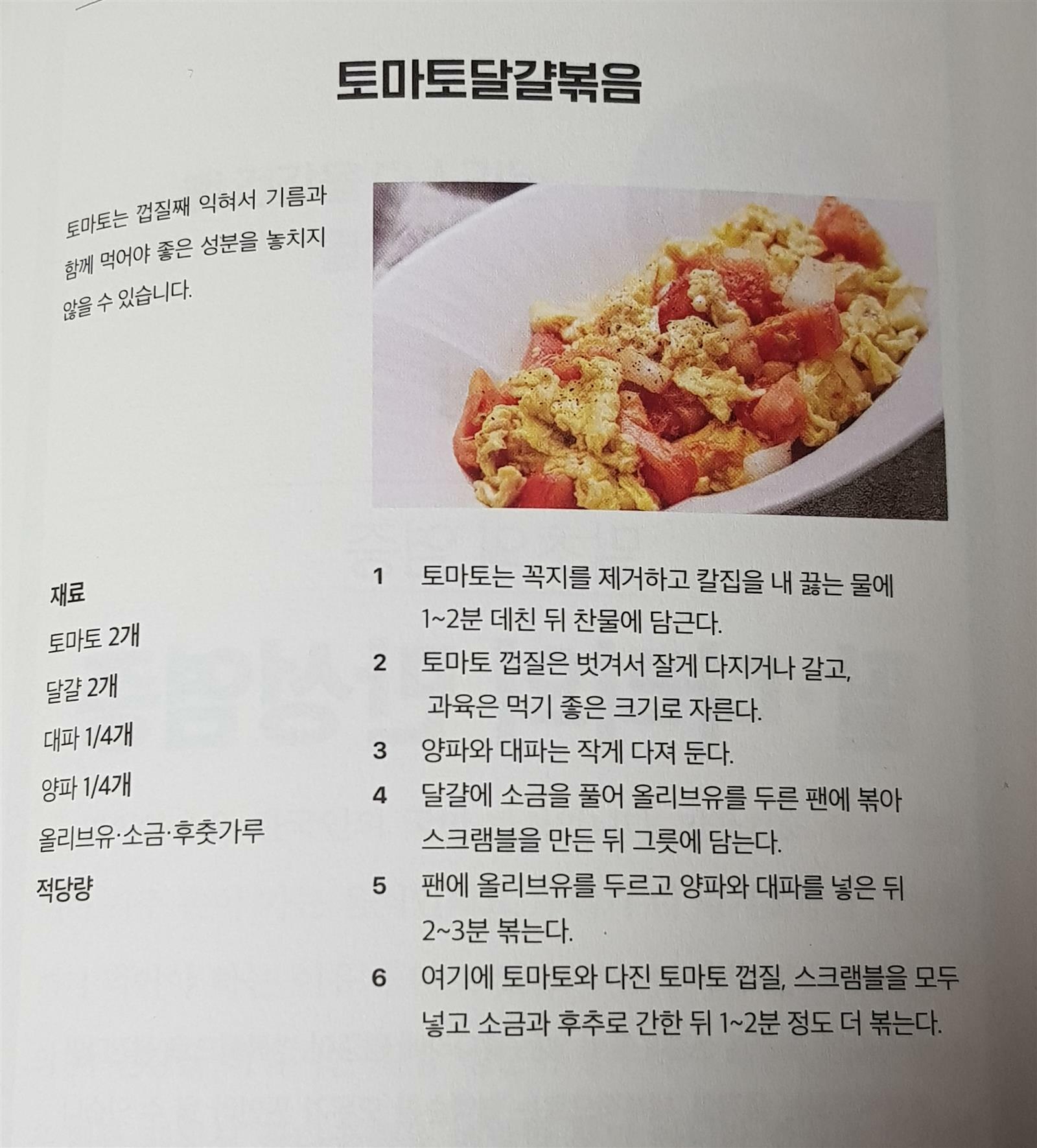
이것 하나만이라도 기억하기로 한다. 제 맛을 내려면 일단 레시피를 따라서 해야 한다는 걸 이제는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