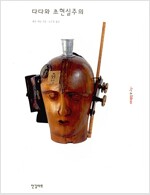
‘다다’는 ‘주의 ism’으로 제한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다’는 태생적으로 틀 안에 넣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형식 파괴와 초월적 시도들은 세계의 틀을 인식, 비판, 부정하는 의도가 있다. 굳이 다다이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정부주의적이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생겨난 ‘다다’는 대량학살을 초래한 기존체제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그룹에 의해 선언되었다.
1. 아방가르드에 존재하는 다다이즘의 뿌리
다다이스트들의 문화적 저항의 원천은 후에 모더니스트라고 규정되었던 예술가들의 제1차 세계대전 이전 활동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모더니스트들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모임인 아방가르드의 실험적인 방법들은 미술에 내재하는 전제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었다.
“아방가르드는 동일한 형태를 갖지는 않았다. 아방가르드들은 형식적·철학적·정치적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세대들은 이전 세대가 성취한 것들을 확장시켜나갔다. 대부분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모든 예술이 시대의 요구에 맞춰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믿으면서 개성적이고 실험적인 자신들만의 작품세계를 펼쳐나갔다.” (11p)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의 「봄의 제전」(Rite of Spring, 1913), 알프레드 자리(Alfred Jarry)의 「위비 왕」(Ubu Roi, 1896), 니진스키(Nijinsk)의 「목신의 오후」 발레 무대는 이 시대 전위에서 평단의 비판과 대중의 당혹스러움을 불러일으킨 폭발적 사건으로 거론된다. 기욤 아폴리네르(Gullaume Apollonaire)가 지원했던 마르셀 뒤샹, 프랑시스 피카비아와 같은 프랑스의 젊은 예술가들은 후에 ‘다다’를 주도했다. 파리 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베를린 분리파(1892), 비엔나 분리파(1897), 다리파(드레스덴 1905), 청기사파(뮌헨 1912) 등이 그 예이다.
공산주의, 무정부주의와 같은 사상과 정치 혁명, 급속한 도시화와 과학 기술의 발전도 영향을 미쳤다. 앙리 베르그송의 ‘경험의 동시성’, 지크문트의 『꿈의 해석』, 앙리 푸앵카레의 『과학과 가설』 등의 개념은 뒤샹과 같은 미술가들의 작품에 영감을 주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고, 프랑스는 이 전쟁을 프랑스 문화 수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입체주의와 독일 문화를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국제적인 아방가르드 운동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려 했고, 편리하게도 모더니즘의 모든 국면을 적군과 부합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했다.”(32p)
전쟁에 환멸을 느낀 양 진영의 예술가들은 전쟁과 징집을 피해 취리히, 뉴욕, 바르셀로나로 모여든다. 그들은 문화민족주의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고 모든 관습을 급진적으로 수정해보려는 시도를 했다.
2. 취리히 다다(1915~20)
다다가 처음 시작된 취리히는 아방가르드 운동에서는 주변에 속하는 위치였지만, 지역적 측면으로 보면 유럽의 중심부였다. 이 중립지역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다.
1916년 2월 취리히 예술가 구역인 슈피셀가스 1번지에 다다의 태동지인 카바레 볼테르(Cabaret Voltaire)가 문을 연다(취리히 다다의 핵심적 사건). 후고 발과 에미 헤닝스의 주도 아래 아르프, 트리스탄 차라, 마르셀 장코, 그리고 휠젠베크 등이 모여 그룹을 형성했다. 그들은 이 의외의 장소에서 “사상의 통합을 창조해내기 위해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한데 모았으며, 다른 곳에서라면 민족적으로 구분이 되었을 프랑스와 독일의 문화를 다다를 통해서 독특하게 혼합된 결과물로 만들었다.”(35p)
후고 발(Hugo Ball)은 칸딘스키의 영향을 받았고, 표현주의 작가였다. 그는 전쟁에 혐오감을 느끼고 베를린에서 반전운동을 하다가 징집을 피해 취리히로 떠났다. 그는 1916년 2월2일, 언론에 ‘카바레 볼테르’ 광고를 내고, ‘취리히의 젊은 예술가들’이라는 모임의 참여를 요청했다.
“카바레 볼테르라는 이름 아래 젊은 예술가와 작가들의 집단이 예술적 유희의 중심지를 만들고자 탄행했다. 매일 있을 모임에 초빙된 예술가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책을 낭독하는 것이 카바레의 취지다. 각자 추구하는 바와 상관없이 취리히의 젊은 예술가라면 누구든 모임에 참여해 모든 종류의 제안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311p 『발칙한 현대미술사』)
※카바레는 독일 망명객의 유입으로 등장한 새로운 도시생활의 형태였다.
루마니아에서 온 트리스탕 차라(Tristan Tzara)는 사미 로젠스톡(Sami Rosenstock)이라는 원래 이름 대신 ‘고향에서 슬픈’이라는 뜻의 트리스탄 차라를 가명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루마니아에서 벌어지던 유대인 차별행위에 대한 저항의 뜻을 함축하고 있었다. 차라는 마르셀 장코와 만나 발을 찾아갔다. 리하르트 휠젠베크(Richard Hülsenbeck)는 가장 나중에 가담한 카바레 초창기 멤버였다. 그는 발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요, 차라에게는 성미 급한 동반자이자 라이벌이 되었다.
‘다다’ 그 낱말은 운동이 되었다. 2월의 카바레 개장과 6월의 정기간행물 발간 사이인 4월 18일쯤 ‘다다’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으며, 이것은 모든 면에서 대표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차라는 1918년의 「다다선언」에서 “다다는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신문기사를 보면 크루족이라는 아프리카 흑인 종족이 신성하게 여기는 소의 꼬리를 ‘다다’라고 부른다. 이탈리아 일부 지방에서는 정육면체나 어머니를 다다라고 부른다. 장난감 목마나 보모를 부르는 단어도 다다이고, 러시아어와 루마니아어로 이중긍정을 할 때도 역시 다다라고 한다.”고 했다. 휠제베크는 「다다 이전: 다다이즘의 역사」(1920)라는 글에서 자신이 발과 함께 마담 르 루아(Le Roy)를 위한 예명을 구하기 위해 사전을 펼치고 그 위에다 나이프를 꽂는 단순한 방법으로 발견한 용어가 ‘다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우연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논리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다다의 대표적 특징이 되었다.
카바레 볼테르 모임의 초기 목적은 취리히에 국제적인 아방가르드를 소개하는 것이었다.
1916년 2월 5일 헤닝스, 마담 르콩트, 장코와 차라, 오펜하이머, 슬로드키, 아르프는 전시, 낭독, 연주, 노래 등 예술과 언어를 혼합한 최초 공연으로 예기치 못했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16년 5월 말, ‘볼테르 예술 협회의 성대한 저녁’ 모임에서 발의 ‘음향시’ 공연은 강한 충격을 주었다. 그 공연에서 드러난 무의성은 인습에 대항하는 무기가 되었으며, 승인된 가치들의 전면적 개정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공연에 담긴 부조리와 무의미성은 알프레드 자리의 <위비왕 Ubu Roi>을 소환한다.

한스 아르프(Hans Arp)의 콜라주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것은 우연의 법칙에 따라서 만든 작품들이다. 이 우연은 판단력이나 솜씨가 배제된 더욱 자유롭고 암시적인 방법인, ‘다다’의 가장 순수하고도 도발적인 ‘반예술’ 행위였다. ‘다다’는 우연에 근거한 새로운 체계를 구상할 것을 제안했다.
3. 다른 중립도시에서의 다다 1915~21
뒤샹(Henri-Robert-Marcel Duchamp 1887 ~ 1968)은 이 우연의 법칙을 잘 사용한 작가이다.

“그는 1미터의 실을 1미터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그 굽어진 결과를 거대한 유리의 한 부분을 구성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했다. 이러한 실험을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세 개의 표준 척도」(1913~14)가 제작되었다. 3년 뒤, 아르프가 시도한 우연의 법칙에 따라 배열한 사각형이 잇는 콜라주에서 시도한 것과 같은 기법이었다.”
(321p 『발칙한 현대 미술사』)
1916년 뒤샹은 ‘레디메이드(Readymade)’를 고안한다. 대량 생산된 상업적 물건이 단순히 ‘예술가의 선택을 통해서’ 이름을 붙이고 예술가가 서명하는 작업으로만 이루어지는 예술창조의 개념은 뒤샹이 예술의 근본적인 토대에 도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의 우연, 레디메이드, 명명, 서명 작업은 개념미술의 장을 열었다.

프란시스 피카비아(Francis Picabia)은 1910년 뉴욕에서 마르셀 뒤샹과 만나게 됨으로써 결정적인 ‘반(反) 예술’의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뉴욕에서 영감을 얻은 피카비아는 파리로 돌아와서 거대한 캔버스에 <난 나의 우드니를 추억속에서 다시 보네>를 제작했다. 이 제목은 미국 출신의 무용가였던 이사도라 덩컨을 연상하면서 힌트를 얻은 것이지만 (그녀의 이니셜과 ‘누드’의 ‘nue’를 합쳐서 ‘우드니’(Udnie)를 만듬), 인물에 대한 형태적인 암시는 사라지고 추상적인 기체 형태만이 보일 뿐이다.

1917년, 군복무를 피하기 위해 파리를 떠났던 피카비아와 뒤샹은 ‘뉴욕 다다’ 운동을 일으켰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다다와 관련된 여러 발전들이 있었다. 멕시코시티에서, 시인 마뉴엘 마플레스 아르체에 의해 1921년 12월에 ‘에스트리덴티스모’ 운동이 시작되었다.
바르셀로나는 취리히, 뉴욕과 함께 다다 운동의 3대 주요 중심지로 인식되었다. 풍부한 문화의 도시인 바르셀로나는 예술의 중심도시로서 마드리드와 견줄만했으며, 파리와 유럽으로 통하는 스페인의 관문 역할을 하는 그 위치는 다른 곳과 비할 데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1915년 말과 1916년, 유럽 다른 지역에 있던 예술가들은 전쟁을 피해 바르셀로나로 이주했다. 그들은 입체주의 주변부에 머물던 사람들과 함께 다소 자유로운 그룹을 구성했다. 피카비아는 부인 뷔페와 함께 1916년 8월에 뉴욕으로부터 와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간행물 『391』을 발행, 4호까지의 초판에서 바르셀로나 다다이스트들의 활동을 주요기사로 다루었다.
4. 중부유럽의 다다 1917~22
독일의 다다운동은, 전쟁 이전부터 이미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1918년 초 베를린 다다이즘이 등장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과 1918년 베를린 폭동과 종전이라는 역사적 배경 하에서 다다이스트들은 거의 좌익 혁명가들과 같았고, 그들의 활동은 개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아나키즘에 가까웠다.
정치가들은 다다를 진지하게 여기기 어려웠고, 표현주의에 지배되고 있던 아방가르드 예술가들 또한 다다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휠젠베크는 1918년 2월 노이만 갤러리에서 열린 예술가의 저녁모임에서 베를린 다다를 출범시켰다. 그해 4월 발족한 ‘클럽 다다’에는 발터 멜, 프란츠 융, 게르하르트 프라이스드 형제 등의 작가와 그로스, 요하네스 바더, 한나 회흐, 라울 하우스만 등의 미술가들이 있었다.

1920년대 베를린 다다와 관련된 예술가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인물로 쿠르트 슈비터스가 있다. ‘폭풍’ 그룹에서 활동했던 그는 홀로 표현주의 화가 겸 시인으로 성장했으며, 1918년 하우스만과 회흐를 만난 이후 콜라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베를린에서는 포토몽타주, 쾰른에서는 인쇄 교정쇄가 사용되었다면, 슈비터스는 버려진 종이 쓰레기를 사용했다.
5. 파리 다다 1919~24
전후의 정치적 현실로 인해 파리에 ‘다다’가 정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침략전쟁을 반대해왔던 대부분의 독일 아방가르드들은 패전과 더불어 혁명적인 사회변화를 추구한 반면, 애국적이고 방어적인 전쟁을 지원했던 거의 대다수의 프랑스 아방가르드들은 전승과 함께 보수주의 문화를 옹호하는 경향과 만났게 되었다. 하지만 ‘다다’는 재건이 아니라 혼돈을 선호했고, 전통이 아니라 기존체제의 모든 것을 파괴하기를 원했으며, 민족적 정체성 대신 코민테른에 정치적 공감을 표시하였다. ‘다다’는 프랑스의 고급예술 전통이 타협하지 않았던 역동적인 대중문화 속에서 그 지지요소를 발견했다.
이전부터 ‘다다’운동에 가담했던 예술가들 중에서 처음으로 파리에 영향을 끼친 인물은 피카비아로, 그는 1919년 10일 파리에 도착했다. 1920년 1월19일 차라가 파리에 도착하자 피카비아와 그 동료들은 예비단계를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다. 피카비아와 차라를 중심으로 ‘다다’는 분열한다. 한편, ‘다다’는 무정부주의적 파괴로서 정체성을 지속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러한 입장은 청중을 끊임없이 흥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1922년 다다는 분열했고, 브르통은 「리테라튀르」 4월호에 실린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글을 통해 다다와의 결별을 선언한다.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다다를 떠나라. 당신의 아내를 떠나라. 당신의 애인을 떠나라. 당신의 희망과 당신의 두려움을 떠나라. 당신의 아이들을 숲속에 버려라. 그림자의 실체를 떠나라. 당신의 편안한 삶을 떠나라. 미래를 위한 것을 버려라. 그러한 길 위에서부터 출발하라.”(201p)
‘다다’의 해체 과정을 읽고나면, 브르통이 떠나라는 아내, 애인, 희망, 두려움, 아이들……등이 ‘다다’를 가리키는 ‘메타포’였음을 알게된다. 앙드레 브르통의 『초현실주의 선언』을 읽으려면 ‘다다’를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시도가 무모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은 5장까지 ‘다다’를 다루고 있다. 그 생성과 역사를 취리히, 뉴욕, 베를린, 뮌헨, 쾰른, 바르셀로나, 파리의 ‘다다’로 지역별로 설명하고 있다. 작가별로 설명하는 것보다 ‘다다’에 더 어울리고, 이해도 잘 되는 분류법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쟁은 유럽 각국의 예술가들이 취리히, 뉴욕, 바르셀로나 등지로 흩어져 모이게 했고, 다국적 예술가들은 그 도시에서 마주치고 예술 그룹을 생성했다. 전쟁터에서 멀고 가까움에 따라 그들의 활동은 선언과 의도된 행위 또는 우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은 다시 파리나 베를린 등으로 돌아가 생성과 분열을 일으키며, 새로운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섰다. ‘다다’는 ‘주의’보다는 에너지, 운동, 흐름이라는 생각이다.
알프레드 자리의 『위비왕』, 당시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친 칸딘스키의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뒤샹 작품 해설집 『마르셀 뒤샹』을 참고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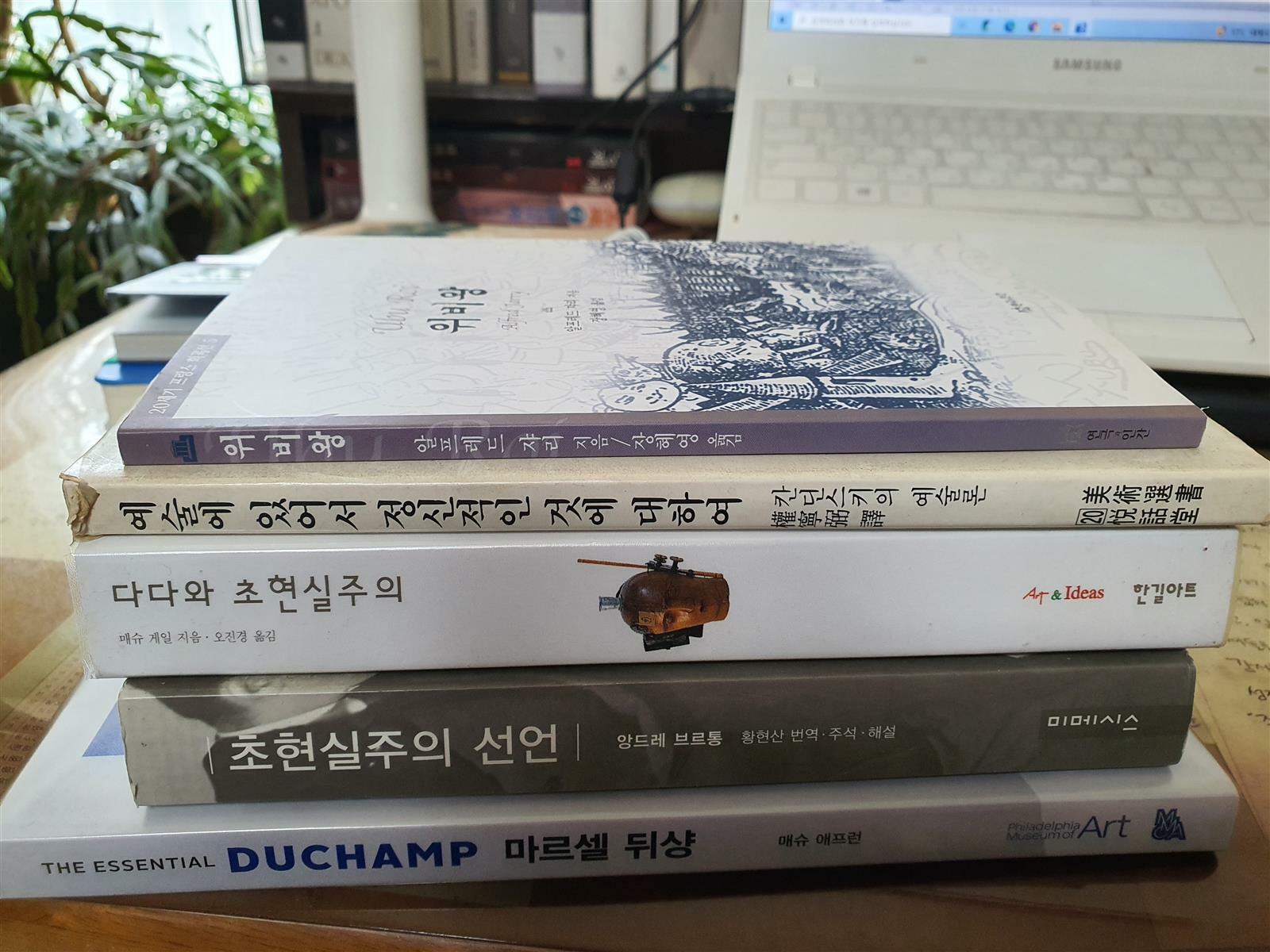
그리고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의 「봄의 제전」(Rite of Spring, 1913)과 니진스키의 발레를 찾아 감상했다. 안으로 향한 발끝, 뒤틀린 몸 선은 아름다움의 전제를 부수는 몸짓이었다.
6장부터 이어지는 초현실 주의를 위해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