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의 남자
임경선 지음 / 예담 / 2016년 3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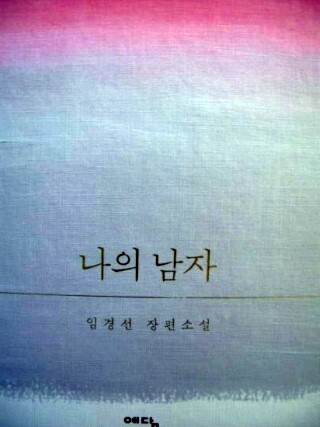
『나의 남자』는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드는 제목이다. 책은 작가로 변신해
조금씩 인지도를 쌓아가고 있는 서른일곱 살의 여성 소설가 한지운이 주인공이다. 그녀에겐 곧 경력 20년차가 되는 남편과 유치원에 다니는 남자
아이가 있는 주부이자 아내이자 엄마이기도 하다.
곧 결혼 10주년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그녀에게 있어 결혼 생활이란 다음 날 가족이 먹을
신선한 아침 국을 매일 끓이는 일(p.23) 이다. 그런 지운은 한 선배의 수상을 축하하는 모임에서 돌아오다 비를 만난다.
그런 그녀가 따뜻하고 은은한 분위기의 커피점을 발견하게 되건 우산이 없어 택시를 타기 위해
걷던 길에서의 우연과도 같은 일이였다. 필립 로스의 『네메시르』를 읽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을 지켜보다 눈이 마주치고 그렇게 다시 자신의 길을
가는 지운에게 남자는 한눈에 봐도 고급스러워보이는 장우산을 자신은 비를 맞아가며 건낸다.
그렇게 잠깐 일탈과도 같은 만남을 뒤로 하고 남편과 아이가 있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또
그렇게 다음날 아침에 먹을 국을 끓인다.
그저 빌린 우산을 돌려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찾아간 카페. 그곳은 그 남자가 홀로 꾸려가고
있는 곳으로 그동안 글이 써지지 않아 고민하던 지운은 그곳에서 집중력을 보이며 점차 카페로 출근해 글 쓰는 일에 몰두한다.
하루 하루의 시간이 늘어갈수록 카페를 찾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 남자의 이름이
성현이라는 것과 자신보다 다섯살 많고 이혼을 하고 한 직장만을 다니다 은퇴하고 일정한 시간에 오픈하고 마감하는 카페 일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
어느 날 점심을 함께 먹자는 남자의 제안에 밥 한 그릇을 담아 함께 식사를 하고 점차 두
사람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주고 받게 되면서 지운은 자신이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가 아닌 한 여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남편과의 관계는 마치 인생의 파트너 같아 서로의 일에 크게 관여하지도 않고 부부관계도 그녀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남편은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산 노부부처럼 둘은 그렇게 살아가던 중이였고 그런 평범한 나날들에 성현은 그녀로 하여금 낯선
질투와 여자로서의 행복감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지운의 모습은 명백한 일탈이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절대 해서는 안되는 그런 부도덕한 일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운은 '이 남자의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서로의 마음은 더욱 커져간다.
이런 지운에게서 기자인 남편은 무엇인가를 감지한다. 그리고 지운 역시도 자신의 상황을
자각한다. 그러나 한 달간의 폴란드 연수 출국 날 결국 그녀는 공항이 아닌 카페로 가게 되는데...
전형적인 통속소설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게 사실이다. 사회통념상 성현과 지운의 진심은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나의 남자』라는 제목에는 성현이 먼저 떠오르는게 사실이다. 그녀의 이런 일탈과도 같은 사랑이 끝내 어떤
결실을 맺었을지는 모른다.
작가는 그저 폴란드에서 돌아 온 그녀가 예전처럼, 어쩌면 새로운 소설 구상을 하고 글을 쓰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돌아온 편안하고 행복한 모습과 역시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성현의 모습을 더 비추면서 끝날 뿐이다.
그녀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을지는 그저 독자의 상상에 맡겨야 할 것이다. 결혼 후 찾아온
사랑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녀의 새로운 사랑이 마냥 행복감으로 비춰질 수 없다는 것만은 알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