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을 하나 이상 낳아만 준다면 김훈장은 날로 퇴락해가는 집만 남아 있는 김진사댁의 대도 이어줄 생각이었다. 생각이라기보다 간절한 희망이었다. 마음을 놓아서였던지 며느리를 본 후 김훈장은 며칠을 앓았고 앓고 난 뒤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더욱더 희어졌다. _ 박경리, <토지 4> , p21/672
<토지 4>의 처음은 러일전쟁(日露戰爭, Russo-Japanese War 1904 ~ 1905)이라는 상황을 바라보는 김훈장과 조준구의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유학(儒學)을 따르며 위정척사(衛正斥邪)를 위해 노력하는 김훈장과 어른 없는 최참판댁 자산을 노리는데 여념이 없는 조준구. 이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당대 지배층들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이들 중 김훈장을 살펴보자. <토지인물사전>에 '봉건제적 질서에 충실한 보수주의자'로 설명된 김훈장. 가문의 후사를 이어야한다는 그의 강박관념은 당시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신유학(新儒學) - 성리학(性理學)'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대해, 마르티나 도이힐러(Martina Deuchler, 1935 ~ ) 는 <한국의 유교화 과정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에서 '신유학' 이데올로기는 한국 사회가 부계 중심 사회로 개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지적한다. 장자(長子) 중심의 승계는 얼핏 유럽 중세의 봉건제도와 연계점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유럽에서는 차남(次男) 이하 다른 자녀들은 성직자, 기사 등 다른 직업으로 진출한 데 반해 조선 시대의 엘리트 층은 그렇지 않았다는 점에서 같은 듯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資本主義'와 관련한 다른 페이퍼에서 다루도록 하고 일단 넘기자.
장자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아버지와 아버지 쪽 조상과 연결되었다. 다시 말해서 장자만이 선조들의 유일한 후사로서 후손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권리와 의무를 받는 '정체 正體'를 가졌던 것이다. 장자는 형제자매 집단을 대표하면서 세대를 잇는 이상적인 고리로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며, 이것은 장자가 법적, 의례적, 경제적으로 우위에 놓이도록 만들었다. 이 같은 장자의 모습이 완전히 드러난 것은 17세기이다. 이것은 이상사회에 대한 주자의 개념을 기초로 한 부계친 사고의 절정을 나타낸 것이다. _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 과정> , p241

<토지 4>에서 김훈장은 가문을 잇는다는 가문의 책무를 완수한 후 자신의 시선을 비로소 나라로 돌린다. 이러한 그의 행동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작품 안에서 김훈장은 어느정도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그는 지배 엘리트 층으로서 문제를 자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그의 모습이 오롯이 우국충정(憂國衷情)의 붉은 마음(丹心) 때문일까. 김훈장의 처지를 생각하면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힘들다.
"나라나 한 집안이 망하고 흥하는 것은 천운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인화가 없고 신의가 없고 예절을 잃으면 그것으로써 마지막이야. 지금 나라 꼴이 어떠한가? 동가숙서가식하는 천기보다 못한 지조 잃은 인사들이 황공하게도 임금을 볼모로 삼아서 오늘은 아라사요 내일은 왜국이요, 해서 자신의 영달에만 급급하니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느냐.(p22)... 가통을 이어야 한다는 골수에 박힌 사상은 이 나라의 꽃이요 정기요 하며 의병의 항쟁을 흐느끼듯 칭송해 마지않던 감정을 누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p25)... 가통을 잇는다는 집념과 정열의 성취를 본 지금, 이제 그 정열과 집념은 갈 곳이 없게 되었다. 아니 갈 곳이 없다기보다 차디찬 재로 변해버린 것이다. _ 박경리, <토지 4> , p31/672
마르티나 도이힐러는 다른 책 <조상의 눈 아래에서 Under the Ancestors' Eyes: Kinship, Status, and Locality in Premodern Korea>에서 향촌의 양반인 향반(鄕班)이 지방에서 영향력 유지를 위해 종법(種法)에 기초한 네트워크가 구성되었음을 말한다. 중앙의 정치권력에 대항하는 사회권력으로서 향약(鄕約)에 근거한 김훈장의 힘은 바로 지방민들의 지지와 존경으로부터 나왔기에 '평사리의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기 위해서 그는 움직여야만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유의 친족 이데올로기는 신분의 위계와 신분의 배타성을 찬미하면서 운명의 붉은 실처럼 신라 초부터 19세기 말에 이르는 한국의 역사를 관통했다. 사회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보다 우선시함으로써, 이 이데올로기는 출생과 출계를 기반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를 창출했고, 엘리트에게 시공을 초월하는 엄청난 내구력을 부여했다._ 마르티나 도이힐러, <조상의 눈 아래에서>, p727
한편으로는 중앙으로부터 갈수록 소외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능하지만 결코 간섭을 멈추지 않는 국가의 압력에 시달리면서 엘리트 신분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자, '향촌의 양반(향반 鄕班)'은 점차 '지역주의 전략'에 기대어 본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향촌 지배권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그들이 구사한 가장 효과적인 장기 전략은 종족제도의 체계화와 강화였고, 이 제도는 17세기에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_ 마르티나 도이힐러, <조상의 눈 아래에서>, p473
<토지>저자 박경리(朴景利, 1926 ~ 2008)는 당대 서민들의 생각이 동학(東學) 사상에 잘 드러난다고 본다. 동학농민혁명에 드러난 민의(民意)는 동학교도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이러한 작가의 생각은 동학농민혁명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로부터 대표성을, 표영삼(1925 ~ 2008)의 <동학>에 나타난 일본상려관에게 보낸 글을 통해 도덕성과 반외세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전자는 무위하고 후자는 종양(腫瘍)으로써 왕실 붕괴, 국가 파탄의 촉진제가 될 것이지만 수구 사상에서는 정예한 근위병(近衛兵)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 두 줄기를 타고 뻗어난 들판, 그 들판을 메운 서민들은 어떠했을까. 한마디로 이들은 모두 수구파다. 수만 동학이 개혁을 부르짖고 일어섰으나 시초부터 그들은 인륜 도덕을 강렬하게 내포한 집단이었으며 그들의 기치는 위국진충(爲國盡忠)이며 소파왜양(掃破倭洋)이었던 것이다. _ 박경리, <토지 4> , p75/522


일본 상려관은 펴보아라... 천도란 지극히 공평하여 다만 착한 사람은 음덕이 있게 하고 악한 사람은 벌이 있게 했다. 너희들은 비록 변경에 살고 있으나 받은 성품은 하나의 이치임을 또한 알지 못하는가... 아직도 욕심 많은 마음으로 다른 나라에 자리잡고 앉아 공격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으며 살육을 근본으로 삼으니 진실로 어떤 마음이며 필경 어찌 하자는 것인가... 우리 스승님의 덕은 넓고도 가없어 너희들에게도 구제의 길을 베풀 수 있으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듣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우리를 해칠 것인가 아니 해칠 것인가... 스승님은 이미 훈계하였으니 평안하고 위태로움은 너희들이 자취하는 것인 바 죽도록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우리는 다시 말하지 않으리니 서둘러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계사 3월 초2일 자시 조선국 삼사원우초 _ 표영삼, <동학 2>, p276




인내천(人乃天)에 기반한 반외세(反外勢)를 주창한 동학농민혁명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삼대조(三代祖)가 미관밀직에 있었으며, 등과를 못한 향반으로 살아가야 했던 김훈장은 마을에 연고가 없는 경화사족(京華士族)인 조준구와는 달리 앞장서 움직여야할 이유가 있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 자신의 지지 기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이러한 이유가 김훈장을 의병장으로 떠밀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 ~ 1598) 당시의 양반 출산 의병장들의 동기도 이같은 요인이 부분적으로는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
어느 덧 김훈장은 마을 사람들 이야기 속에서 의병장으로 등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츰 전설적인 인물로 변모되어 가고 있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 자신의 자존심의 소이였다. 왕시, 김훈장을 두고 화심리에 사는 장암 선생 수제자로서 학식이 깊다고 믿었으며 자랑으로 생각했던 그 심리와 흡사했던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마을 사람의 공통 심리였다. 꼭히 믿는 것도 아니면서 즐거움을 위해 믿어보는 것이다. 희망이 적은 그들의 감정적 사치였을 것이다. _ 박경리, <토지 4> , p245/522
작가는 작품 안에서 지배층의 두 움직임 수구(守舊)와 개화(開化) 모두를 비판한다. 김훈장으로 대표되는 전자의 움직임은 물론, 조선 후기의 변혁 움직임 역시 제대로 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허둥대다가 무너지고 말았음을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적으로 비판한다. 작품 안에서 작가의 목소리는 한 인물을 지적한다. 반계 유형원.
중국의 정신문화, 그 속에서도 유교를, 유교 중에서도 철학과 인륜 도덕의 정주학(程朱學)을 숭상하였던 이조 오백 년 동안 그 이지적이며 귀족적인 사상을 골육으로 한 절도 높은 선비들과 왕실에 밀착된 명문 거족들은 기존의 정신적 가치를 옹호하며 또는 외향적 기득권을 주장하며 지금도 수구(守舊)를 고집하고 있거니와 그것은 참으로 부수기 어려운 거대하고 준엄한 조선의 산맥 그 자체는 아니었는지. _ 박경리, <토지 4> , p73/522
하기는 햇볕 안 드는 뒷방에는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을 시조로 하는 경세학파(經世學派)의 불우한 사류(士類)들과 현실적인 중인 계급의 일부가 있어 진실한 개화에의 꿈을 기르고 있었으나 이네들은 일본을 업고 재주를 부리는 정치적 무대도 능력도 없었으며 민주주의라는 낯선 장단에 춤을 추며 백성들을 모아보는 주변도 없었고 청나라가 일본에 패한 후 수구파들이 열어놓은 혈로(血路) 아라사에게도 줄이 닿지는 않았다. 말하자면 이네들은 조선의 토종이었던 것이다. _ 박경리, <토지 4> , p76/522
작품 안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인물은 유형원(柳馨遠, 1622 ~ 1673)이다. 조선 후기 반계의 경세사상(經世思想)이 갖는 한계점을 작가는 지나가듯 말했지만, 제임스 버나드 팔레 (James Bernard Palais, 1934 ~ 2006)의 <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 - 유형원과 조선 후기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Yu Hyongwon and the Late Choson Dynasty>에 의하면 그 영향력은 스치듯 지나갈만한 것은 아니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중국(中國)을 중심으로 한 중화(中華)사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 청일전쟁 후 방향성을 잃었지만, 도덕성에 근거한 윤리사상은 조선 후기 변화되는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진지하게 모색했다는 점을 말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토지>에 드러난 박경리 작가의 비판은 다소 매섭게도 느껴진다.



유교적 경세사상은 정책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도덕성을 강조한 그 논리는 국가가 인간의 약점, 부패, 부도덕으로 악화되었을 때도 영향력을 잃지 않았다. 유교의 기준에 따른 도덕적 질서를 창출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유지됐다. 농업의 우위와 상업 및 이익 동기의 비도덕적 결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중요하게 간주됐지만, 유교적 관원과 학자들은 경제적 활동의 어떤 이점을 인식했다.... 경세사상의 중심은 중국 고전에 서술된 중국 고대의 제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현실적 경세론의 실천에서 주요한 지혜의 원천은 중국의 역사와 제도를 서술한 방대한 방대한 문헌이었으며 조선의 안전을 유지한 주요한 버팀목은 1894년 청일전쟁까지 청이 제공한 보호였다. _ 제임스 B. 팔레, <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 - 유형원과 조선후기 2> , p589

이와 함께 <토지 4>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배경은 러일전쟁이다. 청일전쟁 후 대만과 요동반도를 점령하려던 일본의 계획이 삼국간섭(三國干涉 Tripartite Intervention)이 무산되면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대화 속에서 설명된다. 1885년 영국이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 점거한 거문도 사건(巨文島事件)에서 드러나듯, 극동지역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영국-일본 동맹은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의 일부였으며, 삼국간섭이 전쟁의 한 동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다만, 당시 일본이 러시아보다 한 수 아래의 전력으로 여겨졌던 만큼 전쟁 이전 여러 타협안이 오고 갔음을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1938 ~ )의 <러일전쟁 : 기원과 개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어주기로 한 청나라 얼빠진 위정자들은 차치하고 늑대같이 한반도도 먹고 싶고 만주 땅도 먹고 싶고, 그도 유유자적하게 노리고 있던 아라사가 어찌 되었겠소? 그러니까 아라사는 기고만장했던 일본에게 찬물을 끼얹었던 게요. 당사자인 청나라도 아닌 아라사가 독일과 불란서라는 나라에 충동이질하여 협박을 했단 말씀이오. 아무리 일본이 전승국이라고는 하나 대국 아라사와 불란서 독일의 삼국을 상대하여 이길 재간이 있었겠소? 문명이 앞서고 신식 무기로 무장한 그네들을 말이오. 게다가 영국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부지리나 얻을까 싶어 관망하는 상태였으니 일본으로서는 눈물을 머금고 요동반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그때부터 일본은 아라사에 대해서 보복의 칼을 갈았던 게지요. _ 박경리, <토지 4> , p60/672
일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라사는 숙적이요 영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세계 각처에 저희들 식민지가 있는 만큼 아라사가 한반도로 만주로 하여 바다 쪽으로 진출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소?... 그러나 미련한 곰 같은 아라사가 그런다고 밀려나겠소? 한술 더 떴지요. 그러니까 지난 오월 우리 땅 용암포(龍岩浦)를 점거하는 사태까지 몰고 왔으니 일본이 콩 튀듯 할 수 밖에요. 이러니 일본과 아라사는 전쟁으로 판가름을 할 수." _ 박경리, <토지 4> , p66/672
러시아의 만주 지배와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상호 인정하자는 타협안이 대한제국의 중립화 정책과 부딪히면서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직전의 치열한 외교전의 상황 속에서 개항 이후 여러 외교 문서에 등장했던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조항이 얼마나 무의미한 조항이었는가를 우리는 <러일전쟁>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또한, '청일전쟁', '러일전쟁' 두 전쟁 직전에 맺은 조선과의 협약을 통해 조선의 물자, 식량 등을 마음껏 징발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그네들의 모습 속에서 '근대화 近代化'라는 껍질가 실상은 과거 무사도(武士道)가 군국주의(軍國主義)로 변신한 '제국주의 帝國主義'에 다름 아님을 실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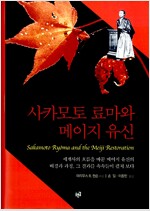

청일전쟁은 열강을 자극했다. 야심가인 신 외무장관 무라비요프도 황제의 뜻을 존중해, 러시아 해군이 원하지도 않는 부동항 뤼순, 다롄의 획득이라는 모험을 적극 시도했다.(p1195)... 일본은 러시아의 랴오둥(遼東)반도 조차(租借)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신중한 태도였다... 그러나 일본도 러시아의 만주 전면점령에 이르러서는 일본에게 조선을 전면적으로 양도하라는 만한교환론을 정면으로 제기하게 되었다. 러시아가 만주를 장악한다면 한국은 일본의 것이라고 명확하게 주장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때 한국 황제는 한국이 중립국이 되기를 희망하는 노선을 처음으로 내세우며, 일본 정부에 교섭하자고 요청했다. 1901년 1월 일본정부의 가토 외상은 주청 공사 고무라의 의견을 듣고,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고무라의 의견은 이미 단순한 만한교환론이 아니었고, 한국의 확보가 러시아의 만주 지배를 견제하는 거점이 될 것이라며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을 둘러싼 러일의 주장은 완전히 어긋나게 되었다. 이때부터 러일의 대립은 결정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_ 와다 하루키, <러일전쟁 2>, p1196
<토지 3>에서는 초반부의 주요 인물들이 한번에 퇴장하면서 작품의 전개가 빨라졌다면, 이번 주부터 들어간 <토지 4>에서는 러일전쟁 이후 을사늑약(乙巳勒約, 1905)으로 급격하게 국운(國運)이 기운다. 급류처럼 빨라진 쇠망의 역사 속에서 이와 함께 읽을 좋은 책들이 많지만, '독서 챌린지 페이퍼'라는 글의 성격 상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간다. 페이퍼에서 잠시 언급한 <한국의 유교화 과정>, <조상의 눈 아래에서>, <유교적 경세론과 조선의 제도들>, <러일전쟁>은 별도의 리뷰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이번 주 <토지 4>는 개인적으로 유교 사상에 투철한 김훈장을 통해 조선 후기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와 충효(忠孝), 반계 유형원을 통해 후기 개화 사상의 한계와 러일 전쟁의 배경 등을 정리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조준구를 통해 친일(親日)이라는 부분도 다뤄볼 수 있겠지만, 이는 후반부의 인물인 배설자와 함께 종합적으로 보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어져 다음으로 넘긴다. 어쨌든 독서 챌린지의 끝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있으니까...

Ps. 개인적으로 <토지> 후반부의 인물인 친일파 배설자의 모습에서 실존인물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 ~ 1909)의 양녀 배정자(裵貞子, 1870 ~ 1952) 그림자가 어른거림을 느낀다. 이름의 유사성, 친일 행적 등이 이러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듯한데, 배정자와 다른 배설자의 비참한 최후에서 친일파에 대한 작가의 감정을 읽는다면 지나친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