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데리러 피아노학원에 가기 전에 잠시 포털사이트를 둘러보다가 '세계문학을 안 읽어도 되는 이유'란 라디오 대담 녹취록을 읽어보았다. 김어준과 강유원의 30분짜리('배수의 진'이란 코너) '수다'를 녹취한 것인데 예전에 읽어본 '데리다를 안 읽어도 되는 이유'에 이어지는 것인 듯싶다(굳이 따지자면 '인생을 굳이 안 살아도 되는 이유' 같은 게 먼저 다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세상에 굳이 해야만 할일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더불어, 데리다 대신에 헤겔을 읽어야 한다면 독자의 부담이 덜어지는 것인가?).
그러니까 시기적으론 2004년 이맘때인 듯싶다. 방송의 성격상 '웃자고 하는 얘기'의 성격이 강하지만(대담의 타겟은 '세계문학'에 대한 부르주아적 규준과 그에 대한 조롱이다. 더불어, 속물적인 무지의 정당화에 대한 아이러니이다) 프랑코 모레티의 책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워밍업 삼아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녹취록의 문단들은 조정했지만 오자들은 따로 수정하지 않았다).

김어준/강유원 대담: "세계문학을 안 읽어도 되는 이유"
김어준 : 코드 마음에 드십니까?
강유원 : 예, 마음에 듭니다.
김 : 예 지난주엔 저희가 삶의 모두스 비벤디(피식)에 대해 얘기하면서 철학을 삼십분에 쫙 정리해버렸는데,
강 : 아 그렇죠.
김 : 이번 주는 어떤 주제입니까?

강 :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철학 책을 사서 읽는다거나 하지 마십시오. 불필요합니다. 이번 주에는 세계의 문학. 이거 스트레스 받습니다. 고전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두꺼운지. 재미도 없어요. 사람 이름도 외우기가 힘들어요. 가령 러시아 작가들은 작가 이름도 어렵고 안에 들어가 있는 주인공들 이름도 어려워요. 특히 그런 주인공들 이름얘기하면서 마치 당연히 알지 이런 식으로 말 걸 때 당혹스럽죠. 뭐냐 가령 너 라스콜리니코프적이야 이렇게 말하면, 주인공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다가(김어준 폭소) 그녀석이 어쨌다는 건지 난감한데, 그러면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김 : 당연히 안다는 듯한 표정으로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강 : 일단 세계문학 주제가 되잖아요, 그럼 아무 소리도 말고 가만있어야 합니다.
김 : 가장 좋은 방법은 가만히 있는다.
강 : 가만히 살살 웃다가 가끔 한번씩 호탕하게 웃어줘야 돼요. 한번씩 호탕하게. 그러면 사람들이 뭐가 있는 줄 알거거든요.
김 : 그렇죠.


강 : 세계문학의 본질에 대해서 들어가면, 일단 문학에 대해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청취자 여러분께서 아시고 계셔야 되는 게, 문학 이전에 책, 책에 대해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책을 많이 읽으면 유식해진다거나 책 많이 읽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거나(하하하) 혹은 책이 사람을 만든다거나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런 표현 있죠? 이거 일단 버리셔야 돼요.
김 : 책을 많이 읽으면 유식해진다.
강 : 예.
김 : 책을 안 읽으면 무식해진다 이런 생각 버려야한다?
강 : 예. 안 버리면 영 괴롭습니다. 그게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구가 한 육십억 쯤 되죠. 그 인구 육십억 책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일억도 안 되죠.
김: 아, 그래요?
강: 그렇죠, 1억도 안 되죠. 지금 우리 주변에 책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꼽아보면 몇 명도 안돼요. 제가 직접 책을 읽고 쓰고 하니까, 제 형제들이 있는데 남동생만 둘이 있거든요, 제 형제들이 다 열심히 책 읽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제가 작년 가을에 무슨 책을 하나 냈는데 책 표지가 노랬습니다. 제 동생이 와서 하는 말이 ‘어 형 책 냈네? 책표지 노랗고 이쁜데?’ 그러고 가더라고요. (김어준 폭소)

김 : 하하하. 책 표지 노랗고 이쁜데.
강 : 네. 이 정도니까 제가 제 동생을 비난할 수 없어요. 훌륭함의 정도는 저보다 제 동생이 나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책 얘기가 나오면 이 대사를 알려드리자면, 우선 책의 본질부터 따져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김 : (아하하) 세계문학을 논하기 이전에 책의 본질에 대해 알아봐야 하지 않나. 세계문학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면.
강 : 예.
김 : 여기서 우선 기선제압용 맨트를.
강 : 네. 세계문학 하면 사람들이 하아~. 이번에 오스트리아에서 무슨 노벨문학상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스트리아에서 누가 있는지 알게 뭐에요. (훗훗훗)모르죠. 모르죠. 모르니까 우리 오스트리아 하면 아는게 모차르트밖에 없어요. 모차르트는 알고 있을 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우선 생각하시면 돼요. 책의 본질부터 따져봐야 하지 않나.
김 : (배경음 깔리듯)기선제압용 맨트 나왔습니다, 책의 본질부터 따져봐야 하지 않나.
강 :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 책 읽는 사람 몇 안돼. 이러면 사람들 다 숙연해집니다(아하하). 50억 넘는 인간 중에 책 읽는 사람 1억인데 우리가 나머지 49억에 속한다고 해서 인생살이 괴로운 거 아니다. 거기다 덧붙이면, 인류가 생겨난 이래 책 읽은 사람이 몇 명이겠냐. (와하하) 숫자로 확 밀어붙이면요, 세계문학은 커녕 아무 책도 읽지 않아도 괜찮다는 그런 판단이 딱 깔리고 들어갑니다. 일단 이렇게 최저의 경계선을 밑으로 낮추어야 돼요. 낮추면은 사람들이 어 하거든요. 이때 세계문학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도 책 좀 들여다 봤지만, (조그맣게) 열 권도 안 될지라도, 책 좀 들여다 봤지만 하면 본 것 같아요.
김 : 리드가 들어갔으니까,
강 : 끄트머리에 만으로 끝나는 문장 있죠, 이게 상대방에게 기죽이기 아주 좋아요. 가령, 이거는 직장생활하는 약간의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직장 상사가 어이 강유원 씨 왜 이따위로밖에 못해 이러면, 열심히 했습니다만... 하고 계속 이렇게 만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말이 끝난 것 같기도 하면서 끝나지 않은 것도 같기도 하면서 계속 그러거든요. (하하하) 그럼 왜 이따위로밖에 못해 이러면, 계속 잘 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가령 메신저로 채팅을 할 때도,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하다가 알고 있습니다만, 만... 하면서 마침표 치지 않고 있으면, 상대방이 말을 안 해요. (아하하하) 그러니까 책에 대해서 말을 할 때도, 책을 좀 들여다봤습니다만, 이러면 사람들이 조용하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돼요. (대폭소) 그럼 저쪽에서 무슨 말로 상대해야 할지 굉장히 아리까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세계문학의 본질에 대해서,
김 : 책의 본질에 대해선 아까 얘기했으니까, 나도 책 좀 읽어봤습니다만.
강 : 세계문학이라는 건 사실은, 이때 단어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데올로기 이거 외우세요. (웃음)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스펠링 모르셔도 돼요. 굳이 말한다고 해도, 우리말로 다섯 글자 세 글자니까.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 세계문학이라는 게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의 산물 아닌가.
김 : (웃음) 키 문장 나왔습니다. 기선제압 문장 나왔고, 리드 문장, 책을 들여다봤지만, 핵심 문장, 세계문학이라는게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의 산물 아닌가.
강 :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그렇게 하면요, 약 1분 정도 분석을 해줘야 하거든요. 지금 세계문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죄다 잘산다는 나라의 문학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의 산물이라는 게 바로 서포팅 돼요.
김 : 혹시 간혹 가다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는.
강 : 또 이렇게 하죠. 세상을 사는 기본 단어가 안 들어있네. 이데올로기, 몰라? 허위의식. 딱 이렇게 하고, 헤게모니, 주도권. 단어 뜻 많이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외우는 사람도 힘드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이 많으면요, 상대방이 이 사람이 아는 게 적어서 변명이 많다 이런 식으로 알거든요. 딱 잘라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핵심단어들은. 세계문학이라는 게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의 산물 아닌가. 이데올로기라는 게 뭡니까, 이러면 이 사람, 쯧쯧쯧 이렇게 나가면서, 헤게모니라는 단어 알고 있어? 이렇게. 그 두 개의 단어를 갔다가 상대를 누르면은, 그게 중요하거든요.
김 : 자, 핵심 문장 하나 나왔고요.
강 : 그렇게 해서 내가 보기에는 세계문학 그래도 읽어야 한다면 말이지.
김 : 아 그 다음은.
강 : 그래도 읽어야 한다면 말이지, 이렇게,
김 : 네.
강 : 주요 강대국들의 작품이 빤하긴 하지만, (아하하) 그 동안 거론됐던 세계문학 많거든요. 보봐리 부인이니 그런 것들 많은데, 그런 건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읽을 필요 없거든요. 읽어봐야 되게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읽다보면 짜증이나요. 우리가 그 분야에 불어불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다니는 사람 아니니까, 세익스피어의 햄릿같은게 세계문학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델로 멕베스 이런거, 그런데 읽어보면 오바된 문장이 많아요. 그 시대하고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읽다보면 짜증이 나는데 이런 문장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도움도 안 되는데, 그런 걸 거론하면요 대화 상대방중에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상세하게 분석 들어가면 우리, 우리 수준에서는, 그렇죠 우리 수준에서는 안 되는거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도 없다고 생각할 만하지만 누구나 다 읽었을법하지만 나도 한번 읽었을 것들. 미국의 세계문학 작품, 톰 소여의 모험. 톰 소여의 모험. 네 이거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거 애들 동화책 아니에요. 동화책이 이게 원래 동화책이 아냐.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등장하는 톰 소여라던가 허클베리 핀이라던가. 그 다음에 페인트칠하는 장면들 흑인들 이런게 나오니까, 이게 미국사회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준 작품이기 때문에, 톰 소여의 모험, 이 정도만 읽어도 세계문학입니다. 톰 소여의 모험. 네. 이거 하나면 됩니다. 마크 트웨인.
김 : 마크 트웨인.
강 : 톰 소여의 모험.
김 : 톰 소여의 모험.
강 :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가 역사가 짧기 때문에요, 문학이라는 게 없어요,
짜잘한 나라거든요 사실. (아하하) 인류의 역사에서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이 세계사에 편입되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되거든요.
김 : 그렇죠.

강 : 2,300년밖에 안된 나라에 무슨 문학이야? 미국이라는 나라의 영어라는 게 네이티브 언어가 아니거든요. 고유 언어가 아니잖습니까. 미국, 마크 트웨인, 톰 소여의 모험. 이거 하나 딱 기억해주시고요. 영국, 그럼 찰스 디킨스 아닙니까, 올리버 트위스트 다 읽었죠! 이거 세계문학입니다. (조용히 김어준이 ‘나는 안 읽었다’고 언급한 듯한 분위기에서)이게 세계문학인가 하면서 올리버 트위스트 안 읽어본 사람 있으면, 안 읽어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외우시면 돼요. 영국, 영국 하면 우리가 먼저 떠올리는 게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기에 사회 계급적 문제를 드러낸 작품이거든요, 올리버 트위스트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산업혁명 계급문제 올리버 트위스트. 그렇죠. 이건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영국 산업혁명 계급문제 올리버 트위스트. 이제 됐습니다. 그런데 3대 강국에 또 프랑스가 있잖아요. 프랑스 이거 까탈스럽습니다.
김 : 까탈스럽다(궁시렁)...
강 : 프랑스 이것저것 많이 건드리거든요. 이게 또 나름대로 문학의 나라라. 딱 그러면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프랑스 문학 작품 하면 알베르 까뮈 뭐 이방인 이러잖아요. 이방인 까뮈의 상표를 딴 꼬냑 있죠.
김 : 그렇습니까?
강 :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김 : 아, 까뮈 꼬냑.
강 : 네. 까뮈라는 이름의 꼬냑이 있어요. 프랑스 문학은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어렵습니다. 프랑스 문학은 좀 따분하고 하니까, 글쎄 프랑스 문학은 워낙 변화가 심해서, 이렇게 하고 둘러대고 넘어가면 됩니다. (아하하) 같은 세계문학에 넣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아하하하 계속) 정체성 찾기가 어렵단 말야, 이러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거기까지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정도야 저도, 누구나 기억할 수 있죠, 마크 트웨인 톰 소여, 찰스 디킨스 올리버 트위스트, 미국 실상 그대로 영국 산업혁명, 다 외웠습니다. 흑인 나오거든요, 톰 소여 보면.
독일, 프랑스, 워낙 까탈스러워서, 아직도 정체성이 확실치 않아, 변화가 심해. 독일 그러면 헤르만 헷세 그런 게 나오거든요. 헤르만 헷세 그러면 이제 젊은 베르트르의 슬픔인지 뭐 그런 거 나오는데, 헤르만 헷세 하면 유리알 유희라고 머리에 쥐나게 생긴 소설 있어요. 고거 읽었다는 사람 있거든요. 그거 읽었다는 사람 나오면은, 과감하게, 독일도 외울 필요 없어요, 헷세가 있긴 하지만, 독일 작품은 워낙 형이상학적이라 문학이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쫙 찔립니다.(와하하하) 독일 문학이라는 게 워낙 관념적이거든요. 칸트 헤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다섯 명 중에 두 명인데, 대단히 철학적이거든요. 독일사람 두 명, 그리스 사람 두 명. 독일 문학이 워낙 철학적이라.
김 : (끼어들며)토마스 아퀴나스는 어디 사람인가요?
강 : 아, 그 당시 중세는 어느 나라에 속했다고 말하기 어려운데, 이태리 사람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런데, 독일 문학은 워낙 철학적이라 문학이라 할 수 있을까.
김 : (중얼거리듯 따라하며) 문학이라 할 수 있을까.
강 :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외워야 하는 작품 두개밖에 안되죠. (아하하하) 톰 소여의 모험과 올리버 트위스트. 그리고 프랑스는, 하긴 이 나라들이 지금까지 세계문학을 주도해 왔으니까, 지금까지 걔들이 세계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문학이 많이, 러시아가 남았는데 아 이거 괴롭거든요. 프랑스 워낙 변화가 심해서 독일 워낙 철학적이어서. 그런데 러시아 문학 남았거든요.
아, 러시아 문학, 이거 괴롭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라스콜리니코프.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러시아 문학. 일단 이름이 외우기 어렵습니다. 러시아 문학에 보면 라스콜리니코프가 죄와 벌의 주인공인데, 그 이름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라스콜리니코프적 인간 그러면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알게 뭡니까. 러시아는 좀 더 지켜보자고! (대폭소) 딱 이래버리면은 작품 두개 외우고, 그 다음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다섯 개 국가, 딱 잡힙니다.
김 : 러시아는 좀 더 지켜보자고.
강 : 아,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작가 이름을 외우기도 어렵거니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간들이 워낙 꼬여있어요. 악령이라던가 그런 작품들 읽고 감동받았다는 그런 사람을 보면 오히려 그런 감동스러울 정도로 어려우니까 읽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변부 국가들이 있는데 아르헨티나라던가 보르헤스라던가 이런 요즘 작품들이 있거든요. 이런 작품들이 거론되면 지난시간에 제가 알려드린거 있죠? 문학의 역사가 워낙 기니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신생아들이라고 하는겁니다, 역시. 아, 그런다음 우리가 국내에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김 : 국제적 대처방안도?
강 : 국제적 대처방안도 있죠. 국제적 대처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외국인들이 혹시 외국인하고 얘기를 하게 됐다, 아, 외국인과 얘기하는 경우라면 확실하게 물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프랑스에 갔다, 그럼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영어로 합니다.(푸훗) 서로가 외국어기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거든요,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문학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 문학의 성취라던가 플로베르라던가 알렉상드로 뒤마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아 그런 작품들이 있었군요, 하면서 일단 띄워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언제적 사람들이냐, 1800년대 사람들이거든요. 1800년대 사람들이면 아 그러냐 해요. 한국에서 세계문학이라고 내놓을만한 게 있느냐, 그러면 사실 문학이라는 게 어떤 게 우월하고 어떤게 우월하지 않느냐 하고 평가할만한 기준이, 객관적 기준이 없어요. 그죠? 그럴땐 우리가 딱 객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있다 한국에도. 한국에도 박경리의 토지가 변억되었다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폭소) 읽지도 않아요. 그 두꺼운 책을, 아이고, 할 일이 없어요? 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한국에 아주 오래된 문학이 있다. 서기 700년 무렵에 신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향가가 있다. 그럼 서기 700년에 너네 뭐했냐, 그럼 한 일이 없거든요. 걔들. 아스테릭스 시대에요 그때가.(둘 다 큭큭거림) 그럴 때 이제 제망매가 같은 거 외우기 쉽거든요. 토지 같은 거 읽기도 어렵고 스토리 요약도 어려운데, 열 줄밖에 안 되니까 외우기 쉬워요. 딱 한 마디 읊어줍니다. 우리나라 한국에는 서기 700년경 이런 문학이 나왔다. 니네 서기 700년에 뭐했냐.
김 : 영어공부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저같은 경우는. 영어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강 : 다 그럴 필요 없죠. 제망매가 안 외웠으니까 모르거든요. 제망매가 딱 한 구절만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른 가을에 (김어준 한 마디씩 따라함, 이른 가을에) 흩어지는 낙엽처럼 (흩어지는 낙엽처럼) 한 가지에 나서도 (한 가지에 나서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구나.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구나) 누이동생을 갖다가 안타까워하면서, 죽은 누이동생을 안타까워하면서 부른 노래거든요. 그런 구절은 어디서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 서기700년에 이미 한국에는 문학이 있었다. 요거만 딱 하시면 됩니다.
김 : 저희가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미국은 마크 트웨인 톰소여의 모험, 영국은 찰스 디킨스 올리버 트위스트, 프랑스는 워낙 변화가 심해서, 독일은 워낙 형이상학적이라서, 러시아는 좀 더 지켜보자고, 세계문학은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의 산물 아닐까, 키 문장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거 어떻습니까. 노벨문학상을 거론하는 사람들, 노벨문학상 수상작 제목들 거론하면서,
강 : 아, 그거 중요하죠. 노벨은 화학 공학자인데 웬 문학. 이러면 딱 얘기 끝납니다. (웃음) 화학 공학자거든요, 노벨이 엄밀한 의미에선. 노벨 문학상은 노벨의 참뜻에 어긋나는 상이야. 간단하시죠?
김 : 알겠습니다. 기선 제압용으로는 책의 본질, 그때 허허허 한번 웃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기선제압용으로 책의 본질에 대해서 아나, 하고, 가만히 있다가 얘기를 시작할 때 나도 책 좀 들여다 봤지만, 하고 뜸 1분 가량 들인 다음에, 사람들이 쳐다보면 세계문학이라는 게 이데올로기와 헤게모니의 산물 아닌가. 하고 또 뜸 좀 들이겠죠? 그리고 미국은 마크 트웨인 톰 소여 대모험, 실상.
강 : 흑인이 나옵니다,
김 : 네 흑인, 그리고 올리버 트위트스, 산업혁명, 계급,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각각 변화가 심해서 철학적이라서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계문학의 주제가 등장했을 경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얼굴을 세울 수 있나, 당황하지 않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 : 감사합니다.
김 : 고맙습니다.
06. 11.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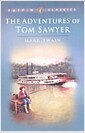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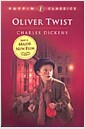


P.S. 해서 결론적으로 읽어야 할 세계문학은 <톰 소여의 모험>과 <올리버 트위스트> 두 권으로 압축된다. 나머지는 너무 까탈스럽거나 너무 철학적이고, 또 좀 기다려봐야 한다로 정리된다는 것. 예전에 '최근에 나온 책들'로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을 소개하면서 한번 인용한 적이 있는데, 영국시인 오든오든(W. H. Auden)의 흥미로운 평문 '허크와 올리버'에는 이런 내용이 지적돼 있다. 한번 더 간추린다.
오든은 두 작품, 즉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과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를 현대 영미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거명하면서 두 주인공 허크와 올리버를 비교한다. 그는 자연에 대한 태도, 현실에 대한 태도, 그리고 시간과 돈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하여 이들을 대조하는데, 가령 유럽(영국)인에게서 자연이 어머니의 품 같다면, 미국에서의 자연은 야성적이라는 식이다.
그러면서 그는 유럽인들이 읽기에 <헉핀>은 매우 슬픈 소설이라고 말한다. <올리버 트위스트>의 끝장면에서 올리버가 사랑이 있는 가정에 입양되면서 그의 꿈을 실현하는데 반해서 유사한 모험들을 겪게 되지만 허크는 그의 친구 짐과 결국엔 헤어질 것이며 다시는 못나게 되리라는 걸 독자가 알게 되기 때문이다. 또, 사건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유럽인들은 새로운 요소를 보지 못하는 반면에(사건들은 '반복'으로 의미화된다) 미국인들은 반복의 요소를 보지 못한다(사건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으로 지각된다. 이런 경우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
돈의 경우도 대비되는데, "올리버의 경우, 그것은 법적 상속권에 의해 그에게 주어진다. 허크의 경우에는 그것이 순전히 행운일 뿐이다." 오든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 "미국에서 돈은, 자연이라는 용(龍)과의 전투를 통해 빼내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곧 성인의 표증을 상징한다. 미국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다... 유럽의 단점은 탐욕과 인색이며, 미국의 단점은 이 양적인 돈이 성인의 표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중단해야 될는지 알기 어려운 데서 기인하는 근심이다... 사실 미국인들은 물질에 대해서 별로 연연해하지 않는다. 충격적인 것은 미국의 소비일 뿐이다. 마치 유럽의 미국인들에게 충격적인 것이 유럽의 탐욕이듯이." 음미해볼 만한 견해이다.(프랑코 모레티의 책 얘기는 분량상을 다른 자리에서 다루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