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이 어떤 책을 읽는지 살펴본다. 왜 그 책이 이런 저런 상황에서 읽혔는지 생각해본다. 더 가까워 지는, 혹은 더 미워지는 인물들.


릴라는 베케트의 희곡을 레누보다, 니노보다도 앞서 읽는다.

영어판에는 Another Happy Day로 단수로 표기되어있지만 인물 묘사가 복수형 해피 데이스가 맞는 듯하다.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옛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난 릴라, 읽고 있던 책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다. 세속적이고 지겨운 인생에 대한 이 책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자 선생님은 어려운 책은 나쁘다고 잘라 말하고, 릴라는 선생님에게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노골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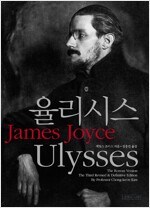
레누는 고등학교에서 세계의 폭을 넓힌다. 정치와 역사를 더 배우면서 고향을 벗어나려 애쓴다.
레누가 열심히 읽는 책은 Federico CHabod와 루소다.


릴라가 계속 공부했더라면 어땠을까, 레누는 생각한다. 퀴리 부인이나 Grazia Deledda 같은 소설가가 되었을지도 모른다고 넬라에게 말한다. 아니면 Nilde Iotti 처럼 정치인이 되었으리라고. 넬라는 웃으면서 릴라가 ugly beauty를 가졌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