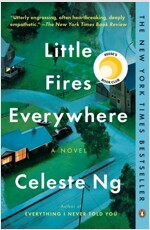

이 작품을 처음 접한 건 작년 hulu에서 리즈 위더스푼 주연의 드라마 소식으로 였다. 원작이 중국계 미국인 셀레스트 잉의 두 번 째 소설 Little Fires Everywhere이다. 제목이나 드라마 예고에서 받은 인상은 중산층 가족 내부의 숨겨진 갈등과 상처, 대비되는 서민 가족, 더하기 유색인의 대안 가족 정도였다. 더 매콤하게 만든다면 백인 부촌의 살인사건과 불륜 정도겠고, 비슷한 드라마들이 우리나라의 초고층 고급 아파트에서도 만들어진다. 그래서 별 관심 없다가 .... 어쩌다.... 우연히 읽기 시작했는데 (바람 불던 지난 토요일, 도서관 신간 코너에서 우린 만났어요), 아, 이렇게 재미있을 일인가. 사흘 만에 완독하고 이 드라마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검색중이다.
오하이오 주의 한 부촌, 셰이커 빌리지는 20세기 초에 셰이커 교도들이 지상 낙원을 목표로 엄격한 규율과 선행을 바탕으로 건설한 지역이다. 1997년, 이젠 그 종교적 색은 많이 벗었지만 그 이름과 원칙은 남아서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 모습을 자랑한다. 아이들의 대학진학율은 높고 범죄나 인종차별은 먼 이야기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인종 문제'는 없다고 (백인 주민들은) 여기며 살고 있다. (셰이커 교도들의 별난 규율과 고아나 빈민을 향한 선행은 전에 읽은 Like the Willow Tree 에서도 만난 적이 있다. [알라딘서재]Like the Willow Tree (aladin.co.kr)
1997년을 기억하는지? 응칠의 그 발랄한 부산 청소년들 말고도 Boyz to Men 이라던가, 르윈스키 스캔들로 클린턴 대통령이 청문회에 서고, 힐러리는 남편을 두둔했던 해. 티비 프로그램으론 ER과 길모어 걸스, 프랜즈가 대힛트 였던 그 90년대. 바로 그 90년대에, 셰이커 빌리지에서 리즈 위더스푼이 분한 엘레나 리처드슨은 로컬 신문사 기자이며 (조사와 과거 캐기가 그녀의 전문) 변호사 남편과 네 명의 십대 아이를 키우는 열혈 엄마이다. 이 지방에서 3대째 큰 집에서 살며 근처 주택을 저렴하게 세놓아 어려운 이들을 '돕는다'는 만족감으로 뿌듯해 한다. 그 셋집에 싱글맘 미아 워렌이 딸 펄(고1)을 데리고 이사온다.
소설은 '누가 좋은 엄마인가?'를 끈질기게 묻는다. 엘레나 리처드슨과 엇나가는 막내 이지, 부모 뒤에서 사고를 치고 (멋대로) 수습하는 렉시. 미아 워렌과 다정하지만 비밀은 서로 나누지 않는 딸 펄, 가난한 중국계 이민자 베베와 유아 딸, 자식 말고 모든 걸 가진 린다 맥컬리와 중국계 입양아, 대리모를 섭외해서라도 '전통적 방식'으로 아이를 갖고 싶은 뉴욕의 부부. 딸의 인생과 진로에 대해서 조언과 지지를 해줄 방법을 몰랐던 어느 부모. 등등.
자신의 재산과 인맥, 선행이라는 명분으로 행하는 온갖 간섭과 갑질, 자신의 기준과 '편견'이 옳지 않을 수 없다는 곧고 단단한 자만심. 그 온갖 긍정주의의 97년.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다른 '주변' 나라들의 자잘한 문화는 장식품이 되어 옆에 있으면 그만이었던 97년.
부잣집 아이와 그 집 도우미의 아이들 사이의 (겉으론) 우정 이야기로 시작하기에 <노멀 피플> 생각도 났고 97년 미국에서 만났던 많은 한국계 입양아 꼬마들 (태극기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나이든 백인 양부모 손을 잡고 다니던)도 생각났다. 일부러 내 앞에선 지나치게 천천히 말을 해서 주위 사람들의 눈길을 끌거나 과장된 친절, 혹은 나에게만 건너뛰는 스몰토크 들도 잊히질 않는다. 그 백인 이미지에 너무나 찰떡인 리즈 위더스푼의 엘레나를 보고싶다. 또 보고싶지 않기도 하다. 아시안 대상 범죄 기사를 볼 때 이 책 내용을 겹쳐서 생각하게 된다. 트위터에서 만나는 저자 셀레스트 잉의 분노의 트윗(@pronounced_ing)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저자의 심정을 상상하게 만든다. 작가의 첫 소설도 챙겨두었다. 이번엔 이민자 가족의 이야기가 중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