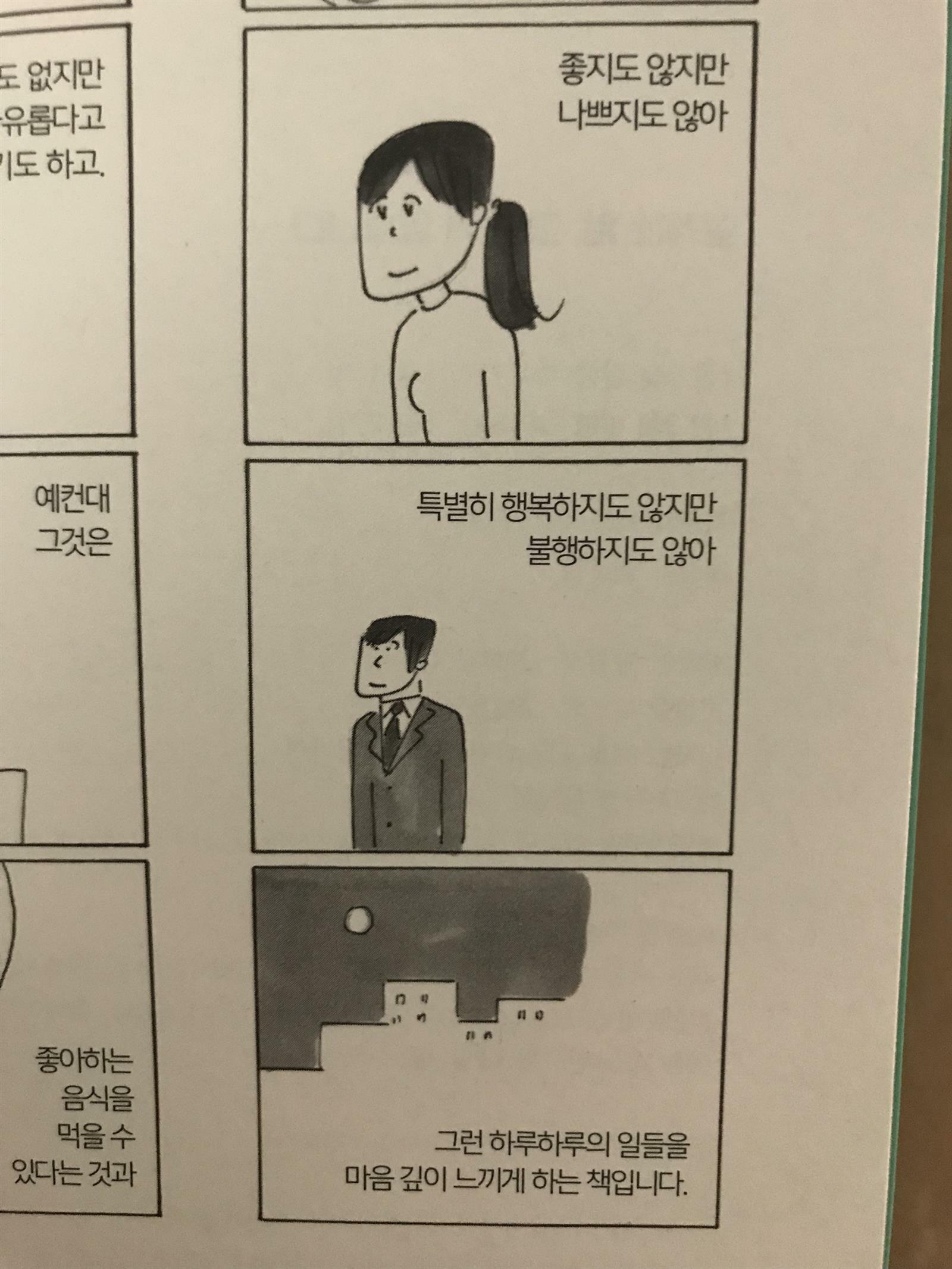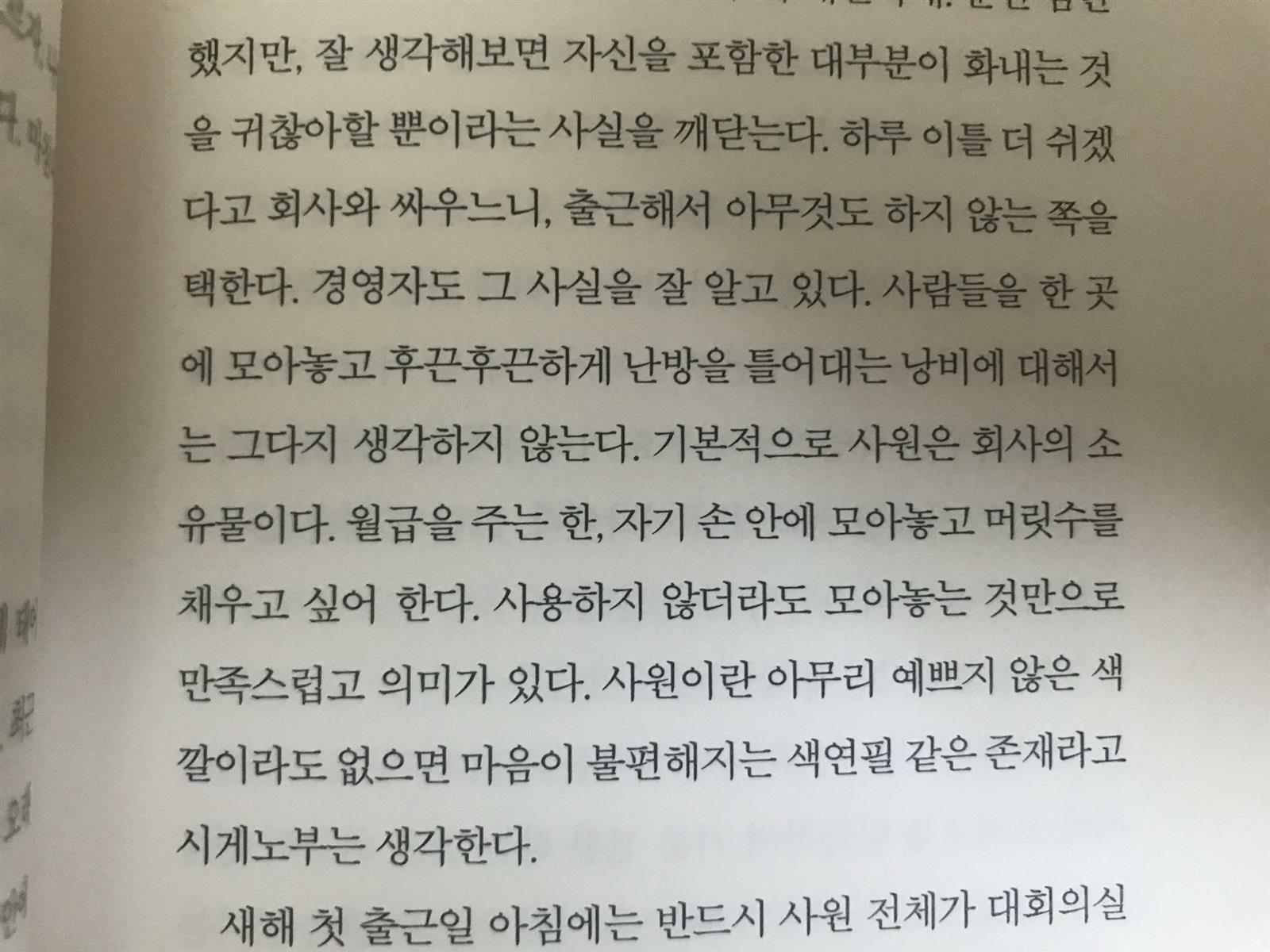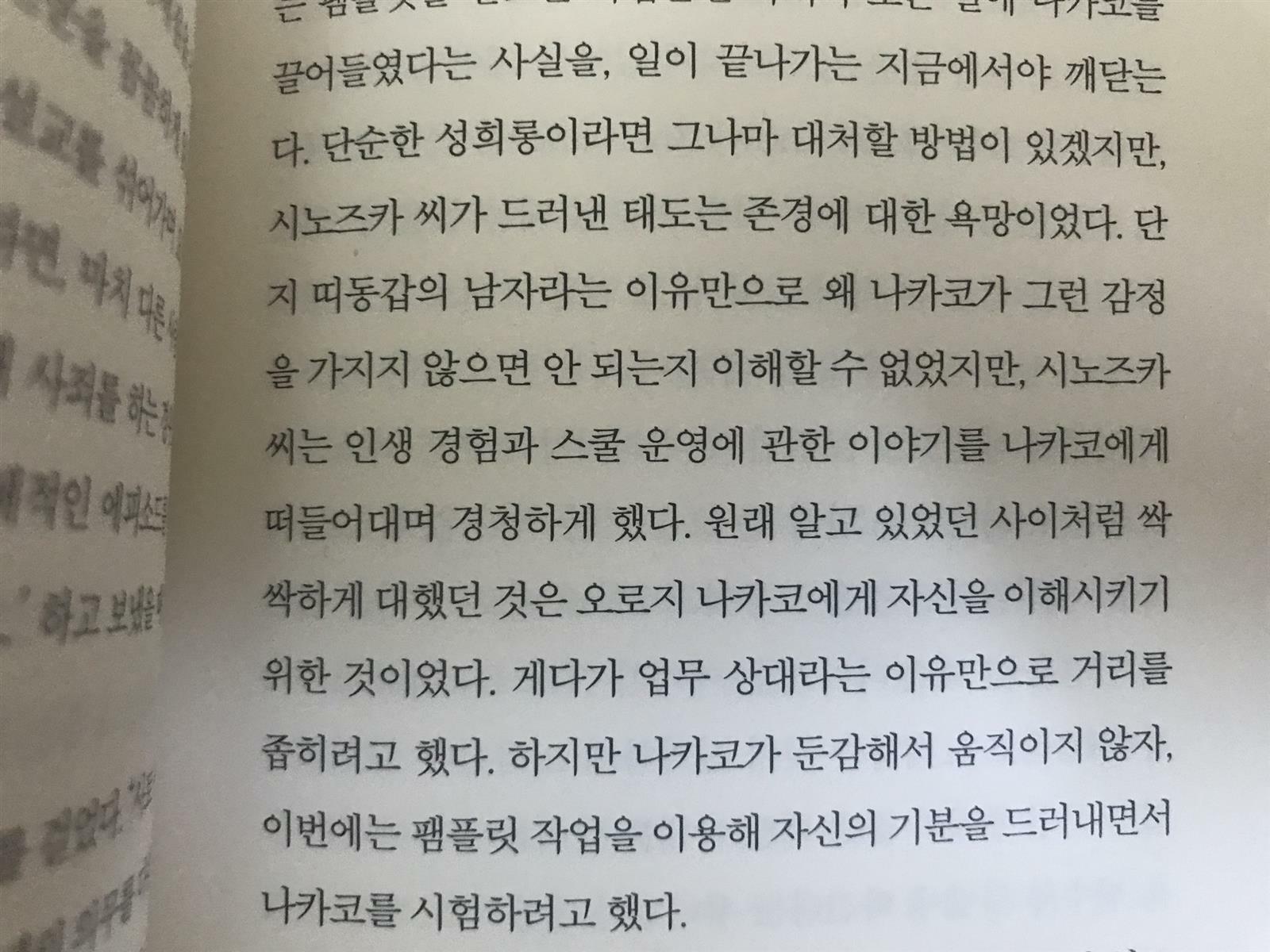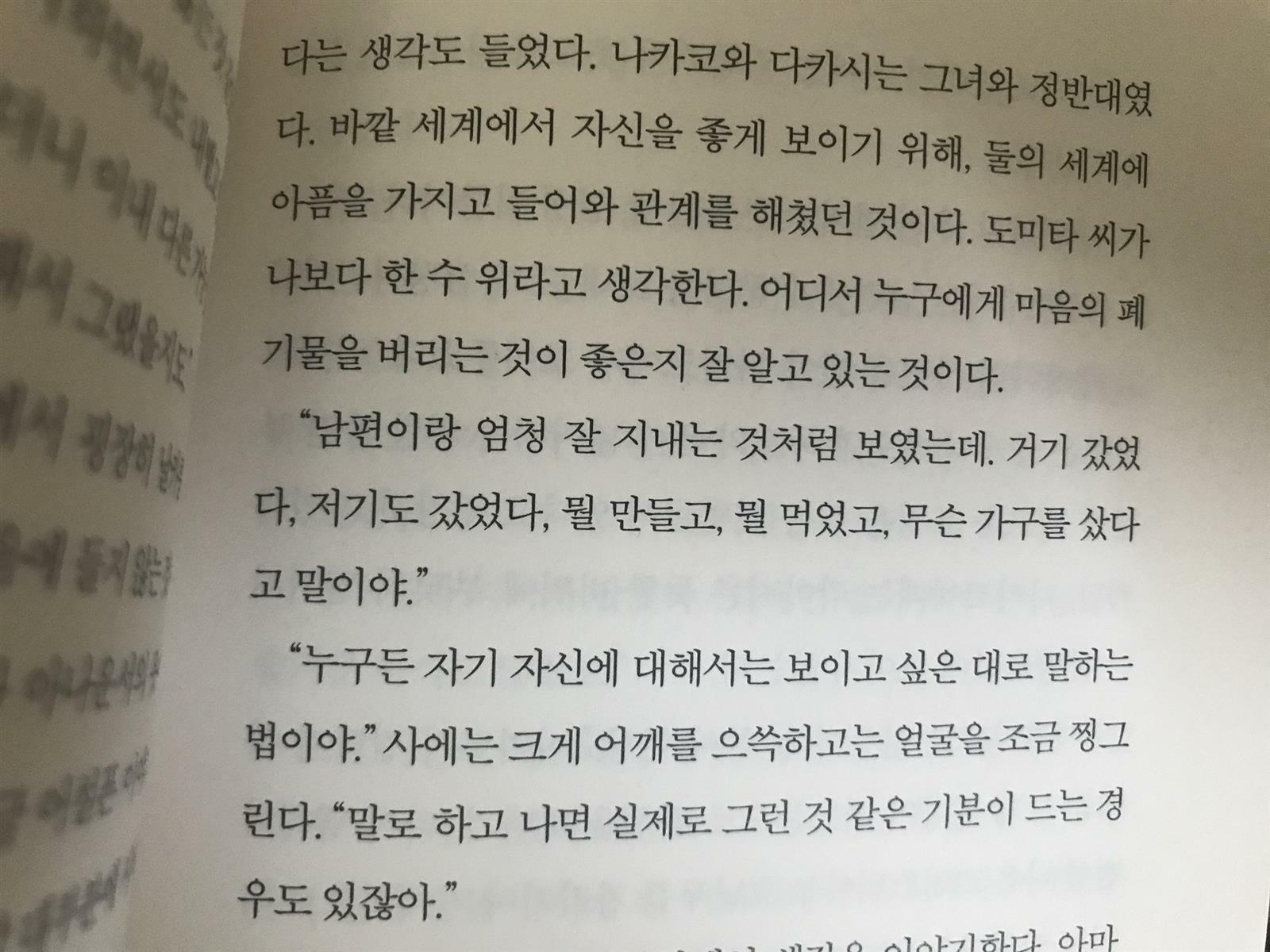어떤 직종이라도 드라마에선 연애만 한다. 회사는 두 계파로 나뉘어 이사장과 사장 사이의 암투가 벌어지고 해외 유학파 여인은 순박한 계약직 여직원의 츤데레 애인인 실땅님을 빼앗으려 든다. 실땅님은 실은 어릴적 부터 아픔이 있었....

그런 이야기 아닌 그냥 직장인 이야기다. 소설이지만 쓱쓱 읽히고 큰 얼개나 구성, 인물도 엄청 새롭지는 않다. 설레지 않는다, 고 제목에 써놓고 당당하게 직딩의 생활 이야기로 시작한다. 알람 사이의 8분 (내 시계는 9분)이 붙잡아주는 달콤함과 게으름으로 만드는 아침, 어젯밤에 놓아둔 물건을 밟고 시작하는 분주한 출근 준비, 차곡차곡 쌓이는 마켓 떨이 물건 기분이 드는 지하철, 오랜 연인과 헤어지고 느끼는 후련함과 그저 따지고 화풀이 하는 게 목적인 고객의 전화. 믿음직한 사수였던 선배의 퇴사가 불러오는 불안감,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들게 구는 맞은편 직원, 등. 내가 겪지 않고 있는 일상들을 차분하게 불러와서 늘어놓는데 상상이 갑니다. 그 작은 인간 사회의 축약형, 그 안의 갈등과 서열, 그리고 초월하기 위한 나름의 비법도. 아줌마라고 모르지 않아요.
나카코와 시게노부, 성(姓)도 생일도 같은(!!!!) 두 남녀가 과연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될까를 생각하면 사실 조금은 설렙니다만, 그것 말고는 직장의 일이라 나처럼 비직장인이 읽어야 재밌을 책이다. 이런 매일의 풍경을 휴식 시간의 책 안에서 다시 만나고 싶지는 않을테니까. 그래도 뭐랄까, 생활형 소설, 아니면 꾸준함의 글, 이라는 느낌이 강하다. 매일 매일 아침에 나서고, 볶이고, 지치고, 순간순간 일탈이나 휴가를 꿈꾸고, 그리고 다시 아침, 누구나 다 그렇다고, 조금은 우겨보련다. 책 말미에 실린 이 책의 홍보 만화 (인데 왜 끝에 붙여놓았을까요) 가 귀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