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문화사>로 이름을 알렸던 도널드 서순의 다른 저서 <사회주의 100년>이 나온다. 원서로 1000페이지가 조금넘고 번역서로 1800여페이지가 되는 방대한 분량의 책이다. <유럽 좌파의 역사>와 함께 읽으면 좋겠다. 가능한 한 비싸도 이 책은 구해두고 싶다. 폴 존슨의 <유대인의 역사>가 판을 달리해 나왔다. 다른 출판사에서 나왔던 3권짜리 책을 합본해 책이 더욱 비대(?)해졌다. 뭐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런 두꺼운 책이 맘에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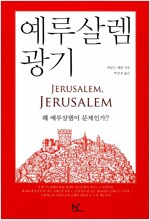

<비잔티움 연대기>를 썼던 저자 존 노리치의 <교황 연대기>가 번역됐다. 교황의 한국방문을 앞두고 숱한 교황관련서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책이다. 교황의 현재를 아는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를 아는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루살렘 광기>또한 시의적절한 책이다. 하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암묵적 동의를 얻은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스라엘의 과거또한 알아보자. <돌아온 희생자들>은 더 먼 과거의 이야기다. 하지만 현재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 책은 소련시절 수용소 굴라크에 수용됐던 사람들의 생존기를 엮은 것이다.



남경태가 들녘에서 펴냈던 <역사>가 휴머니스트에서 <종횡무진 역사>로 재발간됐다. 개정판이니 어디가 달라도 조금은 달라졌겠지싶다. <동해는 누구의 바다인가>는 사실 논쟁거리도 안되는 책이긴 한데 이러이러하니 동해는 우리바다요 라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줄 수 있는 책이다. 간만에 물질의 역사 시리즈가 나왔다. 이번에는 <카카오> 편이 나왔다.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시리즈 중 하나다.






그 외 조선이 유교국가로 가는 틀을 공고히 한 <중종의 시대>와 조선시대 평민의 일상을 다룬 <조선 평민열전>이 나왔고 일본인의 지적 덕후질이 잘 드러난 <사전, 시대를 엮다>, 미국 시스템을 다룬 <아메리카 시스템의 흥망사>도 이 주의 역사서로 참고해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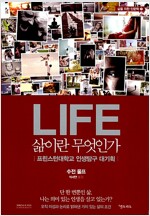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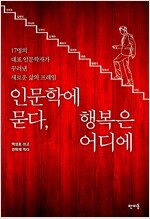
인문쪽에서 나름 유명한 작가들의 책이 나왔다 <희망의 인문학>으로 인상이 깊었던 얼 쇼리스의 <인문학이 자유다>,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인가>로 처음 알게됐던 수전 울프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권이다. 죽음에 이어 이제 삶에대해 탐구해본다. 그리고 한국의 인문학자 17명이 쓴 <인문하겡 묻다, 행복은 어디에>도 나왔다. 뭔가 인문학이 유행같은것이 될까 두렵기도 하다.



<헤겔의 눈물>은 간만에 나오는 '철학 스케치' 시리즈다. 잠시 잊고 있었던 시리즈인데 이번 책을 통해 이어지게 됐다. 대중적 비유를 통해 헤겔철학의 세계로 입문시켜준다 한다. <루이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는 엘피 크리티컬 팅커 시리즈다. 간만에 나왔는데 새 책이 알튀세르의 책이라 왠지 반갑다. 서광사에서 나온 고전입문 시리즈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입문>이 나왔다. 해당 고전이 눈에 잘 안들어올 경우 이런책과 같이보는것은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아주 큰 그 외 인문서로는 고전과 관련 된 책이 상당수 있는데 쇼펜하우어의 <생존과 허무>, 루소전집으로 나온 <보몽에게 보내는 편지/도덕에 관한 편지/프랑키에르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군주론 이펙트>가 있다. <불순한 테크놀로지>는 기술에 관한 비평서이며 칸트 연구자로 이름이 난 백종현 교수의 <동아시아의 칸트철학>이란 책도 새로 나왔다. 철학에 관해 가볍게 읽을 책으로 <3분철학>정도를 추천하고 싶다.



사회학 교재로 사용되는 앤서니 기든스의 <현대사회학> 7판이 번역됐다. 6판이 발간된지 2년만인데 그간 바뀐 점이나 새롭게 추가된 항목을 잘 정리했다. 이제는 1100페이지나 된다. 꼭 교재로서의 활용이 아니더라도 두고 읽어봄직하다. <전체주의의 시대경험>은 일본의 사상가 후지타 쇼조의 책이다. 1998년 나온 책을 개정한 것. <여섯번째 대멸종>은 뉴요커의 기자 앨리자베스 콜버트가 쓴 지구에 대한 '걱정'이다. 우리앞에서 사라진것들과 앞으로 사라질 것들, 지켜야할 것들을 알아보자.



박홍규 교수의 새 저서 <마키아벨리, 시민정치의 오래된 미래>가 나왔다. 마키아밸리 재조명의 시류와 맞물려 다리하나 걸친 모양새인데 그렇다고 하기에 또 저서의 무게가 가볍지만은 않을 터. 기대가 된다. <토크빌의 빈곤에 대하여>는 해설서가 아닌 토크빌의 저서다. <미국의 민주주의> 나름 꼼꼼히 읽은 탓에 토크빌 책은 괜한 관심이 간다. 고려대 임혁백 교수의 책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와 평화>가 나왔다. 논문식의 다소 딱딱한 글이지만 시대적 이슈에 잘 맞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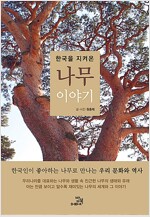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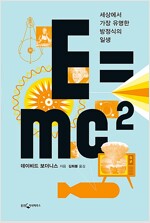
<한국을 지켜온 나무 이야기>는 한국에 자생하는 다양한 나무이야기를 묶은 것이다. 이런 책 참 좋다. 수와 물리에 관한 책으로 <수학, 인문으로 수를 읽다>와 <E=mc²>가 나왔다. 아인슈타인의 전기가 아닌 공식 자체의 역사를 썼다. 수학과 물리학을 조금 안다면 더욱 재미있겠다.



<유쾌한 우주강의>는 삽화를 가미한 읽기쉬운 우주과학 책이다. 지은이는 노벨 물리학상 유력후보로 거론된다는 일본의 물리학자 다다 쇼. 참 부럽다. <늑대는 어떻게 개가 되었나>또한 일러스트를 가미한 과학에세이다. 최신의 과학이슈들을 알기쉽게 엮었다. <살아있는 정리>는 수학자 세드릭 빌라니의 자전적 에세이라고 한다. 수학자의 에세이가 번역되는 것은 또 처음본다.



소설에서는 천명관의 <칠면조와 달리는 육체노동자와>, 김진명의 <싸드>가 눈에 띈다. 처음알게 된 작가 이기호의 <차남들의 세계사>도 주목해봐야겠고.



<안중근, 아베를 쏘다>라는 시원한 제목의 소설은 <아버지>의 작가 김정현의 소설이다. <황금보검>으로 컴백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새 소설을 바로 펴냈다. 원고가 좀 쌓여있었던 것 같다. <게으른 삶>은 문학동네 1회 대학소설상 수상자인 이종산의 두번째 장편이다. 커리어를 잘 쌓아가는 모양새다. 은행나무에서도 오랜만에 한국소설을 냈다. 배명훈 <가마틀 스타일>은 만나보자.






그 외 주목할만한 한국소설로는 2014 올해의 추리소설을 묶은 <잃어버린 밤>, 제5회 네오픽션상 수상작인 이제찬의 <안젤라 신드롬>, 장주원의 초단편 소설집 <ㅋㅋㅋ>, 2007년 등단한 김휘의 두번째 소설집 <눈보라 구슬>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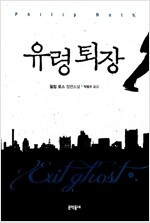


필립 로스의 <유령 퇴장>이 번역됐다. 서른권이 넘는 책을 썼다고 하니 번역이 아직은 요원해보인다. 바바리 킹솔버의 책이 다른 출판사에서 나란히 나왔다. <화가, 혁명가 그리고 요리사>와 <본능의 계절>이다. 개인적으로 "디에고 리베라, 프리다 칼로, 레온 트로츠키 등 실존했던 인물들과 작가가 창조한 허구의 인물인 소설가 해리슨 셰퍼드의 인생이 교차"시킨 <화가, 혁명가 그리고 요리사>에 주목해본다.



일본문학에서는 가사이 기요시의 미스터리물 <바이바이 엔젤>과 니시자와 야스히코의 미스터리물 <어린 양들의 성야>가 눈에 띈다. 하지만 <니노미야 기획 사무소>에는 미치지 못했다. 왜냐면 이 작품의 작가는 151회 나오키상을 수상한 구로카와 히로유키의 국내 첫 번역작이기 때문.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자.



피에르 르메트르의 <알렉스>와 <이렌>의 개정판이 나왔다. 그 외 몇권이 더 나올 예정. <기적이 일어나기 2초전>은 프랑스 언론이 주목한 메종 드 프레스 44회 수상작이다. 작가는 아녜스 르디그. 따뜻한 가족이야기라고 한다.






세계문학에서는 플로베르의 <감정교육>이 민음사에서 나왔고 열린책들에서는 로버스 루이스 스티븐슨으 <자살클럽>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나왔다. 문예출판사에선 레마르크의 <개선문>, 들녘에서는 <꿈꾸는 책들의 도시>가 판갈이를 해 나왔다.



한국저자가 쓴 <카렐 차페크 평전>을 본 적이 있는가? 그만큼 희소성이 있다. 국내에서는 그리 인지도 큰 작가가 아니라 잘 모를 수 있지만 느낌있는 소설을 많이 썼다. <해묵은 동시를 던져버리자>는 김이구의 동시평론집. <북으로 가는 이주의 계절>은 아시아 문학 시리즈인데 아랍계 작가 타예브 살리흐의 소설이다. 수단, 영국, 카타르를 등지로 생활해서 엄밀한 아시아문학이 아닐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자.



<자연을 사랑한 화가 밀레>는 밀레 평전이다. 그의 친구 알프레드 상시에 썼으며 지금껏 가장 밀도있는 밀레 평전으로 평가받는다. <예술을 뒤바꾼 아이디어 100>은 인류의 시간과 함께해온 예술사를 보기쉽고 알기쉽게 다룬다. 딱 100가지만 읽으면 된다.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 있겠니>는 대중문화평론가 김갑수의 클래식 예찬론이다. 나도 미치고 싶지만 어렵긴 하더라.



<앵그르의 예술한담>은 프랑스의 고전주의 화가 도미니크 앵그르의 예술관관 삶을 엿볼수있는 책이다. <나도 손글씨 잘쓰면 정말 좋겠다>는 손글씨나 캘리그라피에 관심있따면 겟잇. <유럽 도자기 여행>은 유럽도 보고 도자기도 볼 수 있는 1석 2조의 책.



워크룸 '제안들' 시리즈의 새 책이 나왔다. <불안의 서>의 작가 페르난두 페소아의 <페소아와 페소아들>이 그것이다. 이번에는 소설이 아닌 수필집으로 출시됐다. <효자손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임철순의 유머에세이다. 현재는 한국1인가구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는데 뭐하는댄지 모르겠다. 포르투갈을 경험할 기회가 거의 전무한 나에게 간접체험을 시켜줄 <다시 포르투갈>도 재미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