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면 추워졌다가 2-3일 활짝 핀 날씨가 이어지면 따뜻한 햇살에 다시 가을날씨로 바뀌고 하면서 내 몸을 데웠다가 식혔다가 냉동하는 탓에 감기가 도무지 떨어질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래도 주말에는 이것 저것 일도 처리하고 쉬면서 NFL도 즐기면서 자투리 시간에 책도 열심히 읽었다. 여기에 정리할 두 권 외에도 서점에서 또 Lee Child의 Jack Reacher소설 구간이 염가판매인 것을 보고 냉큼 집어와 저녁 내내 읽었다. '축의 시대'도 간간히 읽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도 조금 들여다보고, 그렇게 보냈더니 벌써 12월의 두 번째 월요일이다. 2016년에는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고 싶다. 나 자신도, 회사도, 삶도, 무엇도 모두.

목수정 작가 내지는 activist는 예전에 벙커 딴지 팟캐스트에서 강연하는 것을 몇 번 들었다. 특별히 달변은 아니고, 활동 바깥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읽어보면 넓은 의미의 진보진영 내에서도 이견이 좀 있는 듯 하다. 게다가 한국 남자의 관점으로 볼 때 절대로 편하게만 바라보지는 않을 삶의 형태까지 보면, 확실히 목수정은 좌파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강남좌파니 하는 세력권이나 언론의 유명세를 입고 조금이나마 힘을 갖춘 사람이 아닌 말 그대로 좌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듯 하다. 그런 사람에게, 여자에게,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를 따로 구분짓지 않고 상당히 답답한 면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녀가 쓴 책을 일단 한 권이라도 읽어보고 싶어졌다. 그런데, 그런 목적이었다면 이 책보다는 저자의 다른 책을 봤어야 했다. 그러니까, '파리의 생활 좌파들'은 목수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목수정에 의한 파리에서 좌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역시 제목만 보고 책을 사면 이렇게 된다.
이 책에서 소개된 15인의 삶은 확실히 주류의 삶이 아니다. 좌우를 가르기 전에 일단 그들은 굳이 분류하면 체제안에 간신히 머물러 있는 변방인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가난, activism 혹은 투쟁인으로서의 outsider라는 점이 삶이나 인생에 밀려 한쪽을 선택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과 다르다. 일부 공감하고, 또 어떤 부분에는 동의할 수 없는 삶의 모습과 철학인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면 사회는 최소한의 건강은 지킬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이들의 '좌'파적인 삶과 철학이 과연 백인이 아닌 다른 프랑스인들, 예컨데 피부색이 다른 이민자들, 그것도 좀 사는 나라 출신이 아닌 아랍계에게도 extend되는지 확답할 수가 없다.
이 책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봤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받기는 했다. 하지만, 목수정이란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것을 얻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다. 다음 기회에 그녀가 쓴 그녀에 대한 책을 읽어볼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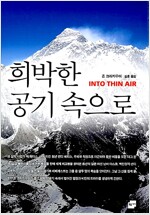
김영하 작가의 팟캐스트를 통해 처음으로 소개를 받았던 책인데, 빨간 책방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한다. 그게 2012년 언젠가였는데, 이제서야 내 손에 들어왔고, 주말에 바로 읽었다. 바로 읽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책이 주는 긴박감 때문인데, 담담하게 시간순으로 당시의 일을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주는 박력은 대단했다.
에베레스트로 대표되는 극한산악등반은 꽤 최근까지도 전문가들만의 영역이었다. 거의 국가대표와 동일시되던 극소수의 모험가들만이 이곳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있었고, 초기에는 특히 다수의 용기있는 산악인들은 이 과정에서 살아돌아오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고상돈이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올랐는데, 그 역시 79년 북미최고봉인 매킨리 등정 직후 조난사했는데, 극한산악등반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수 많은 사례들 중 하나일 뿐이다.
그랬던 에베레스트가 어느 때부터인가 돈만 있으면 그리고 약간의 체력만 된다면 숙련된 가이드와 셸파로 이루어진 팀의 서포트를 받고 오를 수 있는 '관광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전문가라고 해도 성공적인 등반과 귀환을 보장할 수 없는 이 극한의 최고봉이 이제는 줄을 서서 올라가는 도봉산 자락처럼 붐비게 되었고, 당연히 업체간에, 그리고 스폰서간에 경쟁도 생긴 덕분에, 이제는 높은 봉우리를 극적인 방법과 루트로 오르는 대신, 이 전문가들은 서로 더 많은 비전문인들을 한번에 성공적으로 산꼭대기에 올려놓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것이 저자가 에베레스트에 오르던 시점을 전후한 이 바닥의 fact였다.
전문가도 어렵다는 고산지대에서의 적응을 시작으로 캠프에서 캠프로 이동하는 다양한 업체와 국가의 '관광객'들과 리더들 사이의 불협화음과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늘어가는 업무강도 덕분에 아주 조금씩이지만, 꾸준히 사고위험이 임계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음을 깨달은 것은 저자가 이 끔찍한 사고 - 유수의 전문가들과 관광객을 포함한 등반객들이 조난사한 - 를 겪고도 한참이 지난 시점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운도 끔찍하게 나빴다. 직접적인 조난원인이 된 정상에서의 눈폭풍이 딱 두 시간만 더 늦게 왔더라면 모두 한숨을 돌리면서 이번에는 정말 위험할 뻔했다고 하면서 등반성공을 축하하고 있었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니, 스케줄에 맞춘 등방 또는 하산이 이루어지기만 했더라도 눈폭풍이 오기전에 이미 지원캠프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
저자는 이 사고를 겪은 후 지금까지도 완전히 이 경험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1997년 당시). 어려운 일을 함께 겪으면서 친해진 cool guys들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발을 동동 굴렀는데,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 책은 그런 의미를 찾기 위한 책이 아니다. 그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을 더듬고 관련자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재구성하여 복기한 책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있는 그대로의 조난당한 사람들을 남기고 싶었던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추억이 되어 걸러진 이야기가 아닌 매우 raw한 그대로의 이야기 말이다.
인생의 불확실성에 대한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게 되었는데, 나처럼 체력도 용기도 부족한 사람은 이런 극한스포츠에 대한 동경이 별로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더구나 난 90년대의 가격으로 6-7만불을 지불하면서까지 에베레스트를 올라갈 이유도 마음도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덜한 모험이라도 일단 떠난다면 최악의 경우를 미리 생각해 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누구나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명은 희생자를 가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긴박감 이상, 안타까움에 젖어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내 자신을 투영해 보았던 것 같다. 김영하 작가 혹은 빨간 책방이 소개할 만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