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시간이 그냥 시속 100마일 정도로 지나가는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거나 늦남을 자고 일어나면 바로 회사로 간다. 이런 저런 업무를 처리하다가 보면 금방 오후 12시. 점심을 따로 먹든, 싸가는 음식으로 대충 때우든 오후부터는 또 쉽게 시간이 가버린다. 특히 집중을 필요로 하는 일을 잡게 되면 시작할 때의 산만함은 사라지고, 2-3시간은 쉽게 사라지고, 정신을 차리면 어느새 오후 5시나 6시가 된다. 어차피 이 뒤로는 집중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퇴근을 하게 되고, 다시 일을 하더라도 밥을 먹고 조금 숨을 돌리고 나면 금방 저녁 7시에서 밤 8시로 넘어간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면 - 무엇을 하더라도 - 금방 밤 10시나 11시가 되어버리는데, 그나마 시간을 잘 쓴다면 TV대신 저녁 8시 정도엔 gym으로 달려가는 건데, 새벽에 운동을 한 날은 이렇게 할 수도 없기에 책을 들고 서점에 나올 수 있다면 다행이고, 아니면 big bang theory재방을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
어제 트럼프가 처음으로 의회연설을 했다. 반응이 꽤 뜨겁다. 트럼프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CNN에서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순간'이라는 제목하에 평이 좋은 편이다. 공화당이나 보수의 반응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그간 바가지로 욕을 먹은 반이민정책은 조금 tone down하고 오바마대통령이 힘들게 개혁한 의료보험제도를 백지로 돌리겠다는 소리,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1 trillion을 부어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뭘 하려고 하면 연방정부의 독재라고 지랄발광을 하던 공화당놈들. 결국 돈을 어디서 끌어오느냐와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반대였던 셈이다. 부자감세가 거의 확실시되느니만큼, 돈은 결국 또 국민 대다수에게 이런 저런 명목으로 끌어올 것이고, 이걸 가지고 군비증강과 대규모의 토목공사로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건 고스란히 트럼프정부 4년 또는 8년차 (상상하기도 싫지만)의 버블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는 한, 이런 대규모 공사를 일으킬 돈이 미국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인데, 이건 공화당 정부 때마다 반복되어온 일이다.
게다가 미국사람들은 아직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말종을 경험해보지 못했음인지, 트럼프에게서 진정성을 보는 것 같다. 내가 단언하건데 모두 시뻘건 거짓말임이 너무 뻔한 트럼프의 쇼에 속는 거다. 어제의 의회연설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고, 확인된 건, 트럼프가 그래도 쇼는 다른 것보다 잘한다는 사실 정도. 시간이라도 많았다면, 그리고 미국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국가경영이 어땠는지 사설이라도 써주고 싶다만, 아직은 대선의 상실감이 사라지지 않아 만사가 귀찮다. 유일하게 미국이 그래도 나은 사정인건 트럼프 맘대로 할 수 있을만큼 3권분립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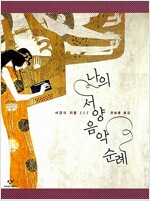
미술보다는 음악이 그래도 조금 낫다. 복잡한 기술적인 이야기엔 큰 관심이 없지만, 좋은 음악을 권하는 책을 보면서 하나씩 구해서 들어보면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멋진 감성이나 깊고 묵직한 울림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아니 단순히 그냥 좋기도 하다. 키씬이나 카잘스도 그렇고, 작곡가는 작곡가대로, 연주가나 지휘자는 그대로, 문학수기자의 책이나 무라카미 하루키가 권하는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럭저럭 좋은 음악을 만나고 저자의 이야기와 함께 공감할 수 있다. 이 책도 그런 덕분에 상당히 흥미있게 읽었다. 서경식 교수가 이야기하는 미술이나 다른 건 많이 어렵지만, 음악을 화두로 삼는 건 괜찮다. 지금까지 이분의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은데, 보관함을 보니 아직도 꽤 많은 책을 접하지 못했다. 이건 미래의 즐거움이 아닌가...

앞서 간략하게 남겼지만, 난 그림이나 사진을 보는 눈은 영 젬병이다. 기억력으로만 보면, visual memory가 더 좋은 편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기억할 때 난 그 일이 있었던 detail보다는 일이 일어난 풍경을 고스란히 머리에 그려낼 수 있다. 물론 나이와 함께 이런 기억력의 특징도 조금씩 사라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러하다. 그런데, 그림이나 사진을 갖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풀어내면 이게 그렇게 난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풍경화를 좋아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주제를 다룬 그림은 전혀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없는데 비해서 정물화나 풍경화는 훨씬 그 이해도가 높다. 여기서도 물론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면 역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지만 말이다. 특히나 현대미술을 다룬 부분, 그리고 대담형식으로 쓰인 부분은 무척 낮은 집중도로 인해 대략의 내용만 보고 넘어갈 수 밖에 없었다. 미술은, 아니 사실 예술은 나에겐 너무 어렵다. 클래식이나 재즈나 무엇이나 내 귀에 즐거우면 듣지만, 배경지식엔 전혀 관심이 없다. 미술이나 사진도 그런 수준일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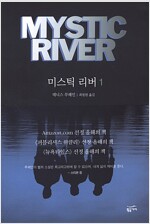
반전은 없었고, 결국 한번 scar이 남은 인생은 억울한 죽음으로 끝났다. 사실을 찾기 보다는 믿고 싶은 마음, 이를 통해 일종의 closure를 갖고자 한 지미의 마음은 결국 그런 결정을 하게 했다. 영화와 다른 점을 굳이 보자면 경찰이 된 숀의 심리, 지미를 바라보는 그의 다짐인데, 영화에선 마치 이들이 공범처럼 처리된 것으로 기억하지만, 숀은 이제 다시 지미를 추적할 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책의 결말이다. 사람의 인생이란 것이 역시 드라마처럼 해피한 결말로 끝나기 보단 배배꼬인채 굳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앞서와 같은 이유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점이다. 사진, 그것도 artistic함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raw한 진솔함이 느껴진 사진들로 꾸민 책이라서 뭐랄까, 나에겐 조금 더 - 무언이 아닌 - 말로 거는 대화가 필요했다. 이런 사진을 보면 물론 내가 기억하는 한국의 느낌, 그 모습이 가득하기에 불빛이 가득한 도시의 풍광이나 아파트와 대형건물 외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향의 모습, 대형마트가 아니면 관심이 없어진 세태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정겹지만, 그래도 나에겐 말이 필요하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한국에선 재래시장이 더럽고 불친절하다고 대형마트만 가는 사람들이 왜 외국에 오면 그렇게 farmer's market에 광분하는 것일까...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운동을 이틀 쉬고, 새벽에 나가서 chest와 triceps routine을 배운동 몇가지와 함께 마치고 cardio를 달렸다. 사이클링 10분 정도, 뜀틀 65분 (5.3마일), 이후 다시 등받이가 있는 자전거를 12분 타고나니 9시. 부랴부랴 준비하고 나온다는 것이 서점으로 와버렸다. 이렇게 나혼자 보낼 수 있는 몇 안되는 하루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주말에 일을 열심히 처리한 덕분에 잠깐이지만 조금 한가할 수 있는 덕분이기도 하다. 이제 슬슬 돌아갈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