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반을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속도가 무척 빨라졌음을 느끼기 시작했었다. 특히 이 시기는 내가 자영업자(?)로 돌아선 시점이기도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자영업 2년차가 되면서부터는 정말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가는 걸 느꼈었는데, 6년차에 들어선 지금은 월-화-수요일까지 바쁘게 지나고 나면, 어느새 목요일 오전이 오고, 그럭저럭 버티고 하루를 마감하면 벌써 금요일이 오는 것으로 2017년의 1/3이 지나갔다. 더욱 열심히 살고, 열심히 좋아하는 것들을 해야만 후회가 적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커피도 많이 마시고, 책도 더 많이 읽고, 음악도 많이 듣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틈새시간을 찾아서 게임도 조금씩 하고, 그러다가 가끔 chunk로 시간을 떼어내서 여행도 가고, 가능하면 출장과 여행을 적절히 섞으면 좋겠는데, 이건 회사의 사이즈가 조금 더 커져야 가능하다. 아직 그 흔한 협회세미나 한번을 가지 못했는데, 보통 연례행사나 분기별로 잡히는 행사는 보수교육을 겸해서 mixing과 networking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점은 통상 관광지 또는 관광지에 가까운 곳에서 행사를 연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뉴올리언즈 hot한 지역, 샌디에고, DC 같은 곳, 겨울엔 잘 찾으면 스키리조트 같은 곳에서 3-4박 정도로 행사가 잡히는데, 일찍 예약하면 호텔도 좀더 낮은 가격에 잡는 등 혜택이 많은 것 같다. 언젠가는 가야지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여유는 좀 나아졌지만, 시간을 낼 수가 없는 것이 문제.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점점 밀리는 등, 아무래도 아나키스트가 장악하고 있는 내 시간경영을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나 공산주의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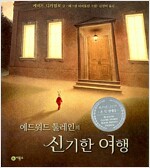
특별한 느낌은 없고, 왜 '별에서 온 그대'에서 테제로 김수현이란 잘 생긴 녀석이 계속 들고 있었는지는 알겠다. 솔직히 이런 테마나 구성은 예전에도 접한 기억이 있는데, 약간은 몽환적인 느낌이 좀 특이했다면 그렇다고 하겠다. 뭔가 짠한걸 기대한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도서관에서 빌려서 본 것이 좀 다행이란 생각도 하고, 대략 그렇다. 나쁘진 않았지만, 내가 사서 보았을 만큼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다른 이들이 보면 또 더 좋은 것을 느꼈을 수도 있으니 이건 뭐라 딱 부러지게 말하기는 어렵다. 표지는 참 맘에 드는데, 그 외엔 달리, 더구나 지금에 와서 떠오르는 건 없으니 참 나의 독서란 것도 이렇게 금방 잊혀지는 것이라서, 한심한 점이 없지 않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투에서 공성전이나 시가전은 여러 모로 가장 참혹할 수 밖에 없다. 현대전에서 성이 갖는 의미는 거의 없으니, 사실 시가전이 거의 독보적으로 끔찍한 형태의 전투가 되는데, 대개의 경우 민간인이 모두 소개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을 방패 삼는 점, 침략군과 방어군 양쪽에서 두들겨 맞는 것이 민간인이라는 점, 그리고 거점파괴나, 중군을 함락해서 끝나는 전투가 아닌, 시작도 끝도 없고, 밤낮이 따로 없으며 전방과 후방이 없이, 그렇게 계속 피와 고름이 나는 상처처럼, 계속 이어진다는 점, 그런데 무기는 현대식이라서 대량살육과 무차별폭격이 가능하고, 소규모부대로 편성된 타깃형태의 공격과 방어가 가능하기에 거의 전천후적인 살인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게다가 스탈린그라드라는 상징성, 무능한 소비에트 정권의 수뇌, 히틀러의 광기와 집착, 이에 맞먹는 스탈린의 무능과 집착이 빚어낸 2차대전 최고의 분기점이자 참혹했던 전투였던 것. 읽는 내내 책을 내려놓기 힘들 정도로 이 두꺼운 책이 잘 읽혔고, 앞서 읽은 같은 저자의 '스페인 내전'보다는 더 나은 번역이라서 훨씬 부드럽게 넘어갔다. 홀로코스트가 종전 직후엔 그리 big issue가 아니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뿌리깊은 서구의 반유대주의도 있었겠지만, 그 이상, 소비에트의 경우 추산 2000만에서 3500만명 이상이 희생되었던 탓에 600만 정도는 상대적으로 대단한 숫자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물론 특정민족을 타깃으로 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대량학살이란 점에서 홀로코스트는 그 특유의 비극성을 갖고 있지만, 다른 의미로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진 동부전선의 비극은 사상자 숫자의 면에서, 그리고 이후 야기된 소비에트의 복수로 인한 추가사상자발생의 면에서 그 느낌이 확연히 다른 건 사실이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히틀러가 서부전선에 치중했다면 아마 소비에트의 동부유럽과 함께 유럽을 양분했을 것이고, 동화작업을 통해 하나의 제국을 이룰 수 있었다면 우리가 아는 세계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 같다. 2차대전의 아이러니가 여기에 있는데 히틀러라는 희대의 미치광이를 상대하기 위해 운명적으로 영국의 처칠, 프랑스의 드골,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 같은 단순무식하고 고집이 센 리더가 역사의 중심에서 활약했다는 점이다. 역사를 공부하고 책을 읽다보면 이런 아이러니를 보는 것이 참 즐겁다.
아직 정리할 책이 여섯 권 정도 남았는데, 일단 성격이 비슷한 것들을 따로 모아서 하나씩 주말에 써봐야겠다. 이젠 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