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동안 다소 무리한 계획을 세웠으니 이번 주간부터 시작해서 9월 초까지 하루에 책 한 권을 읽어보는 것이다. 몇 년전에 한번 잠깐 해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시도였지만, 지금은 그다지 신용하지 않는 모 자계서과의 책을 읽은 후의 시도였다는 것, 그리고 읽은 책도 자계서 위주 (아무리 좀 괜찮은 것으로 추렸다고는 하지만)였던 면에서 조금은 아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자계서가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사람에 따라, 상황이나 시기, 또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읽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알기에 오픈마인드로 대하려고는 하지만, 다년간의 사기(?)에 속은 터라 색안경이 쉽게 벗어지지는 않는다.

자산어보의 어투가 보인다. 하지만, 완전히 과학적인 서술 보다는 좀더 인문학적인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느껴진다. 그런데, 훨씬 더 학술적이지만, 훨씬 더 잘 읽히는 책이 이미 한 권 떠오른다. 바로 한창훈이 쓴 내 밥상위의 자산어보가 그 책이다. 내 술상위의 자산어보도 얼마전에 나온 것으로 봤는데 난 아직 못 읽어봤지만, 앞서 나온 책의 끌어당김을 볼 때 기대가 높다. 그런데 다루는 내용도 좋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많이 하기는 했으나, 어인 일인지 뒤로 갈수록 읽는 힘이 딸리는 것을 느꼈다. 이유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내게는 좀 지루한 면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느낀 것이고, 좋다는 평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다.
여기까지 7/14에 쓴 후 다시 모든 것이 밀려버렸다. 아래부터는 7/19 저녁부터 쓴 것이다.
지난 주 금요일부터 쉬는 김에, 노는 김에 매일 밤 술을 마셨다. 휴양지가 좋은 점이 그런 건데, 문제는 다녀와서도 계속 마셨다는 것. 아무래도 심심하다 보니 원래 예정했던 대로 저녁시간을 운동이나 독서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밥을 건너뛰고 있다가 출출해진 김에 술을 먹게 되는 것이다. 작년 이맘 때 이짓을 하다가 찐 알콜살이 빠지는 데 반년 정도가 걸렸는데, 이번엔 아무리 cardio운동을 늘렸다고는 하지만, 방심할 수 없는 일이다.
늦은 저녁이나 밤, 심심함과 출출함이 겹치면 바로 술과 안주로 연결된다. 그렇게 풀어놓다 보니 안될 것 같아서 어제는 일부러 저녁식사를 넉넉하게 하고 만화책을 정신을 빼버린 후 자버렸다. 상당부분 결국 심심하면 발생하는 것이 나의 술문제가 아닌가 싶다. 지난 주부터는 일을 계속 꾸준히 해왔고 중간에 푹 쉰 덕분에 머리 꼭대기까지 꽉 찰 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런 의미로 한 잔을 찾게 되지는 않더라. 쓰다가 보니 무슨 알콜중독자의 수기 같지만, control은 중요하고, 실제로 지난 주부터 조금 멋대로 생활한 점이 없지는 않다.
낮에 일하면서 이렇게 써놓고, 오늘 디톡스를 위해 하루 종일 물만 마신 덕분에 기분좋게(?) 와인과 갈비살을 먹고 있다. 리뷰는 물건너 감. 그런데 흔적을 위해 이 페이퍼를 완성할 때까지 계속 이어서 쓰면서 이 shame의 기록을 남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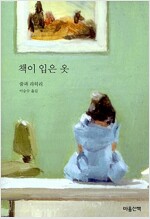
책과 채표지의 관계. 의도는 책의 내용을 합축적으로 그리고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을 돋보이게 하는 것, 그래서 아주 찰나지간, 구매자의 구미를 당기는 것이다. 그런데, 꼭 본말이 전도된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래도 어느 시기나 시점부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책의 컨텐츠보다 먼저 커버가 사람을 낚기 시작한다. 심지어, 적어도 저자가 보기엔 내용과 상당히 동떨어져있는 표현의 커버가 내용에 옷을 입히고 세상에 나가게 되기도 한다. 내용의 자유도는 있지만 표지엔 출판사의 영업논리가 반영되는 것이다. 사실, 내용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컨텐츠는 작가창작의 마지노선이자 마지만 프론티어로 남을 수도 있는 반면에 표지는 출판사의 마지노선이자 프론티어가 되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논제를 갖고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 나온 것은 결구 줌파 라히리를 더 파고들 필요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고작 와인 한 병, 맥주 두 캔을 마신 결과, 눈이 풀리고 가까이서 보기엔 널디 넓은 27인치 모니터를 찡그리면서 시각을 모으는 지경이다. 조금 더 가까이 옮겨서 보니 조금 낫긴 하다.
다시 쓰는 시점은 7/22 토요일 오후. 오전에 열심히 근육단련 후 65분간 비록 기계위에서였지만 5.5 마일을 뛰고 걷다. 씻고 짐을 챙겨서 서점에 잠시 나와서 traffic congestion이 심한 시간을 커피를 마시며 시원하게 보낸 후 부모님 댁으로 갈 생각이다.

책을 모으는 사람으로 말할 땐 하드커버만한 것이 없다. 하지만 순전히 읽는 입장에서는 그저 글자가 크고 가벼우면 장땡이다. 3-8광땡보다 좋다는 장땡. 이번에 이 책을 아버지께 빌려드리면서 듣게 된 가벼운 컴플레인이다. 연세 때문인지 손목이 아프고 무겁게 느끼시는 것 같다. 그래도 어젠 일전에 빌려드린 20세기 3부작이 너무 흥미진진해서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다고 하시니 계속해서 집에 책을 퍼 나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어린 시절 읽은 나폴레옹 전기는 거의 설화수준으로 좋은 것들만 뽑아 놓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80년대에 나온 책, 땡전시절까지 이어진 군인숭상풍조 내지는 정책을 충실히 반영한 듯, 애국적인 군인이 어떻게 "식민지" 코르시카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본토" 프랑스로 건너가 천신만고 끝에 군인이 되어 "구국"의 일념으로 "통령"이 되고 황제가 되었는지를 풀어놓고 있다. 그 책엔 인간 나폴레옹은 없었고, 박정희-전두환의 프로파간다를 연상시키는 우상만 있었을 뿐이다.
저자도 의도에서 밝혔지만, 아주 인간적인, 너무도 인간적이라서 오히려 위대하게 보이는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쓰고자 했고, 적어도 내 생각으로는 아주 철저하게 그런 인간적인 나폴레옹의 면모를 그려낸 덕분에 "위대"한 것을 떠나 너무도 매력적인 나폴레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박정희를 연상시키는 "작지만 독한 아이"가 아닌 본연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성공에 이른 그의 장점이 곧 그가 실패하는 큰 원인을 제공함에 따른 아이러니도 상당히 흥미롭게 느꼈다. 몇 권 더 구해 볼 예정인 나폴레옹에 대한 다른 책들이 더 기대되는 이유다.





늘 얘기하지만, 출판사가 시리즈의 일부만 책을 내는 건 태만을 넘어선 미필적고의에 의한 범죄가 아닌가 싶다. 물론 회사가 망해버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설사 그런 경우라도 판권을 넘겨서 계속 시리즈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닐까. 1-5가 아닌 1-10이 되었어야 할 이 시리즈가 중간에 끊어진 건 비극이다. 나야 미국에서 책을 구해놓았지만, 한국의 많은 판타지팬들에게는 6-10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출판사에게 클라이언트 같은 독자들에게 큰 실례라고 생각된다.
앰버는 세계의 중심이고 모든 세계는 앰버의 일정부분을 반영한 그림자라는 기본설정으로 앰버의 아홉왕자들의 투쟁, 앰버와 혼돈의 대결 등에서 발생하는 멋진 활극을 보여주었다. 읽는 내내 간만에 읽는 판타지의 매력에 푹 빠져있을 수 있어 행복했다. 판타지의 팬이라면 책이 사라지기 전에 꼭 구해놓을 것.

대머리작가 홍대선의 구라빨은 당대 최고라고 한다. 느물거리는 마사오나 진지한 물뚝심송, 파토와는 다른 의미로 정체를 알 수 없는 'ㅅ'으로만 알려져있는 매력적인 목소리의 여성과 이동규 대표, 그리고 홍대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는 그래서 늘 귀를 즐겁게 한다. 그가 최근에 딴지에 연재했던 테무진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나왔기에 냉큼 사봤다. 주로 어린 시절의 몇 이야기, 이후 칸이 되기까지, 그 다음 세계정복까지를 다루는 전기물과는 달리 충실하게 어떻게 그토록 가난하고 능력도 부족했고, 심지어 야심도 별로 없었던 한 몽골부족의 남자애가 초원의 최강자로 등극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그가 통일을 이루는 부분까지가 얘기의 끝이다. 책을 읽었다는 느낌보다는 구라빨 좋은 친구나 형님과 함께 허름한 삼겹살집에 둘러앉아 소주를 마시면서 듣는 무용담 같이 아주 가깝게 다가오는 이야기다.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이야기. 젊은 시절 꽤 팔난봉을 부린 듯, 과거얘기가 나오면 황급히 "죄송합니다"로 이야기를 돌리는 이 사람, 꽤 재미있다. 여담이지만 젊은 시절의 팔난봉은 중년의 탈모로 돌아온 듯, 시옷과 이동규대표가 이 사람을 놀릴 땐 늘 줄어드는 머리카락이 주된 메뉴.

김영하가 언젠가 소설의 목적은 뭔가 심오한 의도를 갖고 있거나 은유를 통해 비범하고 깊은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떠올렸다. 그러고나니 이 책을 읽는 것이 한결 편해졌음을 단박에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수록된 단편들을 그냥 가볍게 보았더니 오히려 더 몰입이 되어 끔찍한 이야기를 보면서는 나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 들고 스트레스를 받았고, 어떤 이야기에서는 나도 모르게 한 순간의 활극을 누리고 싶어지기도 했다. 작가의 의도에 충실한 독서를 한 것이다.
간혹 재수없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 궁금해지는 작가.
드디어 밀린 것을 일단 다 써냈다. 생각보다 몇 권 못 읽은 7월이지만, 그건 그것대로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