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이 떨어진 탓인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가서 운동할 생각이 들지 않았다. 여섯 시 반인가 잠깐 눈을 뜨고 고민하다가 결국 오후에 운동을 길게 많이 하는 것으로 자신과 타협했다. 사실 목요일 새벽에 부모님 댁에서 살던 우리집의 마지막 강아지 진주가 13살로 무지개다리를 건넌 탓인지도 모르겠다. 요 며칠간 아무런 의욕도 나지 않고, 나의 20대 후반에 태어나 40대 초에 떠난 녀석이 내 삶의 어느 한 지점의 끝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 더욱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다. 깔끔하고 영리한 진돗개답게 가기 전에 집안을 더럽힐까봐 이곳저곳을 돌면서 누울자리를 찾다가 타일이 깔린 부엌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들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집에 들려서 얼굴을 본 것이 결국 마지막이었던 셈인데, 쇠약해지긴 했어도 나이에 비해 건강해서 이렇게 갑자기 갈 줄은 몰랐기 때문에 아직도 그 빈자리가 실감나지 않는다. 당분간은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도 없고 형편도 아니라서 그 빈자리가 더욱 크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일본근대문학의 거인으로 그의 이름을 딴 문학상은 현재 일본문단에서 작가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권위있는 상이다. 한국에서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받지 못하고 있는 상으로 더욱 유명한 이 상은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그의 책을 조금씩 사들여왔는데, 비슷한 시대의 일본근대문학에 워낙 관심이 있어서 그 외에도 많은 작가들의 책을 갖게 된 덕분에 본격적인 시작은 미루는 형편이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두 권의 책을 샀고 그렇게 단편집 혹은 소품집 같은 이들을 통해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를 시작하게 되었다. 짧은 이야기 특유의 접근성과 가끔은 비례하는 허무한 결말이 보이는 작품도 있지만, 대체로 당시 일본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즐거움, 정서묘사나 문체에서 나오는 100년 전의 표현을 보는 것도 즐거웠고, 무엇보다 현대문학과 비교하면 조금은 덜 치열한 복잡성이나 난해함보다는 이야기 그 자체의 즐거움이 좋았다.
PS. 지금 목록을 보니 의외로 다자이 오사무와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책을 전집형태로 갖고 있는 것이 많고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는 라쇼몽을 민음사와 소와다리 본으로, 그리고 작품집 한 권을 갖고 있는 것이 전부다. 가끔 이렇게 착각을 하기도 한다. 결국 새로운 컬렉션의 시작으로 연결되는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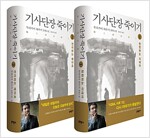
간만에 읽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소설. 내가 구할 수 있는 하루키의 책은 모두 사들이고 있는 편이라서 이 책도 여름에 바로 구했는데, 어찌하다 보니 최근에서야 내 손에 들어왔다. 색체가 없다던 인간의 순례를 읽고서 남은 건 그의 단편들의 오마쥬와 책을 보다가 구할 수 밖에 없었던 리스트의 피아노음악인데, 소설적인 재미는 솔직히 조금 덜했었다면, '기사단장죽이기'는 이런 면에서 아주 즐겁게, 빨리 읽은 책이다. 화가인 화자를 중심으로 역시 십대소녀, 엄청난 양의 클래식 LP, 외딴 집, 외딴 산속, 이데아라고 하는, 유령인지 뭔지 모를 존재까지 그간 하루키가 다뤄온 많은 것들이 발전적으로 버무려져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신이 쓴 단편을 개작해서 중편으로, 장편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건 익히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번 책에서도 전체적인 모티브 말고도, 장면장면에서 그런 데자뷰를 많이 느낄 수 있었다. 신흥종교에 빠진 '소녀'의 아버지에서는 아주 잠깐이지만 1Q84의 흔적을 보기도 했고. 유령인지 이데아인지 모를 그 존재의 기괴함도 꽤 흥미를 가졌는데, 이쪽으로 더 길게 뽑아내도 좋겠다는 생각이고, 화자인 초상화전문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카메라처럼 모습을 카피하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 대상의 본질을 제대로 뽑아내는 이야기도 더 발전시켜서 다른 이야기로 나왔으면 좋겠다. 1950년에 태어나 이제 2-3년이면 70을 맞이할 무라카미 하루키가 계속 마라톤을 뛰고 맥주를 마시며 재즈와 클래식을 듣고 꾸준히 이야기를 풀어냈으면 한다. 모쪼록 오래 건강하기를.

몇 개의 페이퍼를 통해 cyrus님이 정리한 레이 브래드버리의 작품세계를 보면 훨씬 더 나은 정리가 되어 있는 이 책은 황금가지의 '환상문학전집'이면 무조건 구한다는 나의 방침에 따라 몇 년 전에 도착한 것을 최근에 읽었다. 처음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의아해하다가 마치 소설속의 소설처럼 그렇게 문신하나에 이야기하나로 이어지는 단편집임을 알고 편하게 즐길 수 있었다. 다른 이야기들도 좋았지만,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국민학교 때 SF모음집 같은데서 본 기억히 확실한데, 가상현실이 현실이 되는 아주 기묘한 결말이라서 다시 만난게 너무도 반가웠던 이야기다. 그 외에도 역지사지 같은 이야기도 그랬고, 확실히 SF에서 구현된 미래라는 무대장치에서 작가가 살던 현재를 투영하는 일부 SF의 특징을 볼 수 있었다. 역시 SF는 진리가 아닌가 싶고, 나이를 먹을수록 순수문학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장르의 책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고전 SF못지 않게 현대의 소위 '장르문학'의 이야기들이나 현대작가들의 이야기도 계속 찾아낼 것이다.
어제까지는 꽤 더웠는데,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가을로 다시 돌아오는 듯 아침부터 흐린 날씨다. 흐린 날을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비가 내릴 것이라는 다음 주말이 기다려진다. 쓸쓸하니 좋은 토요일의 아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