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플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탓인지 2017년부터는 서재의 방문자수가 확 떨어져버린 이래 지금까지도 무척 낮은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페이퍼도 리뷰도 그 탓인지 내가 원하는 만큼 자주 또 알차게 정리하지 못하고 습작스러운 후기만 겨우 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이 아니라, 정말 내가 봐도 책을 여러 권 읽는 다는 걸 빼고 나면 별로 남을 것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서재의 달인'과 '북플 마니아'로 선정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굿즈를 얻게 되므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매번 다짐은 그렇게 내년에는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지만, 요즘은 늘 퇴보하는 듯한 삶 속에서 얼마다 더 나아질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내 형편이다. 알라딘서재활동을 통해 알게 된 많은 분들, 그분들의 글과 독서세계는 2012년, 알라딘서재를 관리하기 시작하고부터 나에게 큰 동기부여와 자극을 주었고 어쩌면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성인으로서의 독서가 확고한 목표의식과 함께 습관으로 자리잡게 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영되는 회사로써, 그리고 오너에 대한 이런 저런 말도 있고 해서 가끔은 내가 알라딘을 통해 책을 구매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지만 다른 곳도 별반 다르지 않고, 아곳에서 편리하게 한국책을 구할 수단이 달리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 서재를 통해 만난 좋은 분들과의 인연이 있어서 알라딘을 통한 독서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내가 고민할 때, 힘이 들 때, 책읽기에 대한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었고 댓글을 통해 위로 받을 수 있어 특히 어려웠던 2017년과 금년에도 계속 꾸준한 책읽기를 할 수 있었다.
모두 감사드려요.
뭔가 이상한 멋이 발동한 나는 하지를 겨우 넘긴 짧은 해 덕분에 비가 오지 않는 날이 여러 차례임에도 무척 추운 (이곳 기준으로) 아침에 서점이 여는 시간에 맞춰 뛰어 나왔다. 샤워를 하려다 오후에는 뛰겠다는 의지를 유지하기 위해 일단 대충 걸치고 나와 평소처럼 커피를 사들고 서점카페의 stool에 앉았는데 평소와 다른 건 내가 주문한 커피가 보통의 블랙커피와 더블에스프레소라는 것. 어디서 들은 것처럼 더블에스프레소에 알갱이가 잘잘한 갈색설탕을 한 봉지 넣고 적당히 식힌 후 원샷을 때린다. 이후 블랙커피로 배를 달래는 건데 위스키샷을 때리고 체이서로 마시는 맥주의 역할을 블랙커피가 하는 것이다. 덕분에 오늘은 진짜로 땀을 많이 흘리고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서는 잠들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 막 했으니 커피원액에 가까운 샷이 위장을 통해 뇌로 올라오는 순간의 현자타임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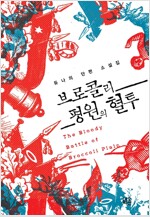
비록 단편적인 이야기들, 마치 소품이나 습작처럼 더 구체적으로 그려질 이야기의 밑그림 같은 것들이지만 그 상상력과 수준은 무척 빼어나다고 생각되는 듀나의 책이다. 참신한 소재와 기발한 발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장편화하는 건 오롯히 작가의 몫인데 이런 부분은 국내소설을 읽을 때면 늘 아쉽게 느끼는 부분이다. 말이 장편이지 사실 지금의 판형과 폰트 및 크기를 생각해보면 지금 한 권으로 엮어지는 소위 '장편'소설은 예전의 단편에서 중편정도의 양이니 요즘의 단편이라고 하면 신문지상의 연재소설 한 편 정도가 아닐까 싶다. 이렇게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이야기짓기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한계는 소설계 전반에 걸친 이슈라고 생각될 만큼 많은 작가들의 글쓰기가 아마추어 시절의 게시판연재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손쉽게 글을 올리고 평가를 얻고 이를 통해 마켓을 가늠하여 출간되는 '등단'의 길은 과거보다 더 넓어졌지만 그런 점에서 대작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되는 면들은 더 개선되었으면 한다. 물론 그런 것이 왜 문제냐고 한다면 쉽게 대답할 수 없고 어쩌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꽁트보다는 인과관계와 당위성이 잘 갖춰진 멋진 장편을, 대서사시를 보고 싶은 마음이다. 언젠가 한국의 유명 SF가 아시아를 넘어 영미권과 유럽권으로 번역되는 날을 기다려 본다. 서점에서 보면 '삼체'를 비롯한 중국 SF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보이는데 한국작가의 책은 아쉽게도 한국계 미국인 작가 한 명을 제외하면 없다. 그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어쩌다 보니 미야베 미유키의 추리소설을 한 가득 구하게 되었고, 마침 크리스마스 연휴 조금 전에 도착하여 노닥거리면서 읽었다. 고만고만한 것들이고 '모방범'이나 '화차' 같은 문제작이 아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큰 활자로 찍혀 기실은 중편 정도인 각 권의 양이라서 한 권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재밌고 쉽게 읽어버릴 수 있었다. 사회파에 발을 걸친 정도의 이야기들, '모방범'처럼 심각하지는 않지만 생각해볼 이슈들을 던져주는데 그 과정에서 얻는 소설의 재미 또한 쏠쏠한 것이 미야베 미유키의 작품세계의 대단한 점이다. 여기에 추리소설 뿐만 아니라 도시전설을 수집한 것 같은 기담, 에도시대의 민담 등 이야기를 엮는 솜씨가 대단한 이 작가에게 그러나 약간의 거부감을 갖게 되었는데, 소설에서 나오는 '도쿄 대공습'에 대한 이야기, 작중인물들의 감정, 설명에서 풍기는 희생자 코스프레의 냄새 때문이다. 실제로는 어떤 비판의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자기들이 일으킨 전쟁이고 아시아에는 가장 빠른 근대화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50년 이상 아시아 전역에서 일으킨 분탕질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이들의 눈부신 reality distortion field의 작용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음이다. 국민 일부가 아닌 대다수가 지지한 전쟁의 결과였고 민간인이 희생될 필요까지는 없었으나 당위적으로는 이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닌 것이다. 그런 생각을 읽는 내내 할 수 밖에 없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클래식'이래 많은 책이 나온 풍월당주 닥터 박의 책. 사실 오페라에 대한 멋진 책이 나왔는데 값이 비싸서 미루고 있다. 클래식에 대한 관심과 공부를 위해 길라잡이로 삼는 문학수기자의 책 네 권과 함께 꾸준히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인데, 이번에는 예술기행을 테마로 한 책을 두 권 먼저 구했다.
리뷰에 간략하게 남겼듯이 좋은 정보로 가득하고 저자의 내공도 훌륭하지만 뭔가 아쉬운 느낌은 어쩔 수가 없다. 뭔가 너무 편하고 예쁜 글. 내가 비뚤어진 마음으로 바라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깊이 들어갔다기 보다는 스쳐지나는 느낌. 간간히 타락한 당시 가톨릭에 대한 의견 외에는 거의 전무한 시대비판 내지는 평가. 카라얀에 대한 부분이 특히 그러한데 영 맘에 와 닿지는 않는다. 굳이 비교하자만 문학수기자의 글에서 느껴지는 음악, 작곡가 하나하나에서의 처절함, 영혼 깊숙한 곳으로의 반추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건 '내가 사랑하는 클래식'에서도 받는 느낌인데 요컨데 멋지고 예쁜 글에 투영된 자기만족과 과시(?)가 음악보다 더 많이 느껴지는 것. 순전히 주관적인 생각이고 부러움 섞인 평가이니 풍월당주 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객관적인 사실과 안내의 수준이 높고 그의 안목과 경험도 대단하기 때문에 참고할 것이 많은 책이긴 하지만 조금 더 하는 마음이다. 조금 전 '풍월당 문화 예술 여행'의 두 번째, '리스본'을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가 쓴 '불멸의 오페라' 1, 2, 3권을 읽고 싶은 마음이다. 일단 음악과 예술을 테제로 한 책이 여럿 있으니 의업과 풍월당의 경영 말고도 여행과 저작활동을 많이 했음에 다시 한번 부러움을 느끼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던지게 된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곳의 날짜로 오늘은 12월 29일. 이틀이면 2018년도 끝나고 자고 일어나면 하룻밤 사이 2019년 1월 1일이라는, 6월 30일까지는 그저 올라가야 할 uphill이 시작된다. 이틀 안에 페이퍼를 더 쓸지 모르겠으니...
모두 Happy New Y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