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은 '바디우와 레비나스'라고 붙였지만 이 글은 두 철학자 간의 비교라거나 대조와는 거리가 멀다. 단지, 필요 때문에 바디우의 <윤리학>(동문선, 2001)에서 2장 '타자는 존재하는가?'를 읽었고, 이 장은 순전히 레비나스의 윤리학에 할애돼 있기에 자연스레 '바디우와 레비나스'란 이름 혹은 주제를 떠올려 보았을 뿐이다.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지만, 알랭 바디우(1937- )는 들뢰즈/데리다 이후의 프랑스 철학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철학자의 한 사람이다. 한데, <윤리학> 외에 <철학을 위한 선언>(백의, 1995)과 <존재의 함성>(이학사, 2001) 정도가 그의 책으론 더 번역돼 있고, 지젝의 <까다로운 주체>(도서출판b, 2005)에서도 그의 철학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존재와 사건> 같은 그의 주저들이 번역/소개되지 않은 탓에 왜 그가 그 정도로 중요한 철학자인지는 실감이 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지젝이 동시대를 대표할 만한 철학자로 아감벤과 함께 바디우를 들고 있는 터여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바디우의 책들을 주섬주섬 긁어모으고는 있다(대부분의 저작이 영역돼 있으며 최근에는 연구서들도 '매우' 활발하게 출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읽으면 '친화감'을 갖게 되는 아감벤과는 달리 바디우는 여전히 나에겐 '타자'이다. '친구의 친구'로 소개받기는 했지만, 아직은 서먹한 관계인 것.
한데, 그 이유가 순전히 바디우에게만 있는 건 아니다. 그의 두툼한 주저들을 독파해나갈 만한 형편은 아니어서 좀 편안한 번역본들이 나오길 기다리고는 있는데, 이제껏 나온 번역본들은 '편안함'에 대한 기대를 별반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존재의 함성> 같은 경우는 서론 정도만을 읽었기 때문에 아직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철학을 위한 선언>이나 <윤리학>은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자갈밭 같은 언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결코 편안한 독해를 허용하지 않는다(<선언>의 경우엔 나중에 부득불 영역본과 러시아어본을 구했고, <윤리학>도 영역본을 구한 뒤에야 다시 들춰볼 수 있었다).
가령, '타자는 존재하는가?'란 장의 첫문장은 이렇다: "'타자에 대한 윤리' 또는 '차이의 윤리'로서의 윤리라는 관점은, 칸트의 명제들이 레비나스의 명제들로부터 시작된다."(33쪽) 내용을 따져보기 이전에 통사적으로 이미 비문이다(주어 '관점은'을 받는 술어가 없다). 그리고 내용상으로도 오류이다. 영역본상으로 이 문장은 "The conception of ethics as the 'ethics of the other' or the 'ethics of difference' has its origin in the theses of Emmanuel Levinas rather than in those of Kant."(18쪽)에 대응하며, 그 뜻은 "'타자에 대한 윤리' 혹은 '차이의 윤리'로서의 윤리라는 개념은 칸트의 명제들보다는 레비나스의 명제들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정도이다.
이 <윤리학> 국역본의 경우 출판과정에서 해프닝이 좀 있었고 곧바로 내용이 부분 교정된 2쇄가 나온 걸로 알지만(해서 오역/오류들이 전적으로 역자의 책임은 아니라지만), 반가운 마음에 단박 초판 1쇄를 구입한 나 같은 독자는 이런 '비문'을 그대로 뒤집어써야 한다(도서관에 들어와 있는 책도 1쇄본이어서 교정내용을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다). 정상적이라면, 이 첫문장은 필히 교정돼 있어야 한다.(한데, 형이상학의 '사유(thought)'를 '사고'로 옮기는 것 등의 취향도 역자가 아닌 편집자의 것일까? '악에 대한 의식에 관한 에세이'라는 한국어 구문상 어색한 부제도?) 그런 맥락에서, 이전에 제1장 '인간은 존재하는가?'를 읽고 불만을 적어놓은 걸 여기에 다시 정리해서 옮겨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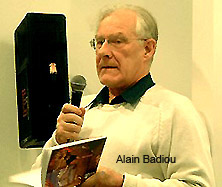
이 책의 번역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이미 여러 사람들에게서 지적된 바이다. 역자의 책들을 여러 권 갖고 있는 나로선 좀 유감스럽지만, 나는 그를 신뢰할 만한 저자로는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그 주된 이유는 물론 그의 번역이 미덥지 못하기 때문이다(바디우의 책으로 그는 <철학을 위한 선언>도 번역한바 있는데, 이 또한 인용하기 껄끄러운 번역이다). 모든 훌륭한 저자가 훌륭한 번역자인 건 아니지만, 적어도 부실한 번역자일 수는 없다는 게 나의 편견이다(방안이 없는 건 아니어서, 굳이 번역 같은 허드렛 일에 손대지 않고 좋은 책들의 저자로만 남으면 된다).
개인적으로 번역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인용가능성의 유무이다. 번역문 그대로 다른 글에, 혹은 논문에 인용할 수 있다면, 그건 나름대로 좋은 번역이고 신뢰할 만한 번역이다. 그리고 그러지 못하다면, 유감스러운 번역이자 (최악의 경우엔)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번역이다(유감스럽게도 그런 번역이 드물지 않다). <윤리학>에 대해서는 역자와 출판사간의 마찰설까지 흘러나왔지만, (출판사에서 함부로 개칠한 번역이 아닌 이상) 그렇다고 해서 역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알라딘에서 읽어본 한 서평에서는 이 책이 "동문선 출판사에서 나온 다른 번역들에 비하면 비교적 나은 편에 속하고, 바디우에 관해 학문적인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는 무난하지만, 이 번역서는 여러가지 세부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어서 학문적으로는 신뢰하기 어렵[다]."(balmas님)고 돼 있는데, 나로선 학문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데에 동의하지만, 일반독자들이 읽기에는 무난하다는 평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일반독자들이 무난하게 읽을 수 있는 번역이 좋은 번역이며 따라서 어려운 번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은 '일반독자'(나는 불어 원서를 대조해볼 수 있는 '전문독자'가 아니다)인 나로선 무난하게 읽을 수 없는 번역이었다.
먼저, 서론에서 저자가 책의 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대목: "윤리에의 준거의 사회적 인플레이션에 맞서서 현재의 관건은 이중적이다"(9쪽) 이에 대한 영역은 "With respect to today's socially inflated recourse to ethics,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wofold:"(2쪽) 나는 역자만큼 불어를 잘 하지 못하지만 이런 대목들은 불어본을 구해서 확인해보고 싶은데(도서관에 없길래 참아두었다) 하여간에 영역본이 좀더 이해하기 편한 건 사실이다. '현재의 관건'을 '이 에세이의 목적'이라고 풀이한다는 점에서.
바디우는 이 컴팩트한 분량의 책 서문에서 자신의 요점을 분명히 하는데, 그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윤리 인플레이션'이다. 개나 소나 다 '윤리(학)'를 떠들어댄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는 무얼 말하고 싶은가? "첫째, 의견들과 제도들 속에서 통용되는, 현시점의 주된 '철학적' 경향인 이 현상의 정확한 성격에 대한 검토를 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 현상이 실상은 진정한 허무주의에 불과한 것임을, 모든 사고에 대한 위협적인 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9쪽)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은 아니지만, (영역본을 참조하건대) '이러한 철학적 경향'(=윤리 인플레이션)의 정확한 성격에 대해서 "검토해볼 것이다" 정도가 왜 "검토를 행해야 한다"라는 의무로 번역되는지는 잘 모르겠다(이어지는 문장들도 다 그냥 미래시제이기 때문이다).
"의견들과 제도들 속에서 통용되는"은 영역으로 "as much in public opinion as for our official institutions"인데, 나라면 "공론장에서뿐만 아니라 대학 제도 내에서도" 쯤으로 옮기고 싶다. 짐작에 official instituitions란 주로 대학 등의 제도권 기관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뒷문장을 옮기면, "나는 이러한 현상이 그 실상에 있어서는 순전한 허무주의에 불과하며 사유 자체에 대한 위협적인 부정이라는 걸 입증하고자 할 것이다."(I will try to estblish that in reality it amounts to a genuin nihilism, a threatening denial of thought as such.")
그의 두번째 목적: "우리는 윤리라는 단어에 완전히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경향으로부터 이 단어를 탈환할 것이다.이 단어를 추상적 범주들(인간, 권리, 타자...)에 연결시키기보다는 '상황들'에 관계지을 것이다. 이 단어를 희생자들에 대한 동정의 차원으로 삼기보다는 개별적 과정들에 대한 지속 가능한 준칙으로 삼을 것이다. 이 단어를 보수적인 양심의 무대로 삼기보다는 그 속에서 진리들의 운명을 문제삼을 것이다."(9쪽)
먼저 첫문장에 대한 영역은 이렇다: "I will then argue against this meaning of the term 'ethics', and propose a very different one." (확인해볼 수는 없지만) 짐작에 영역본은 약간 의역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하여간에 영역본이 더 이해하기에 용이하므로 그에 준하여 다시 옮겨 보면, "나는 (윤리 인플레이션에서의) '윤리'란 말의 이러한 의미(사용)를 반박하면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제안할 것이다."
이어지는 영역은 "Rather than link the word to abstract categories (Man or Human, Right or Law, the Other...), it should be referred back to particular 'situations'. Rather than reduce it to an aspect of pity of victims, it should become the enduring maxim of 'singular processes.' Rather than make of it merely the province of conservatism with a good conscience, it should concern the destiny of truths, in the plural."(3쪽)
계속 이어서 옮겨보면, "즉, 윤리란 말은 (인간이나 권리, 타자 등과 같은) 추상적 범주와 연결되기보다는 개별적인 '상황들'과 연계되어야 한다. 윤리는 희생자들에 대한 연민의 차원으로 축소되기보다는 '단독적인 과정들'의 영속적인 준칙이 되어야 한다. 윤리는 양심을 들먹이는 보수주의의 영역에 남겨지기보다는 (복수로서의) '진리들'의 운명과 관련지어져야 한다." 요점은 유행/경향으로서의 윤리에 대한 바디우의 전면적인 비판/반박과 새로운 윤리의 제안이 이 책의 줄거리가 될 거라는 점이다.
이제 1장으로 들어가서 바디우는 '윤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쓰이는 말인 '인권'에 대해서 검토해 들어간다. 윤리란 이런저런 '자명한'/'자연적인' 권리들의 수호/존중과 관련된 문제라는 게 우리 시대의 통념이다. 요컨대, '자연권으로의 회귀'(혹은 '퇴행')이 이 시대의 증상이며, 그것은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관련된다: '인간의 자연권이라는 낡은 교리로의 이러한 회귀는, 물론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와 그에 의존하는 진보적 개입의 모든 형상들의 붕괴에 연관된다."(13쪽)
이 대목의 영역은 "This return to the old doctrine of the natural rights of man is obviously linked to the callapse of revolutionary Marxism, and of all the forms of progressive engagement that it inspired."(4쪽)이고, 이에 대한 번역은 "인간의 자연권이라는 낡은 교리로의 이러한 회귀는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와 그것이 영감을 불어넣었던 모든 형태의 진보적 현실참여가 몰락하게 된 사정과 분명 연관된다." 이어지는 대목은 모두 바디우의 현실진단이다: "모든 집합적 지표를 상실하고, 역사의 의미'에 대한 사고를 박탈당한 채 사회혁명을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많은 지식인들,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의견을 만들어내는 많은 부문들은 자본주의적 형태의 경제와 의회민주주의에 동조해 버렸다."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있지만, 상당히 투박한 번역이다. 그리고, 영역본에 근거하자면, 바디우는 (1)현실정치와 (2)철학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의 현 정세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국역본에서는 이러한 대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먼저 이 대목의 영역은 "In the political domain, deprived of any collective political landmark, stripped of any notion of the 'meaning of History' and no longer able to hope for or expect a social revolution, many intellectuals, along with much of public opinion, have been won over to the logic of a capitalist economy and parliamentary democracy."이고, 우리말로 옮기면, "정치 영역에서는, 모든 집단적인 정치적 지향점(지표)을 상실하고 '역사의 의미'에 대한 모든 관념을 박탈당한 채 더이상 사회 혁명에 대한 아무런 기대나 바람도 가질 수 없게 된 많은 지식인들은 다수의 여론과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와 의회민주주의의 논리에 투항하고 말았다."
그리고 철학. "철학에 있어서 그들은 과거 그들의 적들의 불변하는 이데올로기가 지니고 있는 덕목들을 발견했다. 인도주의적 개인주의, 그리고 모든 조직화된 참여의 강제들에 대항하는 권리들의 자유주의적 방어가 그것이다. 집합적 해방을 위한 새로운 정치 용어들을 모색하기는커녕, 결국 그들은 기존의 '서양적' 질서의 준칙들을 받아들였다."(14쪽)
이에 대한 영역은 "In the domain of 'philosophy', they have rediscovered the virtues of that ideology constantly defended by their former opponents: humanitaruian individualism and the liberal defence of rights against the constraints imposed by organized political engagement. Rather than seek out the terms of a new politics of collective liberation, they have, in sum, adopted as their own principles of the established 'Western'order."(5쪽)
우리말로 옮기면, "철학의 영역에서 이 지식인들은 과거 자신의 적대자들이 항상 옹호하던 이데올로기의 미덕들, 가령 휴머니즘적 개인주의와, 조직화된 정치참여가 강제하는 억압들에 맞설 권리의 자유주의적 옹호 같은 걸 재발견했다. 새로운 집단적 해방의 정치학을 위한 용어들을 모색하기보다는 요컨대, 그들은 기존 '서구적' 질서의 원리들을 자신들의 원리로 받아들였다." 여기서 서구적 질서의 원리들이란 건, 앞에서 언급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의회민주주의' 같은 게 아닌가 한다.
바디우의 진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 상황은 사회혁명에의 전망 상실이 가져온 일종의 '패배주의'적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보수주의적 '윤리'이고 '윤리의 인플레이션'이다. 이러한 진단하에서 그는 인권의 윤리학과 (레비나스-데리다의) 차이의 윤리학에 대항하여 '진리들의 윤리학'을 새롭게 정초하고자 한다. 그것이 내가 가늠하고 있는 이 책의 윤곽이다. 하지만, 이 윤곽을 다 드러내는 것은 좀더 시간을 필요로 한다.

거기까지 읽고서 이번에 읽은 2장은 그래도 후반부로 가면 요지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번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단들에 대해서 나는 불편함을 느낀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고유성이 실험되는 일련의 현상학적 테마들을 제시한다. 그 중심에는 얼굴의 테마, 자신의 몸의 현시를 통한 타자의 개별적이자 '사적인' 주어짐의 테마가 자리잡는다. 이 테마는 닮음을 통한 인정(나와 동일한 동류로서의 타자)을 체험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드러남으로써 타자에게 '바쳐진' 것, 나의 존재 속에서 그러한 소명에 예속된 것으로서의 나를 윤리적으로 체험토록 해주는 것이다."(34-5쪽)
특히 마지막 문장이 자갈밭인데, 부분적으론 오역이기도 하다(바디우 자신도 레비나스를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짐작에는 역자도 레비나스를 참조한 것 같지 않다). 이 대목의 영역은 이렇다(전체가 한 문장이다): "Levinas proposes a whole series of phenomenological themes for testing and exploring the originality of the Other, at the centre of which lies the theme of the face, of the singular giving[donation] of the Other 'in person', through his freshly epiphany, which does not test mimetic recognition (the Other as 'similar', identical to me), but, on the contrary, is that from which I experience myself ethically as 'pledged' to the appearing of the Other, and subordinated in my being to this pledge."(19-20쪽)
삽입구가 많이 등장하는 탓에 좀 까다로워 보이는 건 중간에 나오는 관계사 'which'의 선행사를 찾는 것인데(역자는 '테마'로 보았다. 불어본의 경우에는 선행사를 식별하기가 더 쉬운지는 모르겠다), 다행스러운 건 'epiphany'나 'the Other'나 'theme of face'나 거의 같은 내용을 지시하므로 아무거나 잡아도 크게 오역은 아니라는 것. 나는 타자의 육체적 현현으로서의 '얼굴'을 그 선행사로 보고 다시 옮기도록 하겠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고유성(근원성)을 테스트하고 탐구하기 위한 일련의 현상학적 주제들을 제시하는데, 거기서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은 얼굴이라는 주제, 즉 고유한 것으로 주어지는 타자, 육체적 현현을 통해 '실물로서' 제시되는 타자라는 주제이다. 이것은 얼마나 닮았느냐라는 인정 테스트의 대상(나와 '유사한', 나와 동일한 자로서의 타자)이 아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나는 그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윤리적으로, 즉 이 타자의 출현에 저당잡혀 있는 것으로, 나의 존재가 이러한 저당하에 놓여 있는 것으로 체험한다."
번역에 관한 나의 윤리는 '충실성이냐 가독성이냐' 이전에, 자신이 이해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옮겨놓는 것이다. 해서, 잘못 이해했다면 잘못 옮겨놓는 것이 윤리이다! 하지만, 잘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옮기는 건 윤리적이지 않다. 바디우의 <윤리학>을 읽다가 나는 엉뚱하게도 번역의 윤리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겨본다...
06. 03.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