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엄마 교과서 - 아이랑 엄마랑 함께 행복해지는 육아
박경순 지음 / 비룡소 / 2015년 2월
평점 : 


“마음이 깊으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박경순 교수가 책을
집필하면서 내내 마음에 두었던 제목이라고한다. 세 아이를 키워낸 엄마로서 양육에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도, 모성애가 남달리 강렬해서도 아니었다.
임상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인 박경순 교수가 <엄마 교과서>를 집필한 동기는. 완벽한 육아라는 허상을 내려놓고, 부모 자신부터 돌아보고 성숙해가는 육아가 바로 아이와 엄마 모두 행복해지는 육아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엄마
교과서>를 처음 읽었을 때, 주문한 아메리카노가 다
식어버렸다. 커피 한 잔에 곁들일 가벼운 마음으로 책장을 펼쳤는데,
결코 가볍게 읽을 ‘육아서’가
아니었다. 메모할 구절이 많기도 많았지만, 심리상담소의
카우치에 누워 정신분석을 받고 있는 양, 책장을 넘길 수록 내 자신의 유소년기와 현재의 모습이
뒤엉키면서 ‘나 좀 살펴봐 달라’고 아우성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격렬하리만큼의 자아성찰로 이끌던 <엄마
교과서>의 채근질이 하도 부담스러워서 한 동안 책을 밀어두었었다.
그러다 두 번째 <엄마 교과서>를
읽었더니 마음이 건드려졌던 부분도 스르륵 넘어가고, 박경순 교수의 깊은 인간 이해의 학문세계가 한층
가깝게 느껴졌다.
여러 장의 메모를
적으며 수차례 반복해서 읽게 되는 <엄마 교과서>는 ‘교과서’라는
어휘가 주는 FM적인 정형성의 선입견과는 정반대로,
열린해석 열린 인간 이해를 근간으로 한다. 쉽게 말해 어떤 독자가 어떤 경험세계와 정서를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 해석이 천차만별 다각도로 다가온다. 박경순 교수는 이를 두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한 방법은 나선형,
즉 나사를 돌리듯 들여다 보기”와 같다 한다.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같지만, 어떤 각도에서 앵글을 잡았느냐에 따라 보는 깊이도
달라지고, 그만큼 새로운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부모들은 <엄마교과서>를
일기장처럼 자주 펴보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같은 책으로 가까이 두고 필독서로 읽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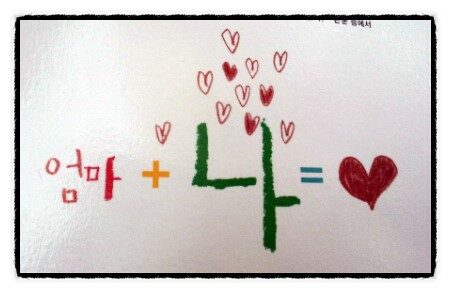
‘한국’의 부모? 그렇다. 이
책은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 더 설득력을 지니도록, 서구의 유명한 정신분석가들의 이론에 의거하면서도
한국의 특수한 문화적 풍토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쓰여졌다. 저자는 이를 ‘착한 아이 증후군’
‘공격성’ ‘나르시시즘’의
키워드로 풀어낸다. 유독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한국 문화권에서는 ‘잘나야 하되 잘난 척하면 욕먹고’ ‘잘났을지언정 겸손해야 더 큰 인물된다’며 착한 아이되기를 권장한다. 소위 엄친아, 엄친딸이야 말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와 동전의 양면일터인데 박경순 교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초래하는 감정의
불균형을 경고한다.
그 외 숱한 주옥 같은 말 중에서 "엄마는 아이의 언짢은 감정을 담아내는 세숫대야, 쓰레기통이 되어야" "때로는 아이들의
포대기가 되고, 기저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 박경순 교수는 "집에서 배부른 아이는 절대로 남의 집에서 숟가락을 찾지
않는다"라며 집에서 사랑으로 아이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라 충고한다. 버릇 다스린다, 버릇 고친다며서 금기를 늘어놓고 융통성
없는 훈육만 한다면, 아이는 집 밖에서건 안에서건 기댈 곳이 없게 된다. 유교문화권인지라 유독 "떼쓰기"="무례함"=나쁜 행동"과 동일시하는
한국에서는, 위니콧이 뗴쓰기로, 프로이트가 공격성으로 표현한 특성이 2~3세 아이들의 정상 발달표현임을 간과하고 억누르려만 든다. 박경순 교수의
설명을 듣고는 '아 차' 싶은 부분이 많았고 나의 훈육 방식을 반성하게 되었다.
내안의 작은 아이, 즉 부모 스스로의 어린 자아부터 이해함으로써 자기 아이를 끌어보듬어 안아줄 여유가 생긴다는 메세지가 계속
마음에서 울린다. <엄마 교과서>를 엄마노릇 비법 전수의 교과서가 아닌, 부모로서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는
책으로 한국의 부모들이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