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손님들. 온전한 홀로 시간이 나질 않는다. 저녁을 들고, 바닷바람에 잔술. 돌아오니 밤10시가 넘어선다. 아직 마저 읽지 못한 책들 가운데 [화성의 인류학자]가 들어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장을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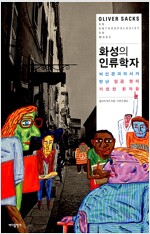
심봉사가 눈을 뜨면 어떨까? 다들 개안하고 다 볼 수 있어 좋겠다고 하지만, 실제 그런 사례들이 300년간 10건 안쪽이라한다. 1700년대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화들이 있다한다. 실제 눈을 뜨게 되면 어떠할 것이냐구 말이다. 로크가 부정적인 답을 한다.
촉각으로 사물을 보아온 사람은 시간과 운동에 제한되어 있다. 눈을 뜬다고 하더라도 망막이나 기능이 온전치 못하단다. 더구나 거리에 의한 공간 감각은 내재화된 것이 아니란다. 그러니 눈을 뜨더라도 색감과 거리감각이 없음으로 인한 새로움과 혼란은 가히 충격적인 것이라 한다. 오히려 촉감으로 모양을 다시 확인한다한다. 촉감으로 사물과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몸에 배인 것이다 한다.
아침. 내 손을 촉각으로 음미해본다. 마디 하나 마디하나 사이의 시간이 길다. 실제 본 것보다 긴 길이와 매듭이 있다. 내겐 촉각으로 사물을 별반 음미해본 적이 없다.
눈의 뜬 뒤, 온전치 못한 삶이 이어진다. 결국 죽음으로 이르듯이. 충격은 예사롭지 않고 익숙하지 않는 것이다.
뱀발.
1. 너무도 다른 영역이란 점이 다가선다. 시각과 촉각, 공간감각력.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것은 아닐까. 촉각의 느낌은 있는 것일까? 알라딘 마을엔 느릿느릿 움직이는 촉감의 세계는 있는 것일까? 아픔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일텐데. 사람에게 너무 쉽게 스타일을 핑계로 대하는 것은 아닐까? 아픔도, 슬픔도 한번 마음먹고 배우는 것은 어떠할지? 오프라인에 만난다면 훨씬 쉽게 그(녀)를 알고 느낄 수 있으리라. 괜히 생각이 번진다. 새벽 땀 한줌을 들다. 갈때 22' 올때 21' 7k. 달님은 아미처럼 가늘어져 있다.
2. 아픔을 밟아본 사람은 안다. 얼마나 짜릿한지 하지만 그것에 중독이 되면, 아프다는 것 조차 인식이 없어진다. 하지만 아픔이 거꾸로 내게 몸서리쳐지게 되면, 그것을 참아내고 돌아봐 그래도 견뎌낼 힘이 생긴다면, 그래서 아픔을 조금 배우게 된다면, 그 쾌락이 혼자 것이란 생각에 아 조금 아플 수 있겠구나하는 느낌이 아주 조금 올라오는 것이다. 새싹처럼. 안타깝게도 세상은 나이가 든다고, 나이가 많다고, 여자라고 남자라고 더 예민한 것이 아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해조차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양보하고 상황에, 다른 말에 자신을 들여놓는 것이다. 다시는 배울 수 없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 똑 같은 박자..똑같은 패턴이 나만 식상해보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안타까움에 마음 한점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