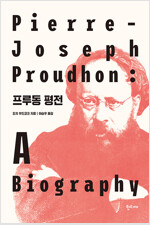‘사과‘
한 입 베어문다.
푸리에는 아담의 사과, 뉴튼의 중력사과에 이어 사람 사이엔 열정적 것이 존재한다며 세 번째 인력사과*를 말했다. 그리고 그 초고를 식자공으로 있는 프루동**에게 맡겼다. 그렇게 시작했다. 사상의 한 줄기는.
지금 사회적 삶의 현실은 마르크스보다 프루동에게 손을 들어주는 듯하다. 소유는 도둑질이다라는. 자본과 권력이란 마술에 걸리지 말라고 하면서...
하지만 현실을 다기하게 접붙이는 마르크스의 렌즈라는 곱셈을 하지 않고서는 불안해보인다.
여전히 허기가 진다.
네 번째 사과는
발.
여전히 세상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앎을 끌어들이기만 한다. 사회적 삶을 위해 역사의 분기점들을 제대로 복기해내거나 여기에 붙여내지 못한다. 저작들은 그렇게 번역도 되지 못한 채 땅에 묻혀있다 싶다. 객토***를 위한 책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 샤를 푸리에,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 조지 우드코크,《프루동 평전》
*** 브루노 라투르, 《나는 어디에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