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에 읽은 책 중에서 최고로 꼽고 싶은 <본격소설>. <폭풍의 언덕>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이 소설은 어딘가 친숙한 연애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일본적이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묘하게 일본적인 느낌이라 어느정도의 신선함을 가져다 주었다. 더군다나 '본격소설이 시작되기의 긴 이야기' 챕터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액자소설의 형태를 구성하고 있어서 흥미진진하다.
그냥 단순한 연애소설로 읽기엔 아깝지만, 그렇게 읽어도 손색없는, 재미있는 작품이다.

<메데이아, 또는 악녀를 위한 변명>은 하이드님의 서재에서 극찬을 받은 작품이라, 안 그랬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책이었는데, 읽게 되었다. 읽고 났더니, 극찬을 받은 이유를 알 것 같다고나 할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그냥 하나의 신기한 이야기, 혹은 잘 알려진 이야기로만 치부하던 신화 속 이야기를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구나. 거기다, 같은 일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무서워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었다.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을 뭐라고 할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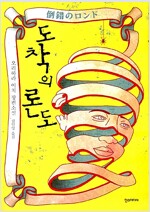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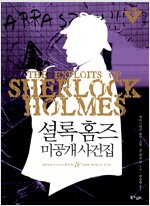
<도착의 론도>는 재미나게 술술 읽히는 작품. 서술트릭은 '속았다'는 느낌이 강해서 좋아하지 않는데(특히 '벚꽃 지는 계절에~' 같은 책의 경우에는 정말 읽은 시간이 아까웠다는-), 도착의 론도는 시리즈이기도 하고, 재미있다는 평이 많아서 읽었는데 역시-. 한 시간여만에 다 읽었는데, 서술트릭의 재미를 느꼈다고 할까. 다음 시리즈가 기대된다.
본격소설을 좋아하는 편인 나는, 시마다 소지의 소설이나 요코미조 세이시의 소설을 좋아하는데, 야츠지 유키히토 역시 좋아하는 작가 중의 한 명이다(작가의 이름이 맞는건지 모르겠다. 기억나는대로 쓰다보니, 크흣). 고립된 저택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은 관시리즈와 흡사한데 암흑관은 너무 길어서 좀 그랬어도, 십각관과 시계관은 재미있었던 터라 기대 만발! 그러나ㅠ 이건 좀 아니라고 본다. 일단은, 재미가 없다. 중반부까지 흥미진진했던 것은 중반 이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살인 동기가 밝혀지면서 흥미가 급감한다. 왠지, 횡설수설하다가 나 혼자 지쳐버린 느낌.
얼마 전에 코난 도일 평전을 읽었는데, 어찌나 흥미진진하던지, 홈즈 관련 서적의 구입이 계속되고 있는데, <셜록홈즈 미공개 사건집> 역시 그 중에 한 권. 홈즈 시리즈에서 한두 줄로 언급된 사건을 모티프로 삼아 재구성한 것인데, 코난 도일의 아들은 그렇다치고 존 딕슨 카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다. 음, 많은 분들의 평가대로 존 딕슨 카만의 분위기는 없고, 충실하게 원전을 복원한 듯한 느낌이다. 재미있었지만, 존 딕슨 카의 셜록 홈즈를 맛보려는 사람들은 기대에 못 미칠 듯 하다. 하지만 셜로키언들은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빌 벨린저는 교차서술로 유명한 작가인데, 북스피어에서 대표작인 <이와 손톱>, <연기로 그린 초상>, <기나긴 순간> 3부작을 출간해 주어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신기하게도 가장 먼저 출간된 <이와 손톱>이 가장 재미있고, 그 다음이 <연기로 그린 초상>, 그리고 <기나긴 순간> 순서로 재미있었다. 교차 서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어느 정도는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인 듯 싶은데, 어찌됐든 빌 벨린저의 작품은 고전 소설로 읽기에 손색이 없다.
<브라질에서 온 소년들>은 '아이라 레빈'이라는 작가의 이름을 믿고, 또한 어느 분의 리뷰를 읽고 궁금해서 구입. 음,, 역시 유전자라는 소재 자체가 조금은 식상하기도 하고, 약간은 허무맹랑한 느낌이 들어서 생각보다 긴장감 있지는 않았다. 거기다 예전에 쓰인 작품이라 그런지 왠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어 약간은 식상. 하지만 마지막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손에 땀을 쥐는 스릴을 느낄 수 있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다. <아카쿠치바 전설>은 정말, 좋게, 읽었기 때문에 나오키상을 받은 이 작품은 더욱 기대를 했었다. 구성은 마음에 든다. 현재에서부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다 여러 등장인물의 관점을 취해서 알 수 없는 부분까지 알려주는 구성은 흥미로웠다. 그러나, 그것을 빼면 단지, 자극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일 뿐이다. 무엇을 느낄 수 있겠는가. 뼈 속까지 시린 외로움을 겪은 사람끼리, 피를 나눈 사람끼리, 영원히 함께하자는 약속과 애증을 표현한 것이라고? 글쎄. <아카쿠치바 전설>의 작가와 같은 작가라고 믿기가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다른 느낌이다.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