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마지막 장을 덮으면 금세 다 죽어버리는 등장인물들의 가벼운 무게가 싫어 소설을 안읽다 올해는 다시 그 허구 속에
녹아 있는 인간과 삶에 대한 통찰이 좋아 소설을 읽게 되었다. 좋은 작품들이 많았다.

 김연수의 발견. 물론 아쉬운 점도 많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체험과 맞물리지 않아 공허한 대목들이 있고, 지나치게 쿨하고 감각적인 분위기에 치중하여 정작 인물들이 가끔 넘어지기도 한다.
김연수의 발견. 물론 아쉬운 점도 많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체험과 맞물리지 않아 공허한 대목들이 있고, 지나치게 쿨하고 감각적인 분위기에 치중하여 정작 인물들이 가끔 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의 그 섬세하고 오감을 일일이 깨우는 것 같은 예쁜 문체와 독자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하는지, 무엇을 보고 싶어하는지를 예리하게 파악하는 명민함은 그의 소설 자체가 하나의 문화로 진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 상쾌하다.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재미있게 멋지게 잘 쓰는 문장들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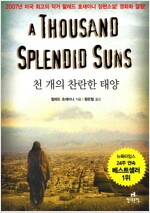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강추했기에 언젠가는 읽어야 겠다고 생각했던 그의 책들이 그 두께 때문에 오늘에서야 나에게 왔다. 아프가니스탄은 매일 폭탄테러나 터지고 사랑, 추억, 아름다운 풍속 등과는 전혀 관련없는 곳인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살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계승하는 공간임을 일깨워준 책이다. 스토리의 큰 스케일이 주는 다이나믹한 재미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 어떤 홍보물보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과 연민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책인 것 같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강추했기에 언젠가는 읽어야 겠다고 생각했던 그의 책들이 그 두께 때문에 오늘에서야 나에게 왔다. 아프가니스탄은 매일 폭탄테러나 터지고 사랑, 추억, 아름다운 풍속 등과는 전혀 관련없는 곳인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이 살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계승하는 공간임을 일깨워준 책이다. 스토리의 큰 스케일이 주는 다이나믹한 재미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 어떤 홍보물보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과 연민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책인 것 같다.
사건들의 전개가 시원시원하고 등장인물들이 전형성과 개성이 교과서처럼 잘 어우러져 소설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다큐를 보는 듯한 착각마저 자아낸다. 후속작이 없음이 안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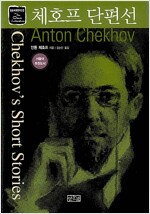 수전 손택이 극찬했던 작품 '바덴바덴에서의 여름'은 보석 같은 작품이다. 작품성이나 재미에 비하여 너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정도다. 픽션과 다큐의 경계에 있는 작품으로 화자가 도스토예스프키의 독일 바덴바덴에서의 시절을 추적해 가는 소설에 대한 소설 형식을 띠고 있다.
수전 손택이 극찬했던 작품 '바덴바덴에서의 여름'은 보석 같은 작품이다. 작품성이나 재미에 비하여 너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정도다. 픽션과 다큐의 경계에 있는 작품으로 화자가 도스토예스프키의 독일 바덴바덴에서의 시절을 추적해 가는 소설에 대한 소설 형식을 띠고 있다.
체호프 단편선은 일단 정말 재미있다. 분량은 대체로 짧은 편인데 번역도 유려하고 짧은 단막극들을 보는 것 같은 재미가 쏠쏠하다. 사실 현대의 단편 소설 작가들의 작품들이 상당부분 체호프의 오마주라고도 하니 여차저차 읽어야 할 명분만 한보따리인 작품이다. 서둘러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러시아의 작가들은 솔제니친도 그렇고 대체로 심리묘사보다는 배경과 인물묘사에 치중하여 사건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즐기는 것 같다. 이 점은 대부분의 작품의 가독성을 높이고 재미를 더하는 데 일조를 담당해 적어도 너무 재미없어서 책을 읽다 그만두는 불상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물론 또 반전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겠지만.



김훈의 소설이야 그 문체의 담백함과 사물과 사건에 대한 예리한 시선만으로도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의 소설은 항상 긴 기사를 읽고 있는 듯한 착각을 준다. 전직은 못속이나 보다. 거북할 수도 있지만 감정의 과잉이 보이지 않아 오히려 깔끔하다. 논픽션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환호할 것 같다. 닮고 싶은 문체다.
신경숙의 '외딴방'은 그저 아름답다고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작품이었다. 뒤늦게야 접하고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엄마를 부탁해'보다 오히려 더 그녀다워 보여 좋았다. 문장 하나하나가 시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많이 쓸고 닦아 반질반질한 바닥에 궁둥이를 디미는 느낌. 그래서 괜히 한없이 미안해지는 느낌. 그녀에게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들은 다른 책보다 이 책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갔다.
오정희의 '유년의 뜰'은 연작소설 같이 여러 편의 단편을 주인공의 연령 순으로 묶은 작품이다. 처음 읽는데도 자꾸 두 번 세 번 읽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은 그 만큼 이 작품이 문학사에서 여러 번 재생되었다는 방증이다. 수많은 유년소설들이 이 작품에 빚진 바가 많다고 하니 그런 느낌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문장 하나 하나를 베껴 써보고 싶을 정도로 빛난다.


일단 이 두 작품은 아주 재미있어 손에서 놓을 수가 없다. 며칠에 나누어 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 '눈먼 자들의 도시'는 인간세계에 대한 통찰과 인간에 대한 그 예리한 시선이 놀랍다. 단 한 명을 제외하고 다 눈이 멀어버리는 그 백색공포의 세계를 재현하는 작가의 능력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 숨죽이며 결말을 기다리는 독자의 초조함은 마치 작가에게 감정을 통째로 저당잡힌 것 같아 불편할 정도다.
'허삼관 매혈기'는 그야말로 울다 웃다 남사스러울 정도이니 혼자 구석에서 읽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매혈로 생계를 이어가는 그 처절한 스토리가 어떻게 희화화될 수 있는지를 살피다 보면 결국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철학적 탐구가 가능해질 수 있는 작품이다. 인생이란 어차피 머리로 보면 희극이고 마음으로 보면 비극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은가.
 너무 늦게 만났지만 지금 만났기에 더 의미있는 독서가 될 수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 빨치산을 뿔달린 도깨비가 아니라 숨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게 한 책. 우리나라의 그 비극적인 역사 속에 함몰되어 있던 수많은 민중들을 일으켜 세운 책.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 애틋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책. 옆자리의 사람의 사소한 사연들에 공명할 수 있게 하는 책.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2009년에 이 책을 읽을 수 있어 그 꼬리를 붙잡고 있음에도 덜 허무할 수 있었다고 할 수밖에.
너무 늦게 만났지만 지금 만났기에 더 의미있는 독서가 될 수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 빨치산을 뿔달린 도깨비가 아니라 숨쉬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게 한 책. 우리나라의 그 비극적인 역사 속에 함몰되어 있던 수많은 민중들을 일으켜 세운 책. 마지막 장을 덮고 나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 애틋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책. 옆자리의 사람의 사소한 사연들에 공명할 수 있게 하는 책. 무슨 말이 더 필요하랴. 2009년에 이 책을 읽을 수 있어 그 꼬리를 붙잡고 있음에도 덜 허무할 수 있었다고 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