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에 처음 글을 쓴 게 이십 대 후반 무렵이다. 아, 2019년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나이가 된다. 내가 이 나이의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 지금 존재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난다. 계속 그럴 테지만 어렸을 때 나의 엄마의 나이로도 적잖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나이가 내가 살아온 생의 나이테라니... 이런 속도로 나이가 든다면 십 년 정도는 눈 깜짝할 새가 될 듯. 나이와 함께 읽고 쓰는 것에 대한 소회도 진화한다. 삼십 대 중반에 알라딘에서 온 책을 언박싱하는 일은 낙이었다. 새로운 책을 책상 한 귀퉁이에 쌓아놓고 책등을 쓰다듬는 일은 아아, 회상만으로도 설렌다. 하지만 이제 실물의 책을 구입하는 일에 왠지 저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건 이제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자각이 추상이 아니라 하나의 실재로서 다가오는 중년이 되었기 때문일까? 글쎄, 모르겠다. 되도록 전자책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고 그것마저 없다면 신간을 무조건 사서 쌓아놓는 일은 신중하게 된다. 그런 만큼 읽는 일의 퇴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독서의 지형도는 예전처럼 체계적이지 않다. 전자책은 한꺼번에 정렬하는 기능을 실행하지 않으면 책장을 둘러보며 독서의 궤적을 살피는 것과 같은 체험을 할 수는 없다. 수많은 영상들, 그 사이의 활자들조차 실물이 아닌 가상의 영역에서 혼재되어 때로 어그러지고 뭉그러진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미니멀리즘일까, 4차 혁명의 충실한 소비자로 거듭나는 일일까? 글쎄, 난 잘 모르겠다.
2018년도 연말에 읽었던, 내 마음대로 특별하게 갈무리하고 싶은 책들을 정리해 둔다. 나중에 이곳을 찾아올 나를 위하여.
문학은 때로 더욱 드라마틱한 나와 내 주변의 일들로(주로 예기치 않은 비극) 그 서사성이 때로 시큰둥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근사해서 심장을 쫄깃하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럴 때 읽는 일이 여전히 참 좋다.

아, 건축 설계소의 아침을 묘사한 문장을 읽다보면 그냥 책장을 찢고 그 속에 들어가고 싶어진다. 사각사각 모두가 연필을 깎는 그 아침. 이 생생한 하루 하루 청춘의 이야가 결국 노년의 초입에서의 회고로 안길 때는 이야기는 이렇게 쓰고 읽는 거구나, 싶다. 문장이 언어가 이미지를 동영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한 정연한 대답을 찾는다면 이 책이 될 것 같다. 읽는 동안 참 행복했다.

SF소설과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테드 창은 처음이고 더불어 과학 단편 소설집도 이 단편집이 완독한 유일한 이야기다. 작위적이거나 너무 미래지향적인 설정에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내가 아, 이런 거구나, 싶게 만들었던 책. 결국 미래를 이야기해도 공상의 영역으로 가도 인간과 삶에 대한 성찰이 깊고 진하다면 공명하는 부분은 두렵지도 낯설지도 않다는 깨달음. 을 준 이야기. 내 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상의 공간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재구성하고 더 나아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가능했던 이야기들의 여운이 길다.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면서도 다시 그 삶을 기꺼이 경험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어쩐지 좀 근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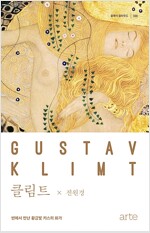
이 책을 읽기 이전에 내가 상상한 <키스>의 클림트와 이후의 그의 모습은 천양지차다. 실망도 경외감도 함께 왔다. 클림트가 나고 자랐던 시공간 속에서 그가 남긴 불후의 명작과 평범하지 않았던 그의 삶이 한데 어우러져 그가 남긴 작품이 가지는 서사적 맥락을 엿볼 수 있었던 책이다. 기회가 되어 그의 그림 앞에 직접 설 수 있다면 이 책이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이 책과 함께 오스트리아에 갈 그 날을 꿈꿔 본다.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 이렇게 슬프고 처연한 이야기인 줄 몰랐다. 자신을 만든 자를 끝내 파멸시킬 수밖에 없었던 피조물의 비극은 십대 소녀와 유부남 시인의 사랑의 도피 행각에서 탄생했다. 자신이 만든 이야기보다 더 질곡어린 서사를 직접체현했던 그녀의 삶과 죽어서도 딸의 삶에 불가항력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시대를 앞선 여성학자 어머니의 이야기와 함께 하면 메리가 <프랑켄슈타인>을 쓸 수밖에 없었던 저력의 근원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용 <프랑켄슈타인>을 읽고 난 딸아이도 무섭다기보다는 너무 슬픈 이야기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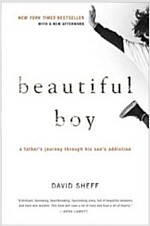
부모가 되는 일은 참 뭐라 말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과제인데 그 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일어나는 온갖 변수들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스스로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조언도 각자의 선입견이나 편견에 갇혀 있기 쉽다. 여기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간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있다. 자식을 키우면서 어떻게 자신의 삶도 방기하지 않을 수 있는지, 부모로서의 영향력과 보호의 영역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뒤늦은 깨달음은 꼭 기억해 두고 싶다. 구체적인 상황이 이 이야기와 꼭 겹치지 않아도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아니 가족 중 누군가의 힘든 일로 함께 아파하고 있다면 이 책이 큰 위로이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12월이 채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2018년의 독서의 허술한 기록을 마무리하는 지금이 한 해의 깔끔한 갈무리가 될 거라 믿지 않지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남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