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살아도 절대 모르는 영역이 있다. 구역이 있다.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이 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 내가 차마 떠올릴 수 없는 삶의 비의를 가르쳐 줄 때가 있다.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는 하루에 몇 명이 총에 맞아 죽는지... 우리나라 하루 자살자가 몇 명인지...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실은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사람들은 전쟁 이야기를 하지만요. 지금 시급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는 하루 평균 36명이 목숨을 스스로 끊어요."
이런 말을 들었다. 나는 아마도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그 숫자가 충격적이면서도 그럴 수 있다, 그러 경우가 있다, 에 생각이 가 닿았던 것 같다. 매일이 축제인 사람이 있을까. 때로는 정말 버티기 힘들 때도 있다.

무거운 책이다. 우리가 쉽게 비난하고 쉽게 무시하고 너무 가까이 느껴서 그 권위를 종종 인정해주지 않는 경찰관, 젊은 여자 경찰관의 이야기다. 과학수사과에서 현장감식 업무를 담당하며 수백 명의 변사자를 본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 주변에서 비상식적인 대한민국과 사람들의 무서운 밑바닥을 봐버린 이야기다. 사람이 죽으면 그의 고통을 공감하며 함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무슨 사건인가 싶어 호기심 그득한 구경꾼들만 바글바글했던 현장에서 절망한 이야기다. 영화 <아바타2>를 꼭 보고 싶어했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못 보고 간다는 유서를 영화 개봉 3일 전에 남기고 간 이야기다. 상관의 실적 압박에 손님을 태우러 중앙선을 침범한 개인택시 기사에게 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라는 반문을 들어야 했던 나날들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을 때로 희화화하며 그들에게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권한과 대우를 해줬나? 나도 그런 불신의 눈길을 보낸 적이 있지 않았나? 미국의 경찰들과 비교하며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그들의 소극적 대처를 입으로만 쉽게 성토하지 않았나?
그러나 무엇보다 죽음을 택하는 사람들. 그 죽음 이전에 그 죽음이 완벽하게 실현되도록 연습까지 하는 그 절망을 삶의 의지 부족으로 치환해서 무조건 살아야 하고 내일에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고 쉬운 기만적 답안으로 교체했던 순간이 있지 않았나? 삶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희망 그 자체를 꿈꿀 수 없는 그 바닥을 내가 감히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내가 죽고 싶었던 순간과 죽음 그 자체를 결행한 사람들과의 그 간극이 얼마나 넓은 것인지 내가 속단할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피어나는 곳에서 절망의 마침표를 찍는 작가의 마음이, 그러나 여전히 그런 딸의 안부를 간절히 챙기는 아버님의 틀린 맞춤법이 사랑은 참으로 끈질기구나, 여전하구나 싶은 체념어린 깨달음으로 이어졌다. 그래도 사랑이다,는 희망이 아니다. 어쩌면 삶의 그 지독한 중독성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여전히 그 사랑을 기억하며 괴로워할지도 모른다. 사랑은 참으로 지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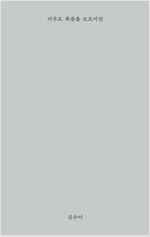
여성 장례지도사인 김수이 작가의 글이다. 표지만큼 정갈하고 담백한 글들은 죽음 이후의 그 의례를 담담하게 전한다. 그것은 삶의 축제의 저 반대편에 가 있지만, 우리 누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결국 통과해야 하는 순도 백퍼센트의 통과의례라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그녀가 일했던 장례식장 풍경이 내가 가 있었던 그 장례식장과 너무나 닮아 있어 기시감이 들었다. 그 장례식장행 셔틀이 없어진 이유가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들과 함께 버스에 타고 싶지 않아서라는 이유도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면 그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갔던 장례식장은 병원에 정차하고 마치 종점처럼 서곤 했으니까. 제목처럼 아무도 죽음을 모르지만,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일상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일 것이다.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게 희망의 영역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건 엄연히 삶의 심연에 속한다.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곳에 대한 이야기들은 언제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럼에도 꿈꿀 수 있을까. 청년들의 절망을 읽을 때마다 기성 세대로 가고 있는 나는 미안하다.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고 긍정적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작금의 상황에 희망과 미래를 노래했던 우리 세대의 책임은 없나, 돌아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