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웨스트코스트 블루스
장파트리크 망셰트 지음, 박나리 옮김 / 은행나무 / 2020년 6월
평점 : 



참 특이한 소설이로고. 범죄소설가들의 범죄소설이라고 해서 사실 뭔가 좀 잔인하구나. 이런 짐작정도만 했었다. 그런데, 이건 어?어? 하며 이상하게 읽게 되는 그런 기분.
뭔가 프랑스의 흑백영화를 들여다 보는 그런 느낌도 들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이 이어지는 그런 날씨에 오래된 차를 운전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려보는 느낌. 첫 시작은 최소 두명을 죽였다는 사실을 까발림으로서 주인공이 엄청난 살인 청부업자 같은 느낌을 아주 짙게 나타내고 있다. 첫 시작은 그랬다.
그런데, 읽어가다보면 허무와 이유없는(?) 낭만과 별 시덥지 않은 일상이 이어지는 듯한 느낌의 이야기.
하지만, 그 밑바닥에서 느껴지는 진한 느와르의 흑백영화 같은 기분은 이상한 조화를 이루며 이야기를 이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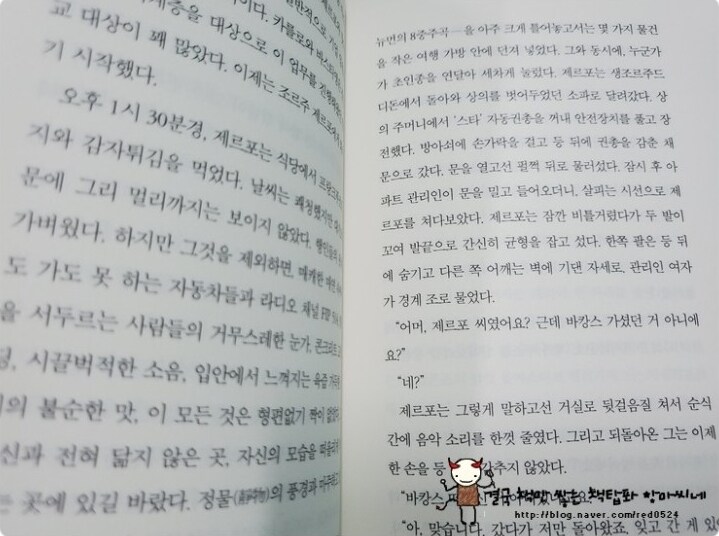
분명 제르포라는 주인공은 잠시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으로 가출 아닌 가출을 한 듯 하고, 시간이 흐름에 있어서도 멈춘듯 멈추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든다. 왜 범죄소설가들의 범죄소설가인지 언뜻 감이 올 듯한 기분.
살인 청부업자에게 왜 쫓기는 지도 모른채, 자신의 삶 속에서 뛰쳐나와 그들을 상대하는 제르포는 어쩐지 그런 삶을 즐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그 와중에 이 살인 청부업자 둘은 마치 무성영화에서 덤앤더머를 보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살인 청부업자들이 이리 웃기고 바보 같으면 어쩌지?
프랑스 특유의 블랙유머라고 해야하는건지.... 읽으면서 피식거리게 되는 이 사람들.
심지어 자신들이 죽여야할 제르포에게 당하는 건 분명 범죄소설인데도 코메디영화를 보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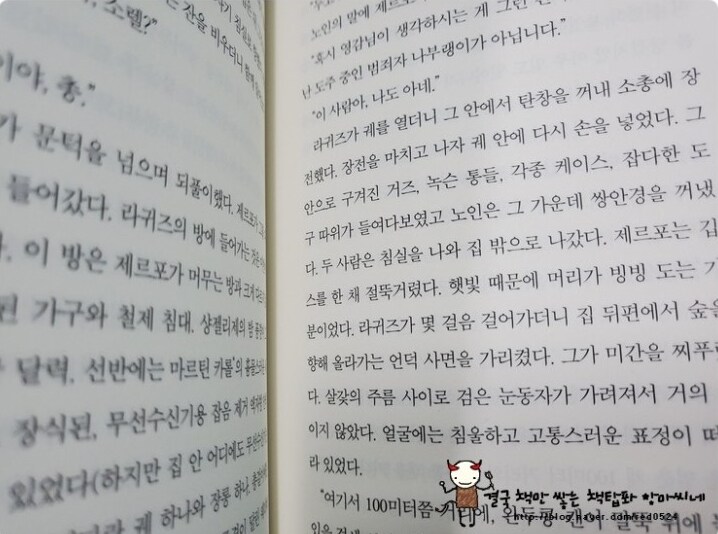
꽤 오랜시간의 틈을 주고 이야기는 전개되지만 의외로 제르포가 다시 제자리를 찾기까지 한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기분이 들게 한다. 잠시 잠깐 바람쐬러 나갔다 별일 아니라는 듯 집에 들어와 낭만적인 블루스 음악을 듣는 그런 느낌.
누구도 제르포의 완전한 정체를 모른다. 아내는 잠시잠깐 그가 소렐이었다는 것도, 사람을 죽였다는 것도 혹은 살인청부업자에게 쫓겼다는 것도.
뭔가 특이한 느낌이다. 이제껏 읽어보지 못한 느낌의 글이었다고나 할까.
대화체나 전체적인 이야기 느낌도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느낌인데 그게 또 색다른 맛으로 다가와서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이야기의 흡입력을 가중시킨다. 특이하지만 재밌고 그래서 더 인상적이다. 진한 스카치 한잔에 블루스 음악을 턴테이블로 들으며 눈을 감고 감상하면 딱 어울릴 그런 느낌의 책이 아니었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