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체호프의 <벚나무(벚꽃) 동산>에서 20세기로, 파스테르나크의 <닥터(의사) 지바고>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감상에 젖어본다. 모두가 떠난 텅 빈 무대 이후 혁명이 찾아온다. 독특한 서사시(에픽), 독특한 역사소설, 혁명소설 등 비평과 연구의 수사는 화려하지만, 내게 <지바고>는 언제나 로맨스였다. 혁명과 세계대전, 내전의 소용돌이, 인텔리겐치아(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다룬 로맨스. <폭풍의 언덕> 같은 진짜 로맨스를 읽던 무렵에 읽었던 탓이기도 하겠다.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는 그 해 겨울, 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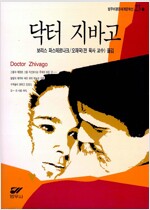

범우사판의 두툼한 장편, 데이비드 린의 대륙적 스케일이 느껴지는 영화.(흠, 한데 배경 속 설원은 러시아가 아니다.^^;; : 겸사겸사 린의 <아라비아의 로렌스>도 볼 만하다.) 파스테르나크(그는 유대인이라, 이름을 구개음화 시키지 않고 이대로(즉, "빠스떼르낙"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다) 는 내게 <지바고>의 작가였지만, 동시에 이 시를 쓴 시인이기도 했다.
모든 일에서 / 극단에까지 가고 싶다. / 일에서나, 길에서나, /마음의 혼란에서나,
재빠른 나날의 핵심에까지 / 그것들의 원인과 / 근원과 뿌리 / 본질에까지.
운명과 우연의 끈을 항상 잡고서 / 살고,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 발견하고 싶다.
아, 만약 부분적으로라도 / 나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면 / 나는 여덟 줄의 시를 쓰겠네. / 정열의 본질에 대해서 /
오만과 원죄에 대해서 / 도주나 박해, / 사업상의 우연과 / 척골(尺骨)과 손에 대해서도 /
그것들의 법칙을 나는 찾아내겠네. / 그 본질과 / Initial을 나는 다시금 반복하겠네.
원문도 찾아보았다. 마지막 네 연은 번역에선 빠졌다.
До сущности протекших дней, / До их причины, / До оснований, до корней, /До сердцевины.
Все время схватывая нить / Судеб, событий, / Жить, думать, чувствовать, любить, / Свершать открытья.
О, если бы я только мог / Хотя отчасти, / Я написал бы восемь строк / О свойствах страсти.
О беззаконьях, о грехах, / Бегах, погонях, / Нечаянностях впопыхах, / Локтях, ладонях.
Я вывел бы ее закон, / Ее начало, / И повторял ее имен / Инициалы.
Я б разбивал стихи, как сад. / Всей дрожью жилок / Цвели бы липы в них подряд, / Гуськом, в затылок.
В стихи б я внес дыханье роз, / Дыханье мяты, / Луга, осоку, сенокос, / Грозы раскаты.
Так некогда шопен вложил / Живое чудо / Фольварков, парков, рощ, могил / В свои этюды.
Достигнутого торжества / Игра и мука / Натянутая тетива / Тугого лука.
이 시를 번역한 자는 독문학자이자 번역가, 수필가로 정리되는 전혜린. 한때는 '요절한 천재'로 여겼고, 친한 벗들과 함께 그녀의 책을 읽고 흥분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녀가 번역한 위의 시는 베껴쓰고 코팅하고 등등하여 항상 갖고 다녔던 기억이 있다. 요즘은 그녀를 안 읽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간혹 그녀를 상기한다. 이런 책들과 더불어.



다시, 파스테르나크로, <지바고>로 가자. 아무리 읽어도 잘 쓴 소설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이 소설을 우리가 계속 읽는 것은 아무래도, 역사가 문학을 만들기 때문, 이 아닌가 한다. 어찌 보면 흔해빠진 로맨스, 우유부단한 지식인(지바고), 열렬하고 멋있지만 작품 속에선 창백하고 부차적인 인물로 머물고 만 혁명가(파벨 안치포프), 적극적이고 매혹적인 여성임은 분명하지만 아무래도 지나치게 신비화되었고 그 때문에 오히려 부실한 여주인공(라라) 등등. 플롯의 엉성함은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역사가 대신(!) 동기화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다. 비슷한 시기, 비슷한 소재를 다룬 불가코프의 <백위군>과는 얼마나 대조적이냐,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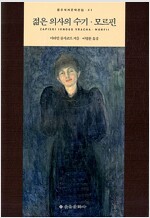
소설이야 (실제로 의사이기도 했던) 불가코프가 더 잘 쓴 것 같지만, 어쨌거나 독자들은 <지바고>를 사랑한다.(물론, 불가코프의 <거장과 마르가리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만..^^;;)
곁들어 <지바고>를 번역하고 있는 내 신세를, 연극이 끝난 다음 텅 빈 무대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늙은 단역배우(체호프, <백조의 노래>)처럼, 한탄해본다. 인생에 뭔가 다른 변수가 있었더라면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법한데, 인생-역사에서 가정법은 무의미하고, 거참, 그러니까, 자꾸 또 가정법을 써보는 것이다. 소설가로서, 학자로서 20여년전의 꿈을 절반도 이루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조용히 소설을 쓰거나 공부를 할 것이지, 이렇게 청승스러운 투정을 써대는 나 자신에게 솔직히 좀 빈정이 상하긴 하지만... -_-;;
정확히 21년, 5월 18일을 좀 지난 어느 날, 혼자서 광주 망월동을 찾아갔던 기억이, 지난 일요일 얼핏 떠올랐다. 그날도 날씨가 무진장 좋았던 걸로 기억된다. 그 무렵 즐겨 (따라)부르던 노래 가사 속의 금남로, 이런 곳도 배회하고. 내게 있어 광주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한강의 애독자라고 할 형편은 아니지만, 어떤 극한의 탐미주의와 오묘한 분위기에 이끌려 주기적으로, 드문드문, 읽는데 이번 소설은 읽지 않을 도리가 없겠다.)
때론 잊는 것이 능사이지만, 시간과 더불어 주어지는 망각의 축복이 고맙지만,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잊을까 두렵다. 역사의 반복, 반복되는 것의 두려움을 꼭 기억해야 한다. 얼마 전까지도 그렇게 흥분했던 세월호 사건도 진상이 전혀 규명되지 않은 채 그렇게 잊힌다. 이것이 두려운 것이다. 문학은 그 표현이다.